[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승연 한화(000880)그룹 회장과 이명희 신세계(004170)그룹 총괄회장의 ‘동일인’(기업 총수) 지위가 유지됐다. 각 그룹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동일인이 기업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봤다.
 |
| 김승연(왼쪽) 한화그룹 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사진=이데일리DB) |
한화·신세계 동일인 유지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공시대상기업(대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자산 5조원 이상(지난해말 기준) 대기업집단은 92개로 지난해보다 4개 늘었다. LIG, 대광, 사조, 빗썸, 유코카캐리어스 5곳이 신규 지정되고, 아시아나항공 매각으로 자산총액이 크게 줄어든 금호아시아나가 지정제외 됐다.
92개 대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확정치의 0.5%에 해당하는 11조 6000억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상출)집단은 지난해보다 2곳 줄어든 46곳이 지정됐다. 한국앤컴퍼니그룹과 두나무가 신규 지정됐고, 교보생명보험과 태영, 에코프로, 금호아시아나가 제외됐다.
주목할 부분은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지정된 87개 기업집단의 동일인이 변경되지 않은 점이다. 일부 집단에서 동일인의 그룹 지배력이 이전되는 과정이 있었지만, 공정위는 기존 동일인의 지배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승연 한화 회장은 최근 한화 지분을 세 아들에게 넘기면서 일선에서 물러났다. 장남인 김동관 한화 부회장이 한화 지분과 한화에너지를 통한 간접 영향력으로 한화 지분을 20.8% 보유해 사실상 최대 주주에 올랐다. 신세계그룹도 이명희 총괄회장이 이마트 지분 전량을 매각하면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으로 승계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한화그룹 같은 경우 최다 출자자가 변경됐지만 아직까지 김승연 회장이 최고 직위자이자 기업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며 “신세계도 같은 취지로 동일인 자체는 변경하지 않았고, 그룹에서도 동일인 유지에 대해 특별히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해와 동일하게 동일인을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쿠팡과 두나무도 그 지위가 유지됐다. 시행령상 예외요건을 모두 충족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예외요건은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볼 경우와 비교할 때 국내 계열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을 것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 및 그 친족의 계열회사 출자,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경영참여, 자금대차·채무보증이 없을 것 등이다.
롯데 톱5 재진입…LIG·빗썸 대기업 지정
자산 상위 5대 그룹은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순이었다. 2023~2024년 5위 자리를 포스코에 빼앗겼던 롯데가 이를 재탈환했다. 포스코는 철강업 업황 악화로 실적이 부진했고, 롯데는 토지자산 재평가로 자산이 증가했다. 상위 10대 그룹으로 넓히면, 농협과 GS가 각각 9위, 10위로 순위를 바꿨다.
올해는 기업집단을 둘러싼 대외환경 변화로 방위산업·가산자산업·해운업 주력회사 자산이 크게 늘어 관련 집단이 새롭게 지정되거나 총자산 순위가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지정학적 갈등 심화에 따른 해외 각국의 군비 증강으로 방산이 급격히 성장해 주요 방산회사를 계열사로 둔 한화, 한국항공우주산업, LIG 자산이 모두 증가했다. 특히 LIG는 자산이 2조원 이상 증가하며 대기업집단에 새로이 올랐다.
또한 지난해 말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가산자산 거래가 활성화되며 이에 따른 가산자산거래소 고객 예치금이 증가해 두나무, 빗썸의 자산과 순위가 상승했다. 두나무는 자산총액이 53위에서 36위로 대폭 상승해 상출집단으로 상향 지정됐고, 빗썸은 대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됐다.
아울러 중동의 지정학적 이슈로 인한 운임 상승과 환율 상승에 따른 환산이익 등으로 HMM, 장금상선, 유코카캐리어스의 자산·순위가 상승했다. 자동차 운송을 주력으로 하는 유코카캐리어스는 대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됐다.
최 국장은 “이번 지정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대상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유용한 정보를 시장참여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시장 감시가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이 유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 day ago
2
1 day ago
2


![수세미 하나로 2조 '잭팟'…韓 상륙에 2030 '오픈런' 우르르 [이선아의 킬러콘텐츠]](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1.40353672.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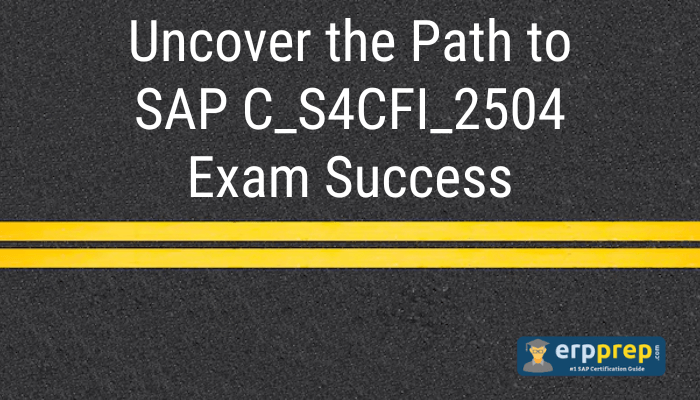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