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179명의 사망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났다. 사고 직후에는 랜딩기어(착륙 시설) 미작동 등 기체 결함 문제가 집중적으로 부각됐으나 최근에는 무안공항의 안전관리 체계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해외 전문가가 “범죄에 가깝다”고 지적한 콘크리트 둔덕 형태의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국제기구 권고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활주로 끝 안전 구간, 조류 충돌 위험성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무안공항은 사업 초기 때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감사원은 경제성 부족 문제를 지적했고, 환경부는 철새도래지 근처에 공항이 들어서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한화갑 공항’이란 말까지 나오는 등 무안공항은 지역 주민의 표를 얻기 위해 정치적으로 추진됐다는 논란도 있다. 정치 논리가 앞서다 보니 경제성이나 안전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감사원, 경제성 부풀리기 지적

1993년 김포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733 항공기가 악천후 속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목포공항 인근 야산에 추락해 68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계기착륙장치 부재, 짧은 활주로 등 목포공항의 열악한 시설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후 호남권에 신공항을 지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됐다. 김영삼 정부에서 무안공항 건설이 공식화됐고,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첫 삽을 떴다.
착공 전부터 여러 우려가 나왔다. 광주·전남지역에는 이미 광주공항과 여수공항이 운영 중이었다. 누가 무안까지 와서 비행기를 타겠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1998년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의 경제성 평가에서 비용 대비 편익(B/C) 비율이 기준치(1)를 통과한 1.45로 제시됐다. 2004년 감사원은 실제 B/C값은 0.49에 불과한데, 공항임대수익을 편익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경제성을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공사 과정에서도 잡음이 많았다. 설계심사 부문 1위(현대건설)와 2위(삼성물산)를 제치고 최저가를 제시한 금호건설이 무안공항 설계와 시공 등을 일괄 수주했다. 일각에서 호남 기업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배경이다. 안정남 당시 건교부 장관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가 활주로 골재 납품을 수주한 것도 논란이 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무안을 지역구로 둔 정권 실세 한화갑 전 의원이 주도해 추진 동력은 꺾이지 않았다.
숱한 우려 속에서 2007년 문을 열었다. 총공사비 3056억원이 투입됐다. 무안~광주 고속도로, KTX 무안공항역(공사 중) 등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사업도 이뤄졌다. 서남권 관문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와 달리 현실은 초라했다. 개항 전 연간 992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2023년 기준 실제 이용객은 23만 명(2.3%)에 그쳤다. 2018~2022년 5년간 106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전국 공항 중 최대 적자다.
콘크리트 로컬라이저 논란
설계 안전에서도 소홀했던 부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로컬라이저는 항공기 충돌에 대비해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콘크리트 둔덕 형태였다. 로컬라이저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외부에 설치돼 규정 위반은 아니라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지침이 발견돼 ‘거짓 해명’ 논란도 일고 있다.
적법성 여부와 별개로 활주로 끝에 콘크리트 둔덕을 쌓아 올린 것은 비상식적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7년 무안공항 개항 때부터 콘크리트 둔덕이 있었다. 무안공항의 활주로는 남쪽으로 2% 정도 경사가 있는 지형을 반영해 2m 둔덕을 쌓은 뒤 그 위에 로컬라이저를 올렸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5% 이내 경사도는 규정상 허용된다”며 “완전하게 수평을 맞추는 게 이상적이지만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다.
활주로 안전 구간이 조금만 더 길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크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활주로 끝에서 199m 떨어져 있다. 규정상 최소 기준(90m)은 충족했다. 하지만 국내 권고 기준(240m)이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 기준(300m)에 크게 못 미친다.
조류 충돌 방지 미흡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 방지 등 기본적 안전 관리에서도 무안공항은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다. 무안 망운면 일대는 안개가 적게 끼고 높은 산이 없다는 점에서 공항 최적지로 꼽혔다. 하지만 환경부는 1998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통해 무안공항 근처에 조류 44종이 서식하고 있다며 조류 충돌 위험성을 경고했다. 2020년 활주로 연장 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를 재차 받았을 때도 비슷한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 철새도래지 4곳이 무안공항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
무안공항의 조류 퇴치 전담 인력이 단 4명에 불과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김포공항(23명), 제주공항(20명), 김해공항(16명) 등보다 훨씬 적다. 내륙에 있는 대구공항(8명) 수준도 안 된다. 관제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무안공항의 관제사는 7명뿐이다. 부산지방항공청은 2017년 관제 인력 부족에 따른 안전사고를 우려해 야간 운행 제한을 시도했지만, 지역사회 반발로 무산됐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출신인 심재동 세한대 항공정비학과 교수는 “몇 분 사이로 쉴 새 없이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인천·김포공항과 달리 수익성과 이용률이 극히 낮은 공항은 안전 투자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1 week ago
5
1 week ago
5

![[마켓인] ‘B’급 지표 수두룩한 신세계건설, 회사채 조기상환 부담 커지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501432.jpg)
![트와이스 나연, 40억 고급주택 집주인 됐다…'유재석 선택한 그곳' [집코노미-핫!부동산]](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3.37022409.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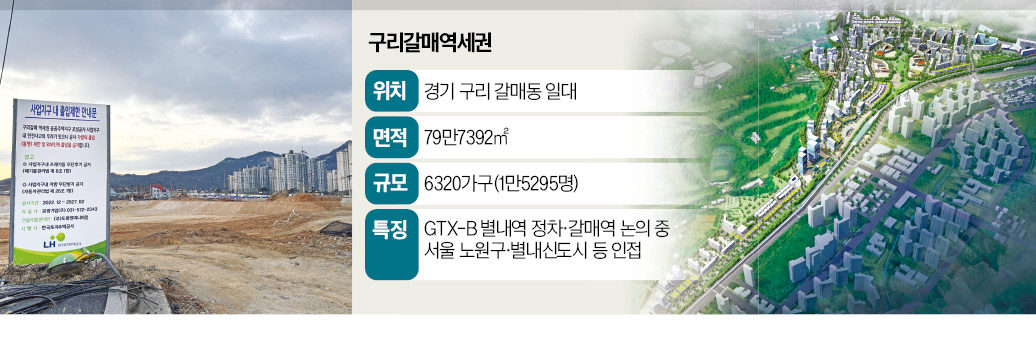



![1월 둘째 주, 마켓PRO 핫종목·주요 이슈 5분 완벽정리 [위클리 리뷰]](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99.34900612.1.jpg)
!["이러다, 다 죽어!"…'오징어게임2' 망하면 큰일 난다는데 [김소연의 엔터비즈]](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9034730.1.jpg)
!["근처 갈 만한 커피숍 알려줘"…'이 번호' 누르자 챗GPT가 받았다 [송영찬의 실밸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8983952.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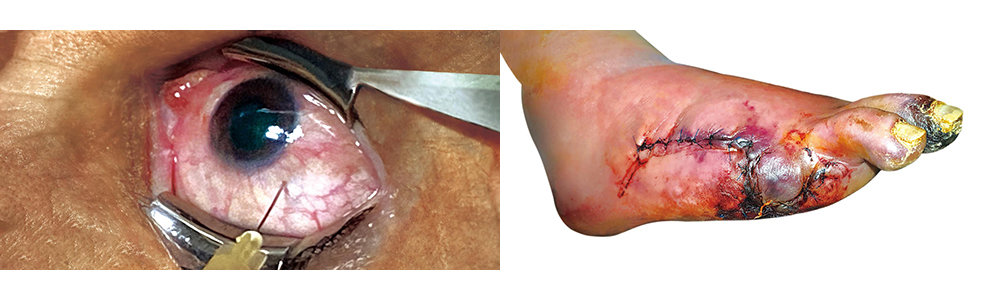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