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아르헨 수입대체산업화 실험
자동차 산업 육성하려 외부와 경쟁 차단
경쟁력만 약해지는 결과로 이어져

월가에서는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이 달러 가치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해왔다.
해외 제품 수입이 줄어 무역적자가 축소되면 외화 수요도 줄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WSJ 미 달러 지수가 올해 들어 5.9% 이상 하락했다.달러가 지나치게 고평가된 때문이라는 설명도 나오고 미국이 동맹국을 경제적으로 공격하면서 달러의 “세계 기축 통화” 지위가 약해지는 때문이라는 설명도 나온다.
그러나 보다 설득력 있는 설명은 트럼프에게는 불편한 진실이다. 바로 미국의 장기적 경제 잠재력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5년 단위 미국과 유럽 주식의 자기자본수익률(ROE) 차이는 2001년 이후 달러-유로 환율과 70%의 상관 관계를 보여준다.이는 달러 강세의 주요 요인이 상대적 생산성 증가와 관련된 투자라는 점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실리콘 밸리가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며 미국을 기술 제품, 특히 서비스 수출 강국으로 만든 것이 달러 강세의 원인이었다는 것이다.시장은 이제 새로운 구조 변화의 가능성을 예견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재무장 움직임에 따른 경기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보호무역과 중국의 인공지능 도전 속에서 성장이 지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의 관세가 지나치게 갑작스럽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국가별 상호 관세 목록은 경제적 타당성도 없이 계산해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책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보다 오히려 위축시킨다. 생산기지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점진적이고 정교한 접근 방식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미국 자동차회사들이 주요 제조 공정을 미국으로 가져올 경우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섬유나 전선 하네스처럼 저부가가치 부품까지 미국으로 가져오면 미국 자동차 산업은 비효율의 극치를 찍게 될 것이다.미국 시장이 고립되면, 도요타와 현대 같은 외국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 내 공장의 혁신을 줄이고 해외에 더 집중하게 될 수 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20세기 중반 남미 국가들이 실패했던 ‘수입대체산업화’ 실험을 떠올리게 한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자국 자동차 산업을 키우기 위해 외부 경쟁을 차단했으나 경쟁력만 약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반대로 일본, 한국, 중국은 보호무역과 외국 시장에서의 경쟁이라는 ‘채찍과 당근’을 병행하며 세계적인 자동차 산업을 일궈냈다.
무역적자에만 지나치게 집착하는 정책은 미국의 수출 경쟁력과 수익성이 달러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었다는 사실을 잊게 만든다. 시장이 지금 미국의 경쟁력을 의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19 hours ago
3
19 hours ago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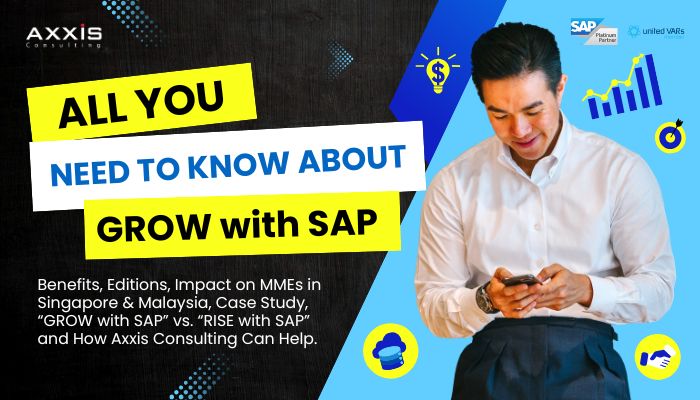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