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잘 나가는 국제 영화제마다 야심한 밤에 영화를 틀어주는 섹션이 있다. 지난달 막을 내린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선보이는 ‘미드나잇 패션’ 부문이 그렇다. 호러, 액션, 공상과학(SF) 등 장르적 개성이 뚜렷하면서도 작품성을 갖춘 신작을 상영하는데, 올해 가장 뜨거운 기대를 모았던 작품이 있다. 별다른 수상 이력도 없고 대대적인 국내 홍보도 없었지만, 순식간에 극장 좌석이 매진될 정도로 인기였다. 자크 크레거 감독의 신작 ‘웨폰’이다.
‘웨폰’은 전형적인 미국 할리우드 영화다. 한 마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아이들을 찾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맞닥뜨리는 미스터리 공포물로 설명할 수 있다. 텔레비전(TV) 채널을 돌리다 보면 흔히 만날 수 있는 얼개의 영화 같지만, 한국보다 앞서 개봉한 해외 실적이 심상치 않다. 지난 8월 초 북미 개봉으로 시작해 영국, 호주 등 순차 개봉한 41개국에서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단 점에서다. 확장성의 한계가 뚜렷하고 언제나 호불호가 갈리는 공포물인데도 제작비(약 3800만 달러)의 7배에 달하는 2억60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영화에 대한 평단의 시선도 호의적이다. 간만에 나온 호러 영화라는 화제성에만 기대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박가언 BIFF 수석프로그래머는 “‘웨폰’은 대담한 스토리텔링, 앙상블 캐스트의 강렬한 연기, 공포를 극대화하는 촬영과 사운드, 긴장과 유머가 교차하는 연출이 조화를 이루며 완성됐다”고 했다. <리타 헤이워드와 쇼생크 탈출>, <미저리> 등 호러 소설의 거장으로 꼽히는 작가 스티븐 킹은 “자신하건대, 정말 무섭다. 그래서 마음에 든다”는 한 마디를 남겼을 정도다.
영화가 공포로 물 드는 시간은 새벽 2시 17분부터다. 모두가 잠들었을 시간에 같은 학급에서 공부하는 18명 중 17명의 아이가 사라진다. 현관 앞에 달린 폐쇄회로(CC)TV에서 기묘한 자세를 한 채 달려가는 모습만이 찍혔을 뿐 어디로, 왜 달려갔는지는 알 수가 없다. 마치 그림 동화로 잘 알려진 ‘피리 부는 사나이’와 비슷한 상황인데, 정작 피리 부는 사나이가 보이지 않는 것. 경찰은 물론 FBI까지 달라붙어 수사하지만 아이들의 행적은 오리무중이고, 평화로운 마을은 갈등에 휩싸인다.

영화는 모자이크 내러티브 방식으로 전개된다. 여러 인물의 시선으로 사건의 실마리를 교차시키며 전체적인 그림을 드러내는 구조다. 관객은 러닝타임의 상당 시간을 퍼즐 맞추듯 단서를 조합해야 한다. 사라진 아이들을 지도하던 담임 선생님으로 저스틴(줄리아 가너), 실종된 아이의 아버지로 갠디가 범죄를 저질렀으리라 믿는 아처(조시 브롤린), 겉으로는 온화해 보이지만 속에는 분노를 품고 있는 경찰 폴(올든 에런라이크), 마약에 중독된 노숙자이면서 절도범인 제임스(오스틴 에이브람스), 학교의 교장이면서 성소수자인 마커스(베네딕트 웡), 학급에서 유일하게 실종되지 않은 아이인 알렉스(캐리 크리스토퍼)의 시선이 카메라가 된다. 서로 연관이 없을 것 같은 인물들이 조금씩 접점을 갖고 있고, 그 접점이 우연하게 흑막을 드러낸다.
여기까지만 보면 스릴러처럼 보이지만 오컬트적 요소가 개입된다. 초자연적인 마술을 쓰는 마녀가 등장하며 논리와 비논리 사이를 오가며 미국식 도시전설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데 ‘겟아웃’이 연상되기도 한다. 다만 모호성 과잉의 내러티브와 잦은 시점 전환으로 해석 난이도가 올라가는 플롯, 기대했던 것보다 설득력이 부족한 결말은 아쉬운 점이다. 결함이 뚜렷하지만, 충격과 공포만큼은 확실한 만큼, 긴 연휴를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시점에서 한 번쯤 체험해볼 만한 강렬한 선택지다. 극장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불온한 긴장과 집요한 이미지가 오랫동안 잔상으로 남기 때문이다. 오는 15일 개봉. 128분.
유승목 기자

 21 hours ago
3
21 hours ago
3





![황보라 "이명 들리고 울렁, 공황장애인 줄 알고 병원 갔더니…" [건강!톡]](https://img.hankyung.com/photo/202510/03.35054006.1.jpg)
!["샤워는 하루에 한 번 아침에만 했는데…" 몰랐던 사실 [건강!톡]](https://img.hankyung.com/photo/202510/99.33832115.1.jpg)





![[단독] 만취해 운전대 잡은 30대 여성…중앙선 침범해 택시와 충돌](https://amuse.peoplentools.com/site/assets/img/broken.gi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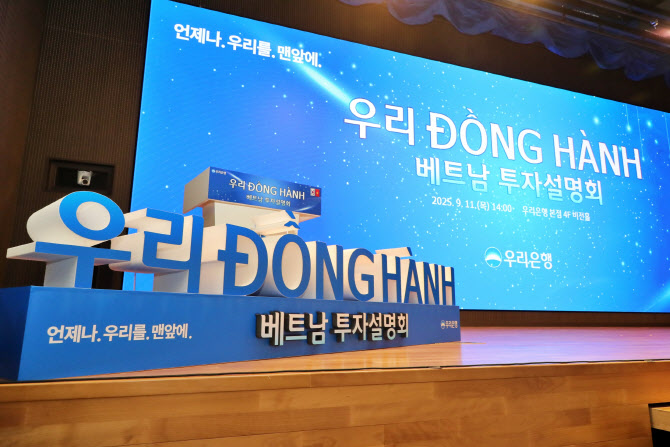
![JYP 박진영, 이재명 대통령 손 잡는다…“K팝 기회 살리려 결심” [이번주인공]](https://pimg.mk.co.kr/news/cms/202509/14/news-p.v1.20250910.34b4477db9874ff8a7eb9cb0d1087d7d_R.pn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