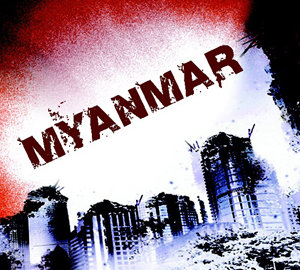
▷미얀마의 이 같은 아비규환은 비단 지진 때문만은 아니다. 4년 전 군부 쿠데타와 그에 따른 오랜 내전으로 이미 나라가 만신창이가 된 상태다. 군부와 저항세력 간 무력 충돌로 의료·구호 시설은 파괴됐고, 교통·통신 등 기반시설도 마비됐다. 많은 의사와 간호사들은 군사 정권에서 일할 수 없다며 의료 현장을 떠났다. 게다가 저항군이 장악하고 있는 만달레이 주변 지역은 군부 정권이 각종 물자 지원도 끊은 상황이었다. 군부는 반군을 소탕한다며 이 지역을 계속 공습해 왔고 심지어 지진이 나던 날에도 폭격을 퍼부었다.
▷미얀마 군부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2021년 총선 패배에 불복해 쿠데타를 일으켰다.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을 감금하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후 4년간 군부에 맞서다 목숨을 잃은 사람이 4400여 명에 달한다. 미얀마를 외부와 단절시키기 위해 방송과 인터넷을 차단해온 군부는 대지진이 나자 “모든 국가의 도움을 받겠다”며 국제사회에 처음 손을 벌렸다. 그만큼 상황이 처참하단 얘기다. 원자폭탄 334개에 맞먹는 강진으로 현재까지 공식 사망자만 1600여 명에 이른다. 사망자가 1만 명이 넘을 수 있다는 분석(미국 지질조사국)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얀마를 돕겠다”고 하지만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 미국의 해외 구호를 총괄하는 국제개발처(USAID) 폐지를 추진하면서 원조 사업을 대폭 축소한 장본인이 트럼프다. 그에 따른 인도주의적 지원 공백이 현실화되는 첫 사례가 미얀마 지진일 거란 우려가 높다. 국제사회 지원이 이뤄지더라도 군부가 통치 지역 외에는 원조품을 공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미얀마의 거의 절반은 민주 진영 임시정부의 관할하에 있다.▷최악의 시기에 강타한 초강력 지진으로 구조대와 의료진이 절실한 만달레이에는 총을 든 군인들만 넘쳐난다고 한다. 총으로는 단 한 명도 살릴 수 없다. 힘겹게 구조 활동을 벌이는 시민들은 외신에 “여긴 아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죽음의 도시”라고 말한다. 재난은 정치가 불안한 나라를 더 가혹하게 뒤흔든다.
신광영 논설위원 neo@donga.com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2 days ago
5
2 days ago
5

![[사설]尹 탄핵 심판 4일 선고… 불확실성의 짙은 안개 걷히길](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4/01/131330575.1.jpg)
![[김승련 칼럼]‘연어 술파티’ 주장을 대하는 2가지 방식](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4/01/131330450.1.jpg)
![[횡설수설/신광영]트럼프 피해 ‘학문적 망명’ 떠나는 美 석학들](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4/01/131330445.1.jpg)
![[오늘과 내일/김재영]‘美 해방의 날’, 예언서로 본 트럼프의 속내](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4/01/131330440.1.jpg)
![[데스크가 만난 사람]“의성 산청 산불 위험도 평년의 4배… 기후변화로 한반도 전역 위험권”](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4/01/131330433.1.jpg)
![[광화문에서/이유종]사업주-청년도 만족하는 묘수의 정년연장 논의를](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4/01/131330425.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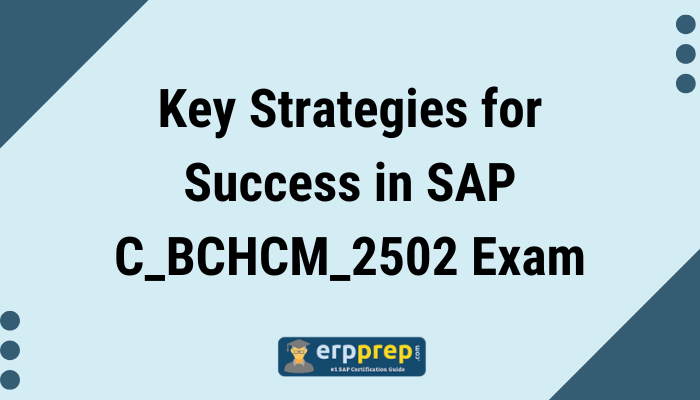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