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이 ‘학문적 망명’을 결심한 건 미 유수의 대학들이 트럼프의 압박에 학문의 자유를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컬럼비아대가 교내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를 허용한 것을 문제 삼아 반(反)유대주의를 부추긴다며 4억 달러(약 5900억 원)의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결국 대학 측은 집회 중 마스크 금지, 시위 학생 징계 등 방안을 내놓으며 항복했다. 하버드대, 펜실베이니아대 등도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관련 정책을 없애지 않으면 연방 예산을 끊겠다는 트럼프의 겁박에 비상이 걸렸다.
▷미 연구자들의 엑소더스(대탈출) 조짐은 학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최근 네이처지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5%가 ‘미국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예산 절감을 명분으로 연구비를 대폭 삭감한 충격이 크다고 한다. 많은 연구 프로젝트가 중단 위기에 처했고, 적대적 이민 정책까지 겹쳐 연구실을 지탱해온 해외 인재들을 데려오기도 깐깐해졌다.
▷미국의 과학기술은 제2차 세계대전 때 파시즘과 유대인 탄압이 심했던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 망명해온 학자들 덕에 획기적으로 도약했다. 노벨상 수상자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독일), 엔리코 페르미(이탈리아) 같은 과학자들이 미 기술 패권의 토대가 됐다. 요즘 실리콘밸리를 이끄는 건 인도계인 순다르 피차이(구글), 사티아 나델라(마이크로소프트), 대만계인 젠슨 황(엔비디아), 리사 쑤(AMD) 등 이민자 출신 CEO들이다. 또 풀브라이트 등 장학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 인재들을 빨아들인 게 국제개발처(USAID)인데 트럼프는 ‘국제 봉사에 왜 돈을 쓰느냐’며 이 기구를 없애려 한다.▷해외 대학들은 지금이 미국 인재들을 데려올 기회라고 보고 있다. 토론토대뿐 아니라 영국 케임브리지대,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등이 이들에게 자유로운 연구를 보장하겠다며 손짓하고 있다. 중국도 미국이 뒤로 빠진 틈을 타 개도국 인재들에게 두둑한 장학금을 내걸었다. 트럼프가 일부 열성 지지층만 바라보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외치는 사이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만든 인재들은 하나둘 떠나고 있다.
신광영 논설위원 neo@donga.com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1 day ago
5
1 day ago
5

![100점짜리 대한민국 향해[이근면의 사람이야기]](https://www.edaily.co.kr/profile_edaily_512.png)
![[기고]소득 크레바스 시대 '연금'을 알아야 하는 이유](http://thumb.mt.co.kr/21/2025/04/2025040213293316921_1.jpg)
![[기자수첩]도 넘은 ETF 보수경쟁, 정작 순자산가치 관리는 엉망](https://thumb.mt.co.kr/21/2025/04/2025040212321251216_1.jpg)
![[투데이 窓]AI 격차, 새로운 불평등의 시작](http://thumb.mt.co.kr/21/2025/04/2025040115552993151_1.jpg)
![[MT시평]경북 산불의 교훈](http://thumb.mt.co.kr/21/2025/04/2025040116002757306_1.jpg)
![[사설]첨단무기, 원전, 소고기… 상식 밖 美 ‘비관세 장벽’ 뭘 노리나](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4/02/131338754.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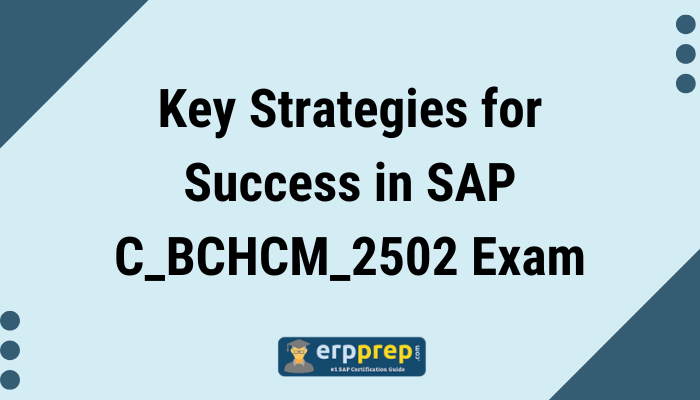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