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 제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당시에 유행하고 있는 기술의 트렌드를 알 수 있다. 몇 년 전에는 빅데이터라는 기술요소가 어디나 보였다. 예를 들면 '전자정부 빅데이터 고도화 3차 사업' 또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펜데믹의 확산 모형 개발 사업' 등이 그러했다.
지금은 인공지능(AI)이 빅데이터를 대체했다. 정부와 사회의 모든 절차가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방자치단체 전력 수요 예측을 위한 AI 모델 개발'이니, 'AI 탑재형 신형 무기체계 개발'이니 하는 프로젝트들이 그러한 사례들이다. 빅데이터를 포함한 당시의 신기술과 현재의 AI는 기업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차이점이 있다. 유일하게 기업의 회장님들이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는 기술이 AI다.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재미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회사에서 AI를 도입하기란 쉽지 않다. 첫째 미국이나 중국의 기업에서 만들어 제공하는 AI 서비스에 무턱대고 회사의 자료를 제공하면서 각종 질문을 하다가는 회사의 기밀이 손쉽게 새어 나갈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자발적으로 해킹을 당하는 것으로 눈 뜨고 코 베이는 격이라 할 수 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사용료 내고 개인정보와 회사의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외국의 AI는 이러한 자료를 공짜로 학습해서 더욱 경쟁력을 키워간다. 기술의 리더십을 빼앗기고 사용만을 강요당하는 나라의 현실은 이렇다.
둘째로 AI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한 비용을 들여서 AI를 구축해서 사용한다고 치면, 일단 회사에서는 AI가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만큼 회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노동조합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인위적인 인력 감축이 쉽지 않다.
다른 한편으로 회장님 입장에서는 AI 도입에 투자한 이상으로 회사의 성장이 있었으면 좋겠으나, AI를 곧바로 매출 증가로 연결할 방법을 찾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나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AI에 대체된 직원들을 모두 영업부로 돌려서 매출 확대에 매진해보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다. 챗GPT에 초보적인 질문을 던져서 신기함을 경험해본 수준의 회장님들이나 회사의 경영진들의 한계는 여기까지다.
과거에 컴퓨터와 네트워크가 세상에 나왔을 때도 기업은 지금과 동일한 고민을 했다. 그러나 정보기술(IT)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기업은 지방으로, 글로벌로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속도 측면에 있어서 투자 대비 보상이 상당했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됐고, 현재에 와서는 IT와 모바일의 협업으로 회사가 온라인상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지경이 됐다.
AI도 창의적으로 사용한다면 기업의 DNA를 바꾸어 놓을 수 있다. 한국에서 떡을 만드는 기업은 영세하다. 쫀득한 떡의 식감이 외국 사람들의 기호에 맞지 않기 때문에 떡은 국내에서만 팔리는 식품이고 그것도 명절에 주로 소비가 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K컬처의 영향으로 외국인들이 스스로 한국의 떡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게 됐다. 소위 꿀떡 시리얼이라는 것인데, 꿀떡에 칼집을 내고 우유에 넣어 먹는 것이다.
떡이 전 세계인이 매일 아침에 먹는 식사로 변신할지 어찌 알겠는가. 매출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명약관화다. 한국에 얼마나 많은 종류의 떡이 있는가. AI를 이용하면 이러한 조합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영세한 한국의 떡방이 글로벌한 업체로 변신이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알찬 정보를 AI로부터 얻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당한 수준의 AI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AI 자체는 질문을 받아야만 답을 하는 수동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질문을 잘해야 한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생겨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은 질문을 잘하는 문화가 아니다 보니 글로 질문을 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회장님을 포함한 40대가 넘은 관리자들은 새로운 변화에 적응이 쉽지 않음은 물론이고, AI를 회사의 업무에 적용하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삼 국어 시간에 배운 질문하기와 글쓰기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게 현실이다.
리더들에게 AI를 이용해서 기업에 근본적이고 창의적인 변화의 바람을 가져오게 하는 교육을 지속해서 해야 한다. 기술적인 부분 보다는 인문학적인 접근과 창의적인 질문을 통해 개인들과 기업이 함께 일신우일신 해야 하는 적절한 시기가 도래했다. 김동철 한성대 교수

 6 days ago
7
6 days ago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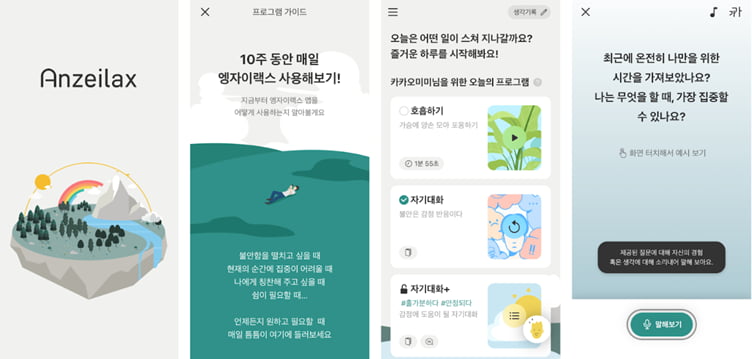
!["대박 마케팅" 이 악문 삼성…갤럭시 어떻게 팔았길래 [영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01.40097072.1.gif)




!["아들이 좋아하겠네"…게임 말리던 부모들도 꽂힌 의외의 장소 [영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01.40087652.1.jp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