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으로 홈플러스 매장을 매입했던 기관투자자들과 부동산 펀드들이 당혹스러운 처지에 빠졌다.
홈플러스는 그간 비핵심 점포를 폐점하고, 매각하거나 매각 후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확보해 차입금을 갚아왔다. 직접 소유하는 매장이 줄고 매각 후 재임대하는 점포가 늘어날수록 임대료 부담은 커졌다. 홈플러스는 연간 임대료로만 3400억원가량을 지출하고 있다.
MBK는 홈플러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 점포를 인수한 뒤 다시 임대해준 부동산 펀드 등은 이런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 당장 홈플러스를 내보내고 다른 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렵고, 이 점포를 매각해도 제값을 받기 쉽지 않아서다.
상업용 부동산 투자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들어가 있는 부동산은 용도를 전환하기도 어려워 오프라인 유통 시장이 침체된 현시점에서 다른 임차인 찾는 건 하늘의 별 따기”라며 “‘임대료를 내려주지 않으면 점포 문을 닫고 다 같이 죽는다’고 임차인이 건물주를 압박하는 ‘갑을 관계’가 뒤바뀐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방식으로 임대료를 낮추면 홈플러스는 재무 부담을 덜어내지만 이는 고스란히 부동산 펀드 등으로 전가된다. 홈플러스 점포를 자산으로 담고 있는 부동산 펀드인 이지스코어리테일부동산투자신탁126호, 유경공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 제이알제24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케이비사당·평촌리테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은 홈플러스에서 받은 임대료로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임대료를 낮추면 배당이 줄어 펀드 수익률이 떨어지고, 부동산 자산은 임대료로 가치를 평가하는 만큼 자산 가치도 떨어진다. 점포를 매각하는 것도 어렵지만 매각해도 시세 차익은커녕 원금을 건지기도 쉽지 않다는 얘기다.
다만 실제 임대료 인하가 이뤄지려면 MBK의 자구 노력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한 구조조정 전문 사모펀드(PEF) 운용사 대표는 “MBK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기업회생이라는 카드를 꺼냈지만 그 후폭풍이 예상보다 거세다”며 “선제적 구조조정이라는 표현으로 포장을 하더라도 자구 노력 없인 채권자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4 weeks ago
4
4 weeks ago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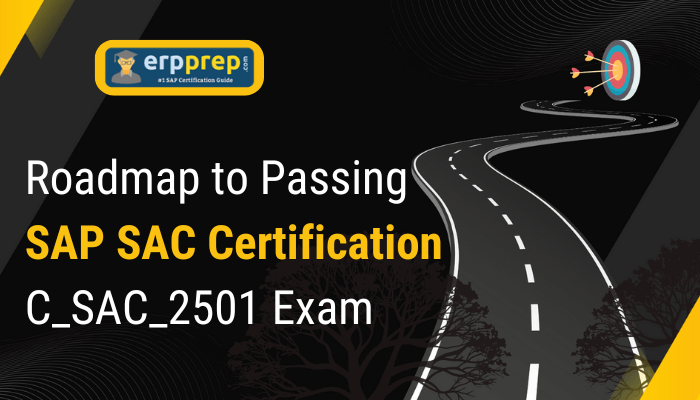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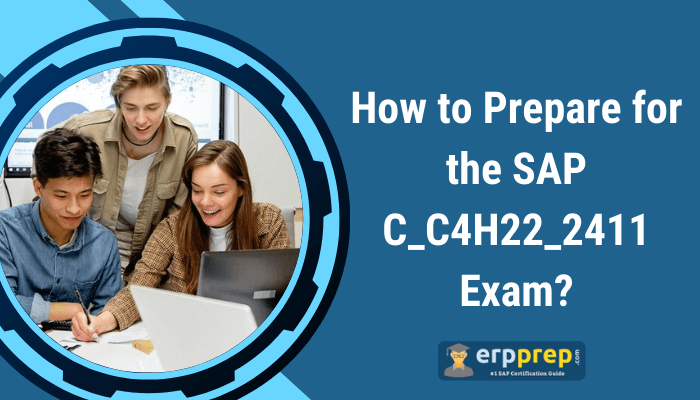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