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주고, 세금도 깎아줄게”…선거 앞둔 일본 [김일규의 재팬워치]](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01.40127230.1.png)
일본 여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해 현금 지급에 소비세 감세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일각에선 올여름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둔 ‘표(票)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이 ‘재정 중독’에 빠지면 결국 정권이 부메랑을 맞을 것이란 지적이다.
1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은 가격 인상이 이어지는 식료품 등에 대한 소비세 감세를 정부에 요구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전날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감세”라며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직접 덜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자민당 내에서도 올여름 참의원 선거 공약에 감세를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다만 감세는 관련 법률 개정에 시간이 걸리는 데다 일부 자민당 의원은 신중한 입장이어서 실현 여부는 유동적이다.
일본에서 소비세는 1989년 도입됐다. 처음에는 3%였으나 점차 세율이 올라 지금은 10%다. 국가 세수의 최대 30% 이상을 차지하며 저출산·고령화로 늘어난 사회보장비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앞서 여당 내에서는 1인당 3만∼5만엔(약 30만∼5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부상했다.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은 지난 8일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현금 지급안 검토를 요구했다. 공명당에서는 10만엔(약 100만엔)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30% 안팎으로 저조한 가운데 올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둔 점도 현금 지급 논의를 뒷받침한다. 현금 지급 대상에 소득 제한은 두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되는 만큼 소요 재원은 수조엔에 달할 전망이다.
그러나 지원금의 내수 진작 효과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업 임금 인상과 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편이 낫다는 견해도 나온다. 자민당 일각에선 선심성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여론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 예산·세제 정책을 짜는 재무성은 요즘 시위로 몸살을 앓는다. 도쿄 관청가 가스미가세키에 있는 재무성 앞에 1000명 넘게 모여 ‘재무성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시위대는 “재무성은 국민의 적”이라며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재무성에 성난 민심은 세금 때문이다. 앞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연간 비과세 소득 한도를 103만엔에서 178만엔으로 높이자는 야당(국민민주당) 요구를 재무성이 반대하면서다. 재무성이 세금 감면과 적극 재정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해 먹고살기 힘들다는 게 시위대 주장이다.
재무성이 비과세 소득 한도 인상에 반대한 것은 세수 펑크 때문이다. 한도를 178만엔으로 올리려면 연간 7조~8조엔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계산이다. 소비세율 기준 2~3%에 해당하는 세원을 잃어버린다는 게 재무성의 우려다. 일본 여야는 결국 160만엔으로 절충했다.
일본은 그럼에도 올해 20조엔가량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올해 국채 상환과 이자 지급에 충당하는 국채 비용으로만 28조엔가량을 써야 하는 처지다. 오랫동안 돈을 푼 대가다. 일본의 국채 발행 잔액은 작년 말 1105조엔에 달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260%로 세계 최악이다.
정치권의 방만한 재정 정책 때문에 경제 체질만 약화했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국민의 재무성 해체론은 재정 중독 탓이다. 현금 살포는 당장 인기를 끌지 몰라도 결국 국민을 재정 중독에 빠뜨린다. 뒤늦게 고삐를 죄면 저항을 부를 수밖에 없다. 한국도 강 건너 불구경할 일이 아니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1 week ago
8
1 week ago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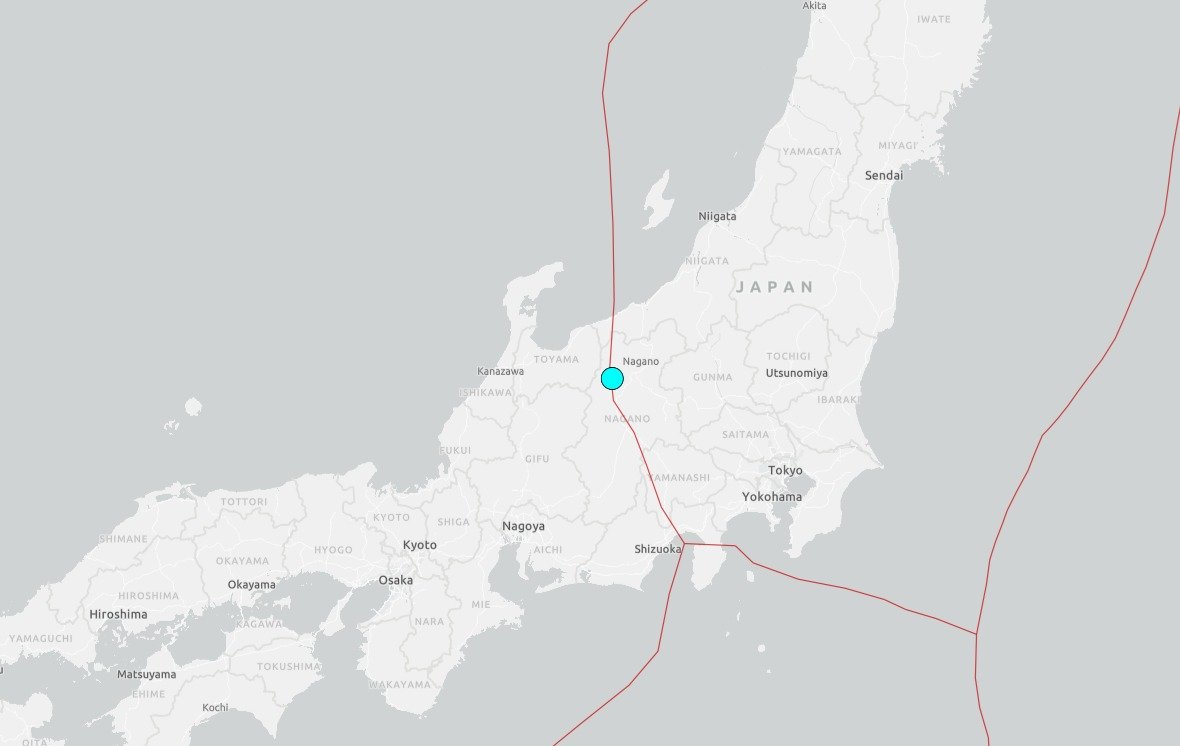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