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 빼앗는 사회
안혜정·조성호·이광형 지음, 위즈덤하우스 펴냄

2021년 2월 카이스트 제17대 총장으로 취임한 이광형 교수는 “성공률이 80%가 넘는 연구 과제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파격적인 선언을 했다. 그가 보기에 한국의 과학 기술계가 더 이상 패스트 팔로어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를 이끄는 퍼스트 무버가 될 역량은 이미 충분하다. 그러나 “과학 분야 노벨상은 대체 언제?”라는 단골 질문이 보여주듯, 세계를 놀라게 할 과학 기술 개발의 성과는 아직 부족하다.
이 총장은 우리가 노벨상을 수상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것, 이 세상에 없는 것에 도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단순히 남들이 만들어놓은 기술을 따라가지 말고 전례 없는 도전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카이스트의 실패연구소 설립 역시 이러한 철학의 연장선에 있었다.
실패연구소는 단순히 실패 사례를 모으고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전을 장려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설립됐다. 실패연구소 설립은 카이스트를 넘어 학계와 산업계에서도 주목받았다. 대학 차원에서 실패를 연구하는 정식 기구를 설립한 것이 한국 최초였기 때문이다. 실패연구소의 최종 목표는 실패연구소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작년 10월 실패연구소의 대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개개인은 실패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한국 사회는 여전히 실패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패가 ‘성공에 도움이 된다’에 동의한 사람(75.3%)이 ‘실패가 성공의 장애물’(26.5%)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두 배가 넘었다. 그러나 한국 사회 전반의 실패에 대한 태도를 묻는 질문에는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의 77.2%가 ‘한국 사회가 실패에 관대하지 않은 사회’라고 응답했다.
실패연구소는 사회적으로 실패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 과정이자 성장의 기회로 재해석하자는 것이다. 실리콘밸리의 페일콘에서 성공한 기업가들이 자신의 실패를 공유하고 실패박람회에서 다양한 분야의 실패 경험이 공유되면서 실패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가 아닌 혁신과 도전의 필연적 과정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또 실패를 공유한 이들 간에 연결감과 동료의식이 형성됐다.
왜 카이스트가 실패연구소를 만들었는지 주목해야 한다. 카이스트는 과학 기술 특성화 대학으로서 고유한 조직 문화를 발전시켜왔다. 하지만 이공계 중심의 편향성, 공공 출연 기관이라는 조직 구조, 국내를 넘어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성공 지향적 평가 체계가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조직 구성과 문화는 빠른 성과 달성을 이끄는 데에는 효과적이었지만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키우는 데에는 오히려 걸림돌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이른바 명문대 카이스트 학생이 무슨 실패를 걱정하느냐며 반문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카이스트 학생들의 속사정은 좀 다르다. 어린 시절부터 높은 학업 성취를 보이며 우등생 자리를 지켜온 카이스트 학생들 중에는 완벽주의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완벽주의는 높은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과도한 불안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 카이스트 학생들은 실패 경험이 적은 ‘실패 결핍’ 증상을 보이곤 한다. 입시라는 단일한 목표에 과도하게 몰입한 것이 실패를 건설적으로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 그 결과 학생들은 사소한 실수에도 크게 낙담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나아가 실패가 두려워 위험을 감수하는 도전을 피한다.
학생들은 실패 경험은 적으면서도 실패한 것 같은 느낌, ‘실패감’에 사로잡히곤 한다. 실패감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해석되는데 몇 년 전 한국 사회에서 유행했던 신조어 ‘벼락거지’라는 말이 이를 잘 보여주는 예다.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해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무주택자를 일컫는 말로 이들은 실패한 것 같은 느낌에 빠져들었다.
문제는 실패감이 실제로 실패가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그 자체로 실패를 여러 번 반복한 것과 유사한 부정적 심리 상태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실패감에 동반하는 좌절감과 수치심, 무력감 같은 감정은 다른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진다. 물질 중심적 가치관 같은 한국 사회 특유의 확일화된 가치관은 이 실패감을 키운다.






![최여진 예비 남편 전처 "부케는 내가 받을게"..불륜설 '끝'[동상이몽2][★밤TView]](https://thumb.mtstarnews.com/21/2025/03/2025033122171083255_1.jpg/dims/optimize/)

![故설리 오빠, 다시 라방 켰다 "김수현, 뭐가 억울한 건지..120억이 최종 목표?"[스타이슈]](https://thumb.mtstarnews.com/21/2025/03/2025033123003693171_1.jpg/dims/optimize/)
![최여진, 불륜 의혹 완벽 종식..♥김재욱 전 아내 "내가 증인, 말들이 많아"[동상이몽2][별별TV]](https://thumb.mtstarnews.com/21/2025/03/2025033122170650165_1.jpg/dims/optimiz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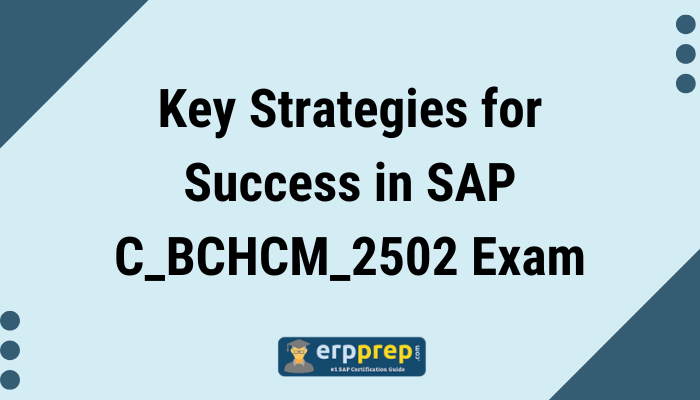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