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겨내자 혈액암] 〈下〉 림프종과 다발골수종 치료
동아일보-이대목동병원 공동기획
림프절 부어오르면 림프종 의심… 다발골수종, 허리병 오인할 수도
골수증식종양은 유형별로 치료

● 혈액암 중 림프종 비율 가장 높아

림프종을 진단하려면 림프절 조직을 전반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따라서 동네 의원이나 작은 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의심 소견이 나왔다면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다.
치료법은 악성도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 대체로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다. 다만 아주 작은 부위에만 국한된 호지킨 림프종이라면 방사선 치료만 할 수도 있다.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할 때는 미세한 암세포까지 죽이기 위해 고용량 항암제를 투입한다. 이 경우 피를 만드는 세포들까지 모두 죽어 버릴 수 있다. 이 때문에 미리 자신의 조혈모세포(자가조혈모세포)를 추출했다가 항암치료가 끝나면 다시 이식한다.
최근에는 이른바 4세대 치료제로 부르는 카티(CAR-T) 세포치료도 제한적으로 시행한다. 림프종의 경우 암이 사라짐을 뜻하는 ‘완전관해(寬解)’ 비율은 70∼80%에 이른다. 다만 15% 정도는 암이 재발한다. 이를 감안한 림프종 완치율은 50∼60%다. ● 다발골수종, 증가 속도 빨라다발골수종은 최근 국내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혈액암이다. 원인은 명확하지 않다. 다만 유전자 변이나 인구 고령화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발골수종은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아무런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 무증상 단계를 거쳤다가 고령이 된 후 다발골수종으로 악화하기도 한다.
다발골수종은 형질세포에서 발생한 암이다. 형질세포는 백혈구 일종으로 항체 생산에 관여한다. 이 형질세포가 암으로 바뀌며 비정상적인 항체가 만들어진다. 비정상적인 항체 덩어리는 뼈를 침범하고 녹이면서 골절을 유발한다. 신장으로 가면 신부전을 일으킨다. 조혈모세포가 줄어드니 빈혈이 생긴다.
골수검사를 비롯해 여러 검사를 통해 확진한다. 적잖은 환자들이 허리디스크나 척추관협착증으로 잘못 알고 병원에 갔다가 발견한다. 박 교수는 “X레이나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서 뼈가 녹아 있다면 다발골수종을 의심할 수 있다. 골다공증(뼈엉성증)이 심하지 않은데 압박성 골절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건강검진에서 이유 없이 빈혈, 단백뇨, 신장 기능 나쁨, 허리통증이 나타난다면 다발골수종 여부를 검사해 보는 게 좋다.
환자에게는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다. 이때 림프종과 마찬가지로 자가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건강 상태가 지나치게 좋지 않거나 70세 이상 고령이라면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이 어렵기 때문에 항암화학요법만 진행한다.
다발골수종은 완치가 쉽지 않은 병이다. 2000년대 초반에는 생존율이 1∼2%에 불과했다. 요즘에는 50% 가깝게 생존율이 높아졌다. 박 교수는 “재발이 잦아서, 완치한 줄 알았는데 다시 치료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지속적으로 경과를 관찰해야 하는 병”이라고 말했다.● 골수증식종양, 약물로 조절 가능
특정 유전자에 변이가 발생해 조혈모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증가하는데, 이 병을 골수증식종양이라고 한다. 혈액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유전자 변이 및 골수 검사를 통해 진단한다.

적혈구 증가증이라면 얼굴이 빨개진다. 적혈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혈전증이나 심부전증이 생길 우려가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저용량 아스피린을 처방한다. 혈소판 증가증일 때는 멍이 들 때가 많다. 이때도 혈전증을 막기 위해 아스피린을 처방하거나 혈소판 수치를 조절하기 위한 약을 투입한다.
일차성 골수섬유증이라면 골수가 섬유화하면서 피를 만드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빈혈 증세가 나타난다. 수혈을 자주 받아야 하는 등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병을 방치하면 10년 동안 10% 정도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악화한다. 이 교수는 “좋은 약이 많이 나오면서 조절만 잘 하면 일차성 골수섬유증이나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평생 급성으로 악화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경우 생존율은 90%를 웃돈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18 hours ago
6
18 hours ago
6










![[글로벌 이슈/김상운]반세기 만에 재현된 韓日 ‘안보 협력’](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2/12/131021108.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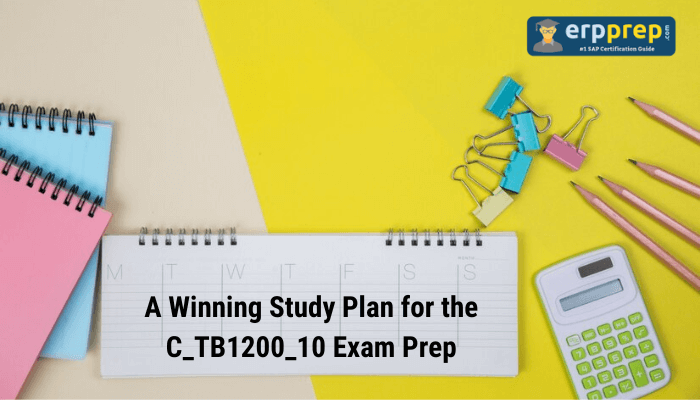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