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영화볼래! 커피한잔](https://img.hankyung.com/photo/202509/07.41561017.1.jpg)
부산국제영화제는 세계적인 축제다. 매년 가을 세계적인 감독과 배우들이 레드카펫을 밟고 수많은 관객이 해운대에 몰린다. 이런 성과가 콘텐츠, 제작 인프라, 스튜디오 같은 영화 관련 산업의 기반과 더 단단히 이어질 때 영화제의 힘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아직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얼마 전 화제의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보며 많은 생각을 했다. 이 작품은 미국 스튜디오가 제작했지만, 익숙한 K팝이 흐르고 캐릭터는 김밥을 먹는다. 관객은 자연스럽게 한국을 떠올린다. 이런 콘텐츠를 한국에서 제작하려 했다면 어땠을까. 투자 현장에서는 여전히 숫자와 재무제표 중심의 보수적 시각이 일부 존재하고, 모험을 기피하는 사회 분위기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해외에서 대중의 취향을 담은 이야기가 먼저 구현되는 것을 보니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산업화와 도전을 받쳐줄 자본이 왜 필요한지, 또 지역에서 얼마나 준비돼 있는지를 다시 묻게 됐다.
이런 고민은 영화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생활 속 커피 문화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드러난다. 부산에서는 커피에 대한 관심이 크다. ‘커피 도시’라 불릴 만큼 카페 문화가 발달했다. 전국적으로도 카페는 도시의 풍경을 바꾸는 주요한 문화 요소가 됐다. 이제는 소비와 관광의 성과 위에 산업적 기반을 더해야 비로소 경쟁력이 생긴다. 사실 이런 과제는 여러 도시가 함께 풀어가야 할 일이다. 다양한 지역의 축제와 소비 행사가 당장 즐거움은 크지만, 산업과 일자리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커피 역시 로스팅, 장비, 브랜드로 이어지는 산업화가 병행될 때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
앞으로 축제와 소비를 산업으로 확장하는 일이 중요하다. 영화제라면 콘텐츠 기업이, 커피라면 장비와 브랜드 기업이 지역에 뿌리내려야 한다. 그래야 연구·기술·마케팅 직군이 늘어나고, 좋은 일자리가 생긴다. 스티브 잡스가 “혁신은 고객의 경험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듯, 커피 한 잔의 경험도 산업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경쟁력이 된다. 영화·커피·K콘텐츠 모두 산업으로 이어져야 한다.
부산은 이미 풍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바다와 항만, 관광과 문화, 젊은 세대의 열정까지. 여기에 영화, 커피, K콘텐츠 산업이 더해진다면 더 큰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 국제영화제를 보러 온 관객이 지역 브랜드 커피를 손에 들고 거리를 거닐고, 그 옆 극장에서는 국내에서 제작한 K콘텐츠가 상영되는 장면이야말로 축제와 소비가 산업으로 이어지는 미래다.
영화 볼래! 커피 한잔. 이 짧은 말속에는 도시와 지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담겨 있다. 이제는 소비의 무대를 뛰어넘어 산업의 무대로 가야 한다. 영화제가 영화산업으로, 커피가 커피산업으로, K콘텐츠가 산업으로 이어질 때 지역은 일자리가 살아나는 진짜 문화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

 2 weeks ago
8
2 weeks ago
8
![[부음] 황보람(KNN 기자)씨 조모상](https://img.etnews.com/2017/img/facebookblank.png)
![[ET톡]반도체 패키징과 AI 주도권](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7/17/news-p.v1.20250717.5b1013be1bb24778821125a305a49112_P1.jpg)

![[투데이 窓]중복 넘어선 협력, 스타트업 지원 정책의 전환점](http://thumb.mt.co.kr/21/2025/09/2025091717243298873_1.jpg)


![[속보] 특검 “윤, 계엄논의 작년 3월부터 시작…원내대표도 인지 가능성”](https://pimg.mk.co.kr/news/cms/202509/03/news-p.v1.20250903.0f7ed213f6e645018311c6ea68869499_R.jpeg)

![생성형AI 끼고 상담하는 설계사…보험도 인공지능 혁신 진행 중[금융가 톺아보기]](https://pimg.mk.co.kr/news/cms/202509/04/news-p.v1.20250904.4e6ff2e473814eba97c10d2b6c1ee0e0_R.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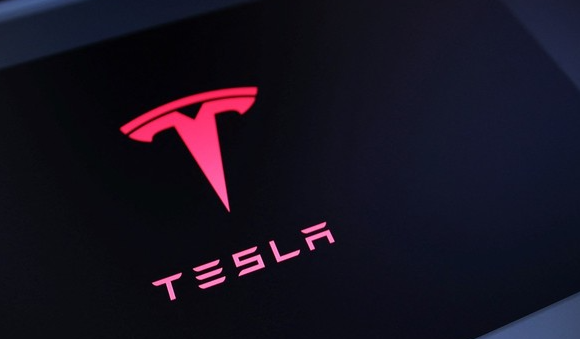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