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전쟁 포로 교환](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AA.39073457.1.jpg)
근대 이전까지 전쟁 포로는 처형당하거나 노예로 팔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로마군에 붙잡힌 카르타고인이나 게르만족 중 일부는 노예를 피해 검투사로 살기도 했다. 후한 몸값 덕분에 풀려나는 경우도 있긴 했다. 프랑스가 막대한 몸값을 지급하고 십자군 원정 당시 포로로 잡힌 루이 9세를 구해낸 게 그런 예다. 동양에서도 포로가 석방된 사례는 거의 없다. 중국 전국(戰國)시대 진나라는 조나라 포로 40만 명을 생매장했다. 몽골에 끌려간 고려 백성과 군사가 20만 명 정도인데 대부분 노예로 생을 마쳤다.
전쟁 포로 교환이 시작된 것은 17세기 유럽의 30년 전쟁 때다. 개신교와 구교 양쪽 군대에서 배상금(몸값) 요구 없이 비슷한 수의 포로를 풀어줬다. 전쟁 포로와 관련한 국제협약인 제네바협약은 19세기 중반 맺어졌다. 이후 1949년까지 세 차례 개정이 이뤄졌으며 지금에 이르고 있다. 전쟁 포로를 수용하고 보호하며 인간적인 대우를 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6·25전쟁 때는 1951년 7월 휴전 협상과 함께 포로 교환 논의가 시작됐다. 국토 확정과 함께 포로 교환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전투는 더욱 격렬해졌다. 열흘간 주인이 일곱 번이나 바뀐 백마고지 전투가 대표적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의 안보를 보장받기 위해 전쟁 강행 의지를 다지고 1953년 6월 반공 성향의 북한군 포로 2만7000여 명을 일방 석방하는 모험을 감행했다. 이 같은 승부수가 통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유사시 자동 개입을 명시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같은 해 10월 체결됐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그제 300명 이상의 포로를 교환했다. 전쟁 발발 후 59번째지만 이번 포로 교환의 의미는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규모가 최대인 데다 종전을 내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 직전 이뤄졌기 때문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결사 항전보다 외교전을 말하는 빈도를 높여가고 있다. 하지만 전투는 훨씬 더 치열해져 인명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살기 위해 끝내는 전쟁이 더 많은 희생자를 내고 있는 것이다. 전쟁마다 되풀이되는 종전의 역설이다.
박준동 논설위원 jdpower@hankyung.com

 2 weeks ago
8
2 weeks ago
8
![[단독]민간인 노상원 지시에…'고무탄·가스총 무장' 선관위 서버반출조 대기](https://thumb.mt.co.kr/21/2025/01/2025011811210226673_1.jpg)
![[부음]나형근(한경협국제경영원 부원장)씨 부친상](https://img.etnews.com/2017/img/facebookblank.png)
![[사설]39% 대 36%… 홀로 과속하다 지지율 역전당한 野](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1/17/130886910.1.jpg)
![[횡설수설/장원재]돈 걷어 ‘간부 모시는 날’, 공직사회 아직도 이런 폐습이…](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1/17/130886903.1.jpg)
![[오늘과 내일/우경임]건보료 개편과 연금 개혁의 ‘평행 이론’](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1/17/130886897.1.png)
![[동아광장/송인호]위축된 경제 심리의 경고음이 들리는가](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1/17/130886895.1.png)
![1월 둘째 주, 마켓PRO 핫종목·주요 이슈 5분 완벽정리 [위클리 리뷰]](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99.34900612.1.jpg)
!["이러다, 다 죽어!"…'오징어게임2' 망하면 큰일 난다는데 [김소연의 엔터비즈]](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9034730.1.jpg)


!["나랑 XX 할래"…돌봄 로봇과 성적 대화 하는 노인들 [유지희의 ITMI]](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164747.1.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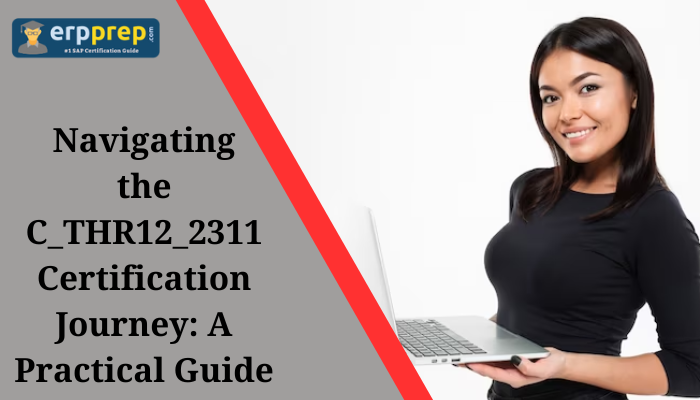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