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년생 데이비드 오케인
‘자아의 교향곡’展 최근 개막
갤러리바톤서 2월 15일까지
![데이비드 오케인, ‘Gloaming’(140x100cm). [갤러리바톤]](https://pimg.mk.co.kr/news/cms/202501/22/news-p.v1.20250122.336b181d4e0d4276a39aa35bc80f55a2_P1.png)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는 무지와 진리에 대한 절대적 은유로 기능해왔다. 동굴 안의 사람은 환영만을 볼 뿐이며, 이데아로서의 태양은 동굴 바깥에 존재한다는 그 비유. 인간은 동굴 밖을 나갈 수 없다. 이것은 인간의 감각적인 한계를 말해주는 슬픈 서사였다.
회화작가 데이비드 오케인의 캔버스에선, 불투명한 천이 플라톤의 오래된 동굴을 현대적으로 변주한 사물처럼 보인다. ‘너머’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천을 뒤집어쓴 미스터리한 인간에게, 그를 둘러싼 천은 태양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막이자 울타리가 돼서다. 그러나 세계와 단절된 상태는 빛을 통해 하나의 형상을 이루므로, 플라톤의 동굴 속 인간의 운명처럼 비관적이진 않다. 천 안의 세계는 새로운 창조를 위한 자궁인 것이다.
오케인 작가의 전시 ‘자아의 교향곡(Symphony of Selves)’이 서울 한남동 갤러리바톤에서 최근 개막했다. 이번 전시에 소개된 작품에선 모든 인간이 불투명한 천을 두르고 있는데, 작품을 보는 이는 천 안의 인간을 상상하게 된다. 가로막혀 있고, 벗어나지 못하고, 심지어 외부와 완벽하게 시각적으로 단절돼 있지만 천의 내부에서 심오한 자세를 취하는 중인 여러 형상들은 ‘예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거대한 메타포로 읽힌다.
이번 전시의 대표작 ‘Gloaming(해가 진 뒤의 으스름이란 뜻)’에선 천의 주름을 유심히 살펴보게 된다. 사방으로 뻗은 팔다리가 천을 움켜쥔 이 그림은 천을 찢고 나오려는 듯이 강렬한 에너지로 가득하다. 그의 모습은 천으로 가려졌지만 그가 내부에서 행하는 행동은 그 자체로 미적이다. 천의 주름은 그를 비추는 외부의 빛으로써 가시화된다. 빛이 지나간 자리에서만 그림자는 만들어지고, 이 그림자는 주름으로 형상화되기 때문이다.
다른 작품 ‘Catching Light’는 연극의 한 장면에 정지버튼을 누른 듯한 환시를 일으킨다. 머리끝까지 거대한 천을 뒤집어쓴 두 인간이 마주 보는 모습을 그렸는데, 두 사람을 뒤덮은 천은 꽤나 무거워 보인다. 플라톤 식으로 비유한다면 두 사람은 천이라는 ‘동굴’을 머리에 이고 가다 멈춰선 셈인데, 수수께끼로 가득한 이 한 장면은 호기심을 자극한다. 오케인 작가는 “그림자를 사용하여 그 너머의 무언가, 느껴지지만 아직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어쩌면 알 수 없는 무언가를 가리키려 한다”고 말했다.
1985년 아일랜드에서 태어나 현재 독일 베를린에 거주하는 오케인 작가는 신(新) 라이프치히 화파를 이끈 네오 라우흐로부터 사사를 받았다고 한다. 그의 작품은 부산시립미술관, 독일 쿤스트할레 슈파카세 라이프치히, 영국 자블루도비치 컬렉션, 아일랜드 캡 파운데이션, 푸에르토리코 트라파가-포날레다스 컬렉션 등에 소장돼 있다. 전시는 2월 15일까지.
![데이비드 오케인, ‘Catching Light’(140x100cm). [갤러리바톤]](https://pimg.mk.co.kr/news/cms/202501/22/news-p.v1.20250122.875a8b564da34a00923ec899e5ce0abe_P1.png)



![전여빈의 '쓰임' [인터뷰+]](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275047.1.jpg)



![김연아, 짙어진 쌍꺼풀처럼 깊은 고혹미 [화보]](https://dimg.donga.com/wps/SPORTS/IMAGE/2025/01/22/130916333.1.jpg)
![송혜교 솔직 고백 "대중목욕탕 가면 창피해서 얼굴만 가린다"[스타이슈]](https://thumb.mtstarnews.com/21/2025/01/2025012218433056003_1.jpg/dims/optimize/)
![1월 둘째 주, 마켓PRO 핫종목·주요 이슈 5분 완벽정리 [위클리 리뷰]](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99.34900612.1.jpg)
!["이러다, 다 죽어!"…'오징어게임2' 망하면 큰일 난다는데 [김소연의 엔터비즈]](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9034730.1.jpg)
!["나랑 XX 할래"…돌봄 로봇과 성적 대화 하는 노인들 [유지희의 ITMI]](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164747.1.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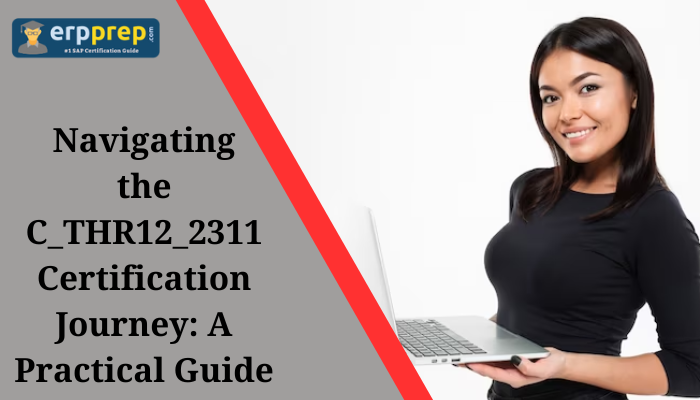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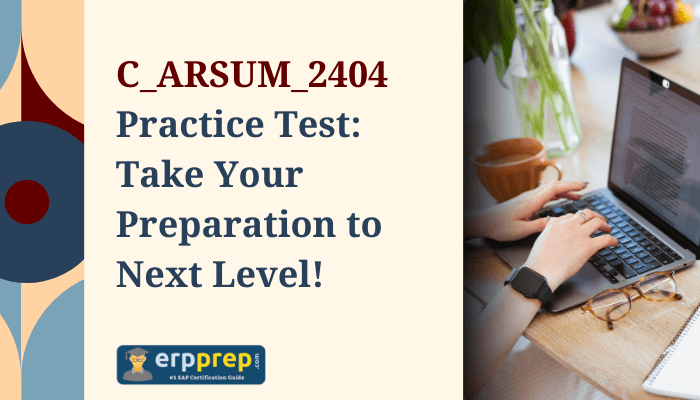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