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신청했더라도 실제 등기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집을 비운다면,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은 사라지고, 이후 등기로도 그 권리는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주택 경매로 낙찰자 A씨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사건은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
이 사건의 세입자 C씨는 2017년 2월, 천안시의 한 아파트에 보증금 9500만원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다. 2월 27일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해 3월 20일 확정일자를 받았다. C씨는 이사 당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안 돌려줄 경우 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이 대신 돈을 돌려주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2019년 2월 C씨의
서울보증보험은 집주인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임대차계약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
서울보증보험은 같은 해 4월 5일 A씨에게 9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고, 그는 같은 날 주택에서 이사 갔다. 회사는 그 전 달 12일 A씨를 대신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내려진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A씨가 이사 나간 지 3일 후인 4월 8일에 임대차등기를 마쳤다.
서울보증보험은 해당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해 1272만원을 배당받았다. A씨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서울보증보험은 보증금반환채권에서 배당금액을 제외한 8227만 원을 이 씨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인 서울보증보험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피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 C씨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은 서울보증보험에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보증금 전액이 배당되지 않은 경우, 임대차관계는 여전히 존속하며, 그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반환의무를 진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재판에서의 쟁점은 임차권등기 과정에서 서울보증보험의 ‘대항력’이 유지됐는지 여부였다.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집을 비운 뒤에도,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소유자가 바뀌는 상황에서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임대차 계약을 주장하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다만, 등기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대항력이 성립하려면, 등기 당시에도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문제는 C씨가 등기 완료 전인 4월 5일, 이미 집을 비우고 이사했다는 점이었다. 서울보증보험이 임차권등기를 마친 시점은 그로부터 사흘 뒤인 4월 8일이었기 때문에, 그 등기로 과거의 대항력이 계속 보호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등기 이전에 C씨가 주택을 비웠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2심도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임차권등기가 경매 개시 결정보다 먼저 이루어진 이상, 설령 점유가 등기 전 상실되었더라도 등기를 통해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후 임차권등기까지 일정한 시차가 발생하는 것은 관할 법원의 업무 사정상 불가피한 현실”이라며 “임차권등기는 임차보증금과 계약일자, 전입일자, 점유일자 등이 공시되는 장치이므로, 대항력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이전 세입자인 C씨가 2019년 4월 5일 주택에서 이사를 나가면서 점유를 상실함으로써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은 그 시점에 소멸했고, 이후인 4월 8일 임차권등기가 마쳐졌다고 해도 이는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주택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통해 대항력을 취득하였더라도, 이후 점유를 상실하면 그 대항력은 소멸하고, 임차권등기를 하더라도 소멸한 대항력이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등기 시점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한 이 사건 주택에는 이미 2018년 1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후 발생한 임차권은 그보다 늦은 권리로서 경매로 함께 소멸하며, 이 주택을 매수한 A씨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은 A씨에게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나머지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21 hours ago
1
21 hours ago
1
![[속보]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도 연기…추후 지정](https://amuse.peoplentools.com/site/assets/img/broken.gi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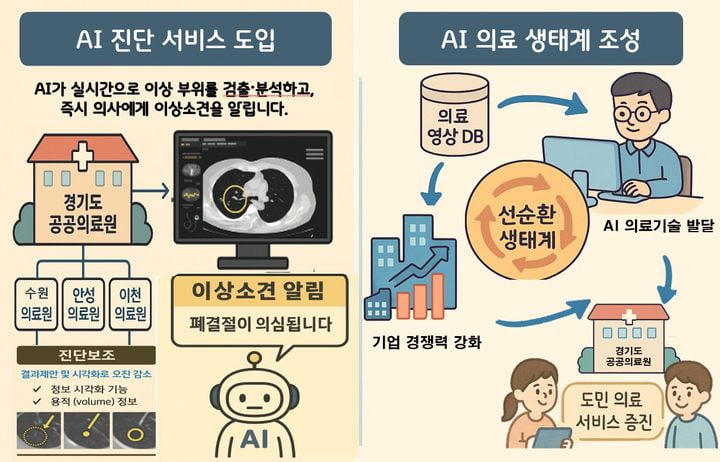





![“뭉클했다” 친정팀 환영 영상 지켜 본 김하성의 소감 [MK현장]](https://pimg.mk.co.kr/news/cms/202504/26/news-p.v1.20250426.d92247f59a8b45a6b118c0f6ea5157ef_R.jp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