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용석 칼럼] '국장 탈출은 지능 순' 조롱 싫다면](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7.14477123.1.jpg)
2024년 한국 증시는 우울했다. MSCI 신흥국지수에서 한국 비중은 중국, 대만, 인도에 이어 4위로 밀렸다. 2019년 대만에 2위를 내주고 3위로 내려선 지 5년 만에 한 계단 더 강등됐다. 선진국지수 편입은커녕 신흥시장 내 존재감마저 약해진 것이다.
증시 성적표는 바닥이다. 코스피지수는 9.6%, 코스닥지수는 21.7% 하락해 세계 93개 주요 지수 중 수익률 순위가 각각 88위와 92위였다. 주가 급락으로 허공에 날아간 돈만 두 시장 합쳐 255조원에 달한다. ‘국장(국내 증시) 탈출은 지능 순’이란 자조가 증시 유행어가 됐을 정도다.
국내 증시가 ‘김빠진 콜라’처럼 맥을 못 춘 것은 엔비디아, 테슬라 등 미국 빅테크처럼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보여주는 기업이 드문 게 1차적 원인이다. 삼성전자의 초격차 경쟁력이 흔들리고 자동차, 가전,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은 중국에 쫓기거나 추월당했는데 인공지능(AI) 같은 미래 산업에선 눈에 띄는 기업이 안 보인다. 주가가 장기 우상향 곡선을 그리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도 주가가 기업이 가진 내재가치 수준을 유지할 순 있는데 그렇지 못한 기업이 부지기수다. 심지어 주가가 청산가치를 밑도는 기업도 수두룩하다. 성장 동력 정체 또는 배당, 자사주 매입·소각 같은 주주환원책 부족이 주요 원인이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투자자 불신을 부추기는 일부 상장사 행태도 빼놓을 수 없는 이유다. 툭하면 벌어지는 ‘쪼개기 상장’을 비롯해 두산그룹 사업재편 과정에서 불거진 계열사 간 합병 비율의 적정성 공방,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의 비상식적인 유상증자 시도 등 일반 주주 이익과 상충 논란을 빚는 사례가 속출해 이런 불신이 증폭됐다. 모두 선진국 증시에선 보기 드문 일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은 기업 투자와 경영에 부담을 주는 등 부작용이 커 바람직하지 않지만 다른 정책적 수단을 통해서라도 시장 불신을 해소할 장치가 필요한 건 분명하다.
‘뻥튀기 상장’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다. 주요 거래처의 발주 감소로 매출 급감이 예상되는데도 이를 숨기고 상장한 혐의를 받는 파두가 대표적이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처럼 사모펀드와 상장 후 수익을 나누는 계약을 맺고 공시하지 않는 ‘깜깜이 상장’도 오십보백보다. 기업공개(IPO)는 초기 투자펀드의 자금 회수 수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반 주주와 기업 성장의 과실을 나누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 대주주나 사모펀드의 투자금 회수를 위한 ‘엑시트용 상장’으로 전락해선 곤란하다.
IPO는 많고 퇴출이 적은 것도 한국 증시의 고질병이다. 한국 증시에선 2023년 119개사가 상장하는 동안 퇴출은 27개사에 그쳤다. 진입 대비 퇴출 비율은 22.7%였다. 같은 기간 미국은 132개사가 상장하고 193개사가 퇴출돼 이 비율이 146.2%나 됐다. 일본(72.8%), 대만(52.9%)도 한국 증시보다 퇴출이 활발하다.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만 증시에 입성할 수 있듯, 요건에 미달한 기업은 증시에서 퇴출돼야 한다. 그래야 증시 수급도 좋아진다. 부실기업이 이런저런 이유로 버티면 증시 활력이 떨어지는 건 보나 마나다.
공매도 금지처럼 글로벌 스탠더드에 안 맞는 제도가 불쑥 시행되거나 정부가 약속한 밸류업 세제가 국회에서 불발하는 등 정책 리스크도 문제다. 정상화가 필요하다.
환자가 아프면 제때 약을 써야 낫는다. 그대로 두면 병세만 악화한다. 증시도 마찬가지다. 저평가 요인을 방치하면 올해도 ‘국장 탈출은 지능 순’ 소리를 수도 없이 듣게 될 것이다

 2 weeks ago
7
2 weeks ago
7
![[단독]민간인 노상원 지시에…'고무탄·가스총 무장' 선관위 서버반출조 대기](https://thumb.mt.co.kr/21/2025/01/2025011811210226673_1.jpg)
![[부음]나형근(한경협국제경영원 부원장)씨 부친상](https://img.etnews.com/2017/img/facebookblank.png)
![[사설]39% 대 36%… 홀로 과속하다 지지율 역전당한 野](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1/17/130886910.1.jpg)
![[횡설수설/장원재]돈 걷어 ‘간부 모시는 날’, 공직사회 아직도 이런 폐습이…](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1/17/130886903.1.jpg)
![[오늘과 내일/우경임]건보료 개편과 연금 개혁의 ‘평행 이론’](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1/17/130886897.1.png)
![[동아광장/송인호]위축된 경제 심리의 경고음이 들리는가](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1/17/130886895.1.png)
![1월 둘째 주, 마켓PRO 핫종목·주요 이슈 5분 완벽정리 [위클리 리뷰]](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99.34900612.1.jpg)
!["이러다, 다 죽어!"…'오징어게임2' 망하면 큰일 난다는데 [김소연의 엔터비즈]](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9034730.1.jpg)


!["나랑 XX 할래"…돌봄 로봇과 성적 대화 하는 노인들 [유지희의 ITMI]](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164747.1.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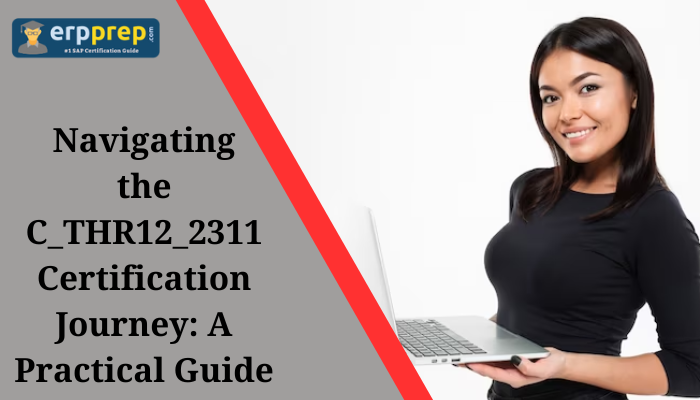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