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프리즘] '무용론' 키운 정부의 부실 경제전망](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7.14660767.1.jpg)
“지난해 국내 기업 임원이 대거 옷을 벗게 된 데는 장밋빛 경제 전망을 내놨던 정부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사석에서 만난 대형 물류회사 A임원은 작년 실적과 관련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너무 높게 제시하고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계속 내놔 실제론 경기가 냉각되고 있는데도 기업들이 영업 목표를 하향 조정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목표 달성에 실패한 임원들이 교체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경제성장률은 환율, 물가 등과 함께 기업이 매년 사업계획을 짤 때 반영해야 할 기본 요소다. 이들 전망치가 있어야 매출 목표를 잡을 수 있고, 원재료와 임금 등 비용 추정도 가능하다. 삼성 등 자체 연구소를 둔 일부 그룹을 제외하면 대부분 기업은 정부와 한국은행, 국책·민간연구소, 국내외 투자은행(IB),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거시지표 전망치 일부를 평균해 활용한다. 연구소를 보유한 그룹의 계열사도 자체 전망치를 쓰지만 정부의 성장률 전망과 경기 판단을 참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기업들의 설명이다.
정부는 작년 경기 흐름을 잘못 읽어도 너무 잘못 읽었다. 반도체 한파로 성장률이 1.4%에 그친 2023년 4분기부터 정부는 경기가 회복세를 보인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초 2.2%의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다. 실제 작년 1분기 1.3%의 깜짝 성장률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고무돼 “수출에 더해 소비, 건설 투자 반등이 함께 이뤄지면서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고 자평했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5월부터 월별 경제동향(그린북)에서 ‘내수 회복 조짐’을 언급하며 7월 초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끌어올렸다. 하지만 작년 내내 건설 투자가 급감한 가운데 6월부터 카드 매출이 감소하더니 2분기 성장률은 -0.2%로 뒷걸음질 쳤고 3분기엔 반도체 수출마저 줄어 성장률이 0.1%로 추락했다. 1분기 깜짝 성장에 취한 정부는 다른 기관들의 성장률 하향 조정에 침묵하다가 결국 작년 11월, 12월 그린북에서 ‘내수 회복 조짐’과 ‘경기 회복’ 단어를 뺐고 작년 말 성장률 추정치를 다시 2.1%로 낮췄다. 불과 몇 개월 뒤 경기도 예측하지 못한 것이다.
경제 전망은 틀리는 게 다반사다. 하지만 한국처럼 정부까지 나서 틀린 경제 전망을 하는 건 적어도 선진국에선 거의 없다. 1960년대부터 정부가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1년에 두 차례 해당 연도 및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성장률 전망치를 함께 발표하던 관행이 지금까지 굳어진 결과다. 경제정책 방향과 같이 발표하다 보니 정부 성장률은 한은 등 다른 기관들의 전망치 평균보다 높은 게 일반적이다. 경제 관료들은 “정부는 예산, 세제 등 정책 수단이 있는 만큼 ‘정책 의지’를 성장률에 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정부는 작년엔 경기 판단을 잘못해 하반기 경기가 고꾸라지는데도 제대로 된 정책 수단 한 번 쓰지 못했다.
기재부는 최근 ‘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을 1.8%로 내다봤다. 한은 전망치(1.9%)보다 낮다고 하지만 이조차 달성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의구심이 나온다. 일부 외국계 IB는 탄핵 정국 등에 따른 내수 추가 침체를 반영해 올 성장률을 1.3%까지 낮췄다. 올해도 작년 실수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소비, 수출 등 경기 관련 통계의 실시간 분석 능력을 높이고 시장과의 소통도 늘려 정확한 경기 진단부터 해야 한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재정 보강도 적기에 해 성장률 추가 하락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 기업 등 경제주체의 의사결정만 왜곡하는 부실 경제 전망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1 week ago
6
1 week ago
6
![[단독]민간인 노상원 지시에…'고무탄·가스총 무장' 선관위 서버반출조 대기](https://thumb.mt.co.kr/21/2025/01/2025011811210226673_1.jpg)
![[부음]나형근(한경협국제경영원 부원장)씨 부친상](https://img.etnews.com/2017/img/facebookblank.png)
![[사설]39% 대 36%… 홀로 과속하다 지지율 역전당한 野](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1/17/130886910.1.jpg)
![[횡설수설/장원재]돈 걷어 ‘간부 모시는 날’, 공직사회 아직도 이런 폐습이…](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1/17/130886903.1.jpg)
![[오늘과 내일/우경임]건보료 개편과 연금 개혁의 ‘평행 이론’](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1/17/130886897.1.png)
![[동아광장/송인호]위축된 경제 심리의 경고음이 들리는가](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1/17/130886895.1.png)
![1월 둘째 주, 마켓PRO 핫종목·주요 이슈 5분 완벽정리 [위클리 리뷰]](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99.34900612.1.jpg)
!["이러다, 다 죽어!"…'오징어게임2' 망하면 큰일 난다는데 [김소연의 엔터비즈]](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9034730.1.jpg)


!["나랑 XX 할래"…돌봄 로봇과 성적 대화 하는 노인들 [유지희의 ITMI]](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164747.1.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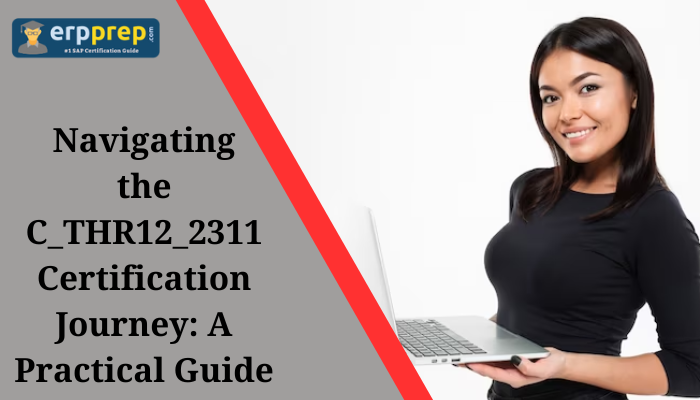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