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관세 폭탄'으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에 경고등이 켜졌다. 미국 정부가 관세 46%를 적용한 베트남에서 주로 북미향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있어서다. 삼성전자·LG전자의 북미향 가전 생산기지는 이번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멕시코에 몰려 일단 한숨을 돌렸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동 폭이 커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다.
베트남 노린 관세 폭탄, 생산지 이전 압박 우려
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상호 관세를 놓고 촉각을 세우고있다. 삼성전자가 북미로 수출하는 갤럭시 스마트폰은 베트남과 브라질에서 생산된다. 특히 베트남 생산물량이 북미향 스마트폰의 대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삼성전자의 전체 스마트폰 생산량 중 40~50%는 베트남, 20~30%는 인도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나머지 물량은 인도네시아, 한국, 브라질 등에서 생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에 상호 관세 46%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베트남이 자국에 대해 사실상 90%의 관세나 다름없는 무역장벽을 세워두고 있다는 이유다. 다만 관세 발표 이후 업계 안팎에선 각국 대미 수출액 대비 흑자 규모를 기준으로 산출한 '엉터리 관세'란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 시장에선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S 시리즈와 보급형 중저가 제품군 갤럭시A 시리즈 판매 비중이 크다. 아이폰과 비교해 가격경쟁력 면에서 앞섰지만 연간 출하량 기준 점유율은 20% 초중반대에 머물러 있다. 관세 적용 이후 점유율만 유지해도 선방한 것이란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애플도 중국에서 아이폰 전체 물량 중 90%를 생산하는 만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 중국은 기존에 부과된 20%에 더해 상호 관세 34%가 추가되면서 총 54%의 관세 폭탄을 안았다. 가격 자체가 높은 아이폰이 현재보다 더 비싼 값이 될 경우 판매량 변동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일각에선 애플이 미국에 향후 4년간 AI 분야에만 5000억달러(약 734조원)를 투자하겠단 계획을 협상 카드로 내세워 '관세 면제'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외국 기업을 우호적으로 보고 있다.
실제 트럼프 1기 행정부 땐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면서도 애플은 이를 면제받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애플에 관세를 면제하는 예외를 두지 않겠단 입장을 내놨다.
비교적 관세가 적게 부과되는 브라질로 생산물량을 옮기는 방안도 있다. 미국 정부는 이날 브라질에 관세 10%를 적용했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미 수출 물량을 한국이나 브라질 등 비교적 관세가 낮은 나라로 돌릴 수도 있을 것"이라며 "미국에 700조 투자를 발표한 애플이 아이폰 관세와 관련해 요구를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 한국산만 (관세를) 맞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관세는 미국 내 스마트폰 생산기지를 구축하라는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규희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지난 11일 낸 보고서에서 "트럼프 1기 당시 애플에 대한 관세가 면제된 점, 트럼프 정부 정책 기조가 자국 기업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애플에 대한 관세 부과 영향이 낮아질 수도 있다"며 "향후 미국 기업에 수혜적인 관세 정책이 시행될 경우 한국 기업의 생산지 이전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탁기·냉장고·TV 등 K가전은 관세 영향권 밖
가전 분야는 관세 폭탄의 직접적 영향권 밖에 있다. 삼성전자·LG전자가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세탁기 등에 대해 긴급수입 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했을 당시 미국 내에 생산기지를 구축해서다.
삼성전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 LG전자는 테네시에 둥지를 틀었다. 특히 LG전자는 2022년 9월 테네시 공장에 건조기 생산라인을 신설했고 2023년 상반기엔 세탁건조 일체형 라인도 추가했다.
북미향 냉장고·TV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멕시코 생산기지에서 물량을 대고 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에서도 일부 북미향 TV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멕시코 비중이 대다수라는 설명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멕시코 티후아나 공장, 케레타 공장에서 각각 TV와 냉장고·세탁기 등을 생산한다. LG전자는 멕시코 레이노사에서 TV를, 몬테레이에서 냉장고·오븐을, 라모스에서 전장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멕시코는 캐나다와 함께 이번 상호 관세 발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장은 영향권 밖에 있게 됐다.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는 앞서 "멕시코에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면 마지막 방안으로 미국 테네시 공장에서 냉장고, 오븐 등을 다 생산할 수 있도록 부지를 다 준비햇다"며 "부지 정비 작업이나 가건물을 올리는 작업은 이미 진행하고 있고 (상호 관세 등의 정책이) 발효되면 지체없이 바로 나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LG전자는 "생산지별 제조원가 경쟁력을 고려해 스윙 생산체제 기반의 최적의 생산지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그간 행보를 고려할 때 관세 적용 폭부터 정책 기조 등은 언제든 변경 가능한 상황인 만큼 불확실성을 완전히 털어내진 못한 처지다.
이 책임연구원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미국의 프리미엄 가전 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지위 하락은 한국 가전기업의 사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트럼프 1기 세탁기 세이프가드의 사례와 같이 정책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고 생산지 이전 이후 중장기적으로 시장 지위가 제고된다면 부정적 영향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우리 기업들 입장에선 생산물량 등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등의 대응이 시급하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로) 대미 수출기업의 원가 부담이 가중되겠으나 국가별 관세율이 다르게 책정되는 만큼 생산지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관세 부과가 장기화되면 미국 내 판매되는 제품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로 인한 최종적인 영향은 미 소비자들이 입게 될 것"이라고 봤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11 hours ago
3
11 hours ago
3

![닌텐도 스위치·아이폰 값까지 불안불안…'트럼플레이션'이 밉다 [임현우의 경제VOCA]](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01.40059369.1.jpg)





![[뉴스추적] '관세 폭탄' 트럼프 속내는…한국도 비상](https://img.vod.mbn.co.kr/vod2/906/2025/04/05/20250405200829_20_906_1385187_1080_7_s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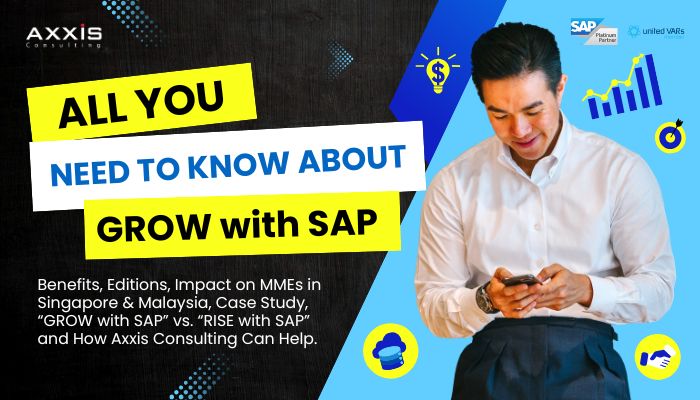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