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신조는 함북 청진에서 태어나 18세에 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9세에 북한 민족보위성 정찰국 산하 124부대 공작원이 됐습니다. 1968년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대원 31명과 함께 얼어붙은 임진강을 건너 남한으로 침투했습니다. 청와대 500m 앞까지 잠입했던 이들은 경찰 불심검문에 걸립니다. 총격전과 대대적인 수색 작전 끝에 이들 대부분이 사살되거나 자결했으며, 김신조만 생포됩니다. 당시 우리 측은 현장에 출동한 최규식 종로경찰서장 등 군경 23명과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생포 직후 김신조는 “박정희 목을 따러 왔다”고 자백해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귀순을 선택했고 정보 제공 등으로 군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덕분에 2년 뒤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김신조는 한국에 정착해 살면서 신학대에 입학했고, 1997년에는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생전 그는 여러 언론과 방송에 나와 ‘1·21 사태’ 당시의 실상을 증언해 ‘살아 있는 역사’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1·21 사태는 한국 사회의 안보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향토예비군이 생겼고 육군3사관학교, 전투경찰대, 684부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고등학교와 대학에는 교련 교육이 생겼습니다. 공비들의 침투 경로였던 인왕산과 북악산, 청와대 앞길의 일반인 통행이 한동안 금지되었습니다.서울 도시계획과 주거 형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부는 ‘유사시 지하공간을 방공호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1970년대 들어 건축법을 개정해 건물 지하공간을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반지하 주택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됩니다.
서울의 높은 집값 속에서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반지하는 점차 저소득층의 주거 대안이 되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 급등기였던 1980, 90년대를 거치며 도시 저소득층에게 반지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김신조는 9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시작된 반지하 건물은 단순한 건축 구조가 아닌 현대사의 상처이자 아이러니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이의진 도선고 교사 roserain9999@hanmail.net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1 day ago
4
1 day ago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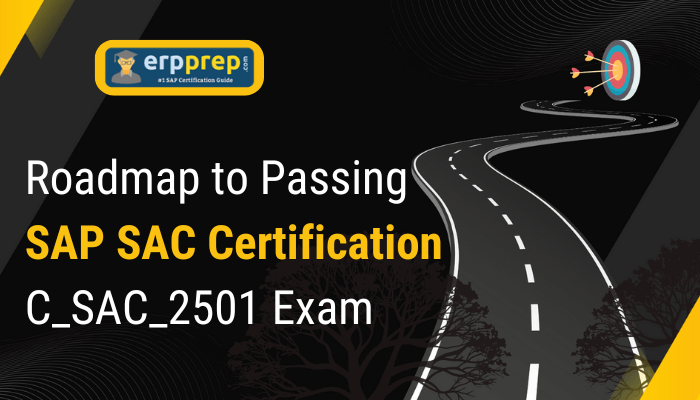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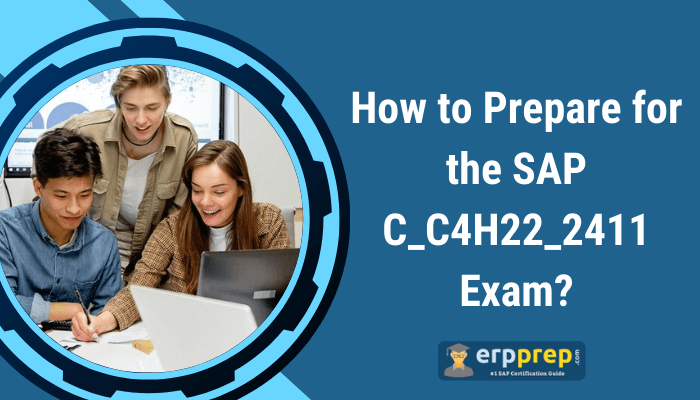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