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계약·미분양 물량 발생을 대비해 아파트 1순위 청약 전 신청받는 ‘무순위 사전접수’가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비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미계약 우려가 덜한 데다 잔여 물량이 생겨도 사후 무순위로 진행하면 되기 때문이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무순위 사전접수는 청약홈이 개설된 2020년 2월부터 지금까지 4건 이뤄졌다. 최근 2년간 진행된 건 없었다.
무순위 청약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했으나 부적격, 계약 포기 등의 이유로 잔여 물량이 발생한 경우 진행하는 제도다. 최초 공급 때 모집한 가구 수보다 청약자 수가 많았던 단지가 대상이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만 19세 이상인 국내 거주자면 누구나 접수할 수 있어 관심도가 높은 편이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재당첨 제한도 받지 않는다.
과거에는 미계약 물량이 나오면 사업 주체가 견본주택에서 선착순 분양하는 등 임의로 공급했다.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등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정부가 2019년부터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을 하도록 바꾼 이유다. 사전, 사후, 임의공급,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으로 나눠 청약자를 모집했다.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아파트투유’에서 진행하다 2020년부터는 부동산원 청약홈이 운영 중이다.
무순위 사전접수는 2019년 2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발표한 단지부터 적용됐다. 당시에는 미계약 리스크를 덜 수 있다는 이유에서 건설사가 선호했다. 서울에서는 동대문구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이 처음 사전접수를 받았다. 1만4376명이 몰리는 등 인기가 많았다. 서초구 ‘방배그랑자이’와 성북구 ‘롯데캐슬 클라시아’도 사전접수를 받았다.
이후 청약제도 개편으로 예비당첨자 비율이 늘고, 규제가 강화돼 일반공급 후 발생하는 잔여 물량이 적어졌다. 건설사에서도 사전접수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졌다. 무순위 사후접수 제도가 있는 가운데 사전접수까지 진행하면 사업 기간과 사업비만 추가로 들기 때문이다. 사전접수의 실효성이 적어진 셈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당시에는 청약제도가 자주 바뀌면서 부적격 당첨자가 많이 생기다 보니 사전 접수를 받기도 했다”며 “지금은 사실상 없어진 제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제도가 남아 있어 청약홈 홈페이지에 따로 게시판을 마련해두고 있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

 2 days ago
4
2 days ago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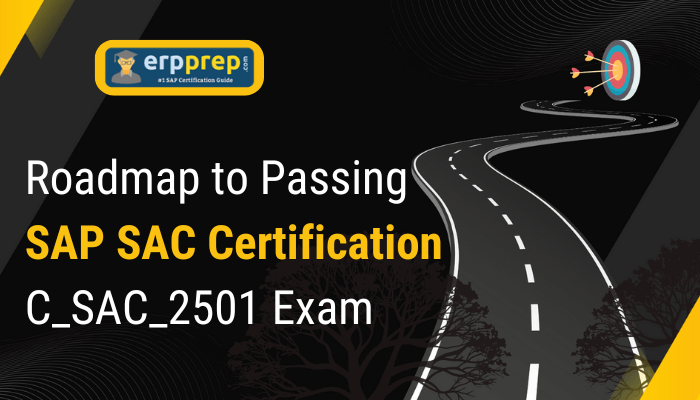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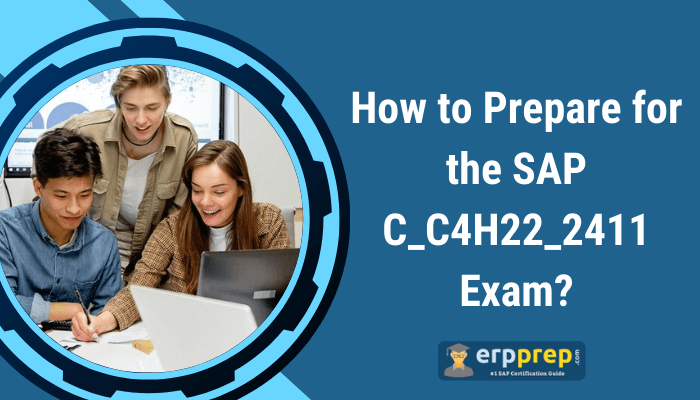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