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식 신작소설 ‘길 너머의 세계’
100만원 중고차서 지내던 주인공
희망 잃고 만난 사람끼리 마음 열어

수목장 업체에서 일하는 세 인물의 이야기를 다룬 장편소설 ‘길 너머의 세계’(은행나무)를 펴낸 소설가 전민식(59·사진)은 22일 전화 인터뷰에서 “한 번이라도 죽음을 생각해 본 적 있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썼다”고 말했다.
작가는 2018년 경기 안산시 대부도의 한 수목장 업체에서 8개월간 일했다. 수목장 업체를 운영하는 지인 제안으로 인근에 머물며 일하고 소설 쓰기를 병행했다. 어떤 날은 찾아오는 이가 한 명도 없고 많아야 서너 팀이 방문하는 외진 곳이었다. 장례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젊은이들조차 분말이 된 유골을 맨손으로 만져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손사래를 치고 떠났다. 그는 이곳에서 일하면서 100명의 유골을 수습했다. 그는 “나라고 죽음을 바라보는 방식이 특별한 건 아닌데 특별히 죽음을 삶과 분리해서 바라보지 않아서 일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작가에게 골분은 단순한 물질 이상이었다. 만질 때면 사람의 숨결이 느껴졌다고 했다. 그는 그가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을 믿는다고 했다. “70kg 몸을 화장했다면 그 몸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물질로 변환이 됐다고 보는 거죠. 연기든 뭐든. 우주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섭리 같아요. 화장한 나머지 것들이 어딘가로 흩어지거나 전달됐을 거라고 봐요.”작가의 실제 경험은 소설 속 디테일로 살아났다. 30분에 걸친 수목장 절차를 상세히 묘사한다. 지름 30cm가량의 잔디를 떼어내고 땅속으로 한쪽 팔길이까지 파 내려간 다음 벽을 다듬는다. 원기둥의 꼴이 갖추어지면 한지를 넣어 흙과 벽을 가린다. 그 안에 유골을 붓고 모래와 섞는다. 유골을 모래와 섞는 건 뼛가루가 돌덩이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온전히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뜻이다.
소설 속 너머 수목장에서는 바다가 내려다보인다. “파도를 건너온 노을이 반송에 매달린 명패들을 흔들었다” “잡다한 세상을 깨끗하게 지워버린 끝모를 바다” 등에서처럼 산다는 것의 막막함과 유한한 존재로서 느끼는 서글픔, 무한한 자연이라는 테마는 소설 속에서 다양하게 변주된다.
“장례식장에 가면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어딘가에 무엇으로든 존재할 거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때 보자’는 생각. 울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웃으면서 보내야 한다는 생각요. 이 생각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7 hours ago
2
7 hours ago
2
![데이식스, 고척돔도 작다..'K팝 밴드 최초' 행보는 현재진행형 [종합]](https://thumb.mtstarnews.com/21/2024/12/2024122309080334711_1.jpg/dims/optimize/)
![박하선, 지하철 불법 촬영 피해 고백 "범인 가고 주저앉아" [히든아이]](https://thumb.mtstarnews.com/21/2024/12/2024122308552141412_1.jpg/dims/optimize/)
![손연재, ‘아들맘’ 안 믿기는 수영복 자태…군살 하나 없네 [DA★]](https://dimg.donga.com/wps/SPORTS/IMAGE/2024/12/23/130702470.3.jpg)
![나나, 빨간 조명 아래서 퇴폐미 폭발…치명적 미모 [DA★]](https://dimg.donga.com/wps/SPORTS/IMAGE/2024/12/23/130702528.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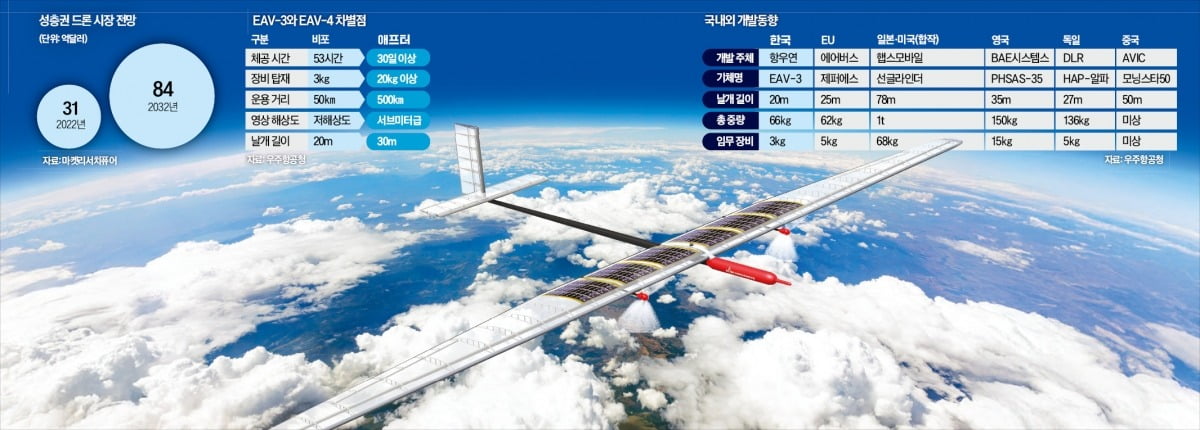
![트레저 내년 플랜 나왔다..양현석 "YG 새 데뷔 아이돌도 공개"[공식]](https://thumb.mtstarnews.com/21/2024/12/2024120209091479625_1.jpg/dims/optimize/)




![‘10안타 9득점’ 타선 응집력 앞세운 일본, ‘미리보는 결승전’서 대만 제압…국제대회 27연승 질주! [프리미어12]](https://pimg.mk.co.kr/news/cms/202411/23/news-p.v1.20241123.412a03f6ae18450291150c4e6a78d0d6_R.jp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