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의 선고 전만 해도 탄핵 찬반 시위대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선고일까지 서울 도심 광장은 격렬한 탄핵 찬반 집회로 몸살을 앓았다. 헌재 선고 직전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는 ‘선고 결과가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고 답한 응답자가 44%나 됐다.
우려했던 불상사가 없었던 데는 헌재가 8명의 재판관 전원 일치로 설득력 있는 선고문을 내놓은 공이 크다. 경찰도 올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교훈 삼아 경력을 총동원해 헌재 주변을 ‘진공상태’로 만드는 등 치밀한 경비 작전을 펼쳤다.
하지만 성숙한 시민 의식이 없었다면 헌재의 공들인 선고문도, 경찰의 철통같은 경비도 무용지물이 됐을 것이다. 극렬히 대치하던 광장의 시민들은 파면 결정이 나오자 “헌재 결과에 승복한다”며 평화롭게 해산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이고 법치주의”라고 했다. 민주화 이후 38년간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거치며 승복의 문화를 체화해 온 덕분일 것이다.계엄 선포 후 국회로 들이닥친 군경을 맨몸으로 막으며 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할 시간을 벌어준 것도 시민들이었다. 국회 앞 축제 같았던 탄핵 촉구 집회는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 설득해 대통령을 탄핵 심판대에 세웠다. 극단적 세력이 부정선거를 비롯해 온갖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일부 정치인이 이에 올라타 선동했지만 지혜로운 시민들은 의연하게 헌법 질서를 파괴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일상을 되찾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파면 선고까지 123일은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성과 회복력을 동시에 보여준 시간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 단계 더 높아진 민도(民度)를 외면하는 정치는 파면당한 대통령이 그러했듯 똑같이 실패하고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2 days ago
4
2 days ago
4


![관세, 죽은 대통령의 죽은 아이디어[광화문]](http://thumb.mt.co.kr/21/2025/04/2025040416210143379_1.jpg)
![[투데이 窓]AI 대전환의 시작은 AI 융합인재로부터](http://thumb.mt.co.kr/21/2025/04/2025040821352080501_1.jpg)
![[투데이 窓]지브리 유행, 완성도보단 문화심리 봐야](http://thumb.mt.co.kr/21/2025/04/2025040715151239959_1.jpg)
![[MT시평]정치양극화 막을 개헌 필요하다](http://thumb.mt.co.kr/21/2025/04/2025040615384099196_1.jpg)
![[사설]韓,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 의문인데 ‘안가 회동’ 尹 측근을](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4/08/131375927.1.jpg)
![[박중현 칼럼]트럼프 관세전쟁, ‘너무 달린’ 민주당 정책 유턴할 기회](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4/08/131375879.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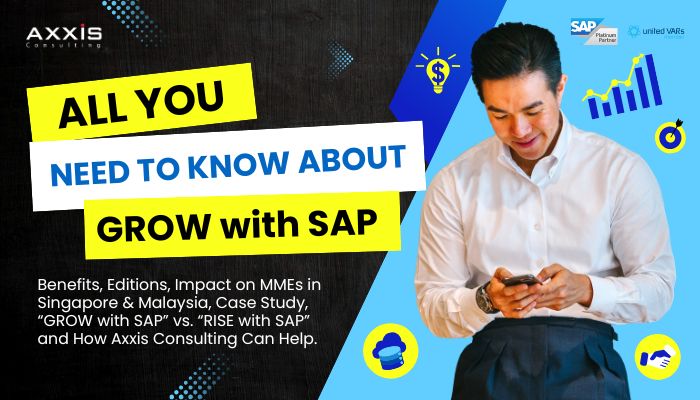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