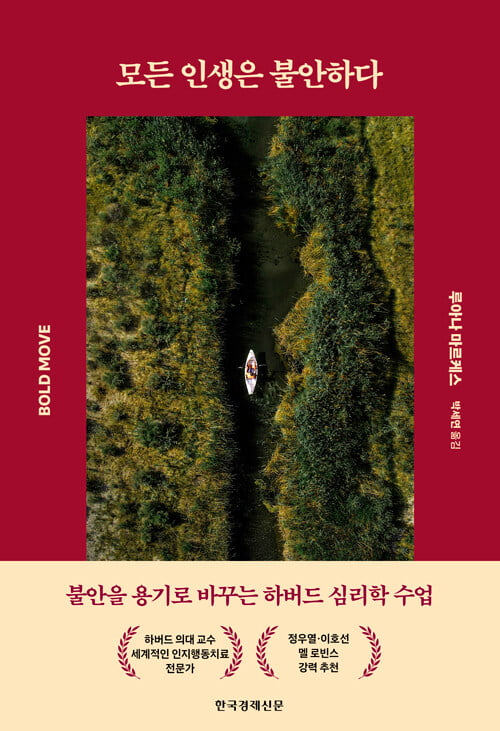
‘불안’이라는 내면의 괴물은 삶에서 떼레야 뗄 수 없는 존재다. 고등학생 때는 수능을 망칠 것 같아서, 대학생이 돼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취업에 성공하고 나서도 결혼과 육아 문제로 마음 한편이 항상 무겁다. 껍데기만 바뀔 뿐 언제나 같은 자리에 똬리를 틀고 있는 게 우리 안의 불안이다.
하버드 의대 정신의학과 교수인 루아나 마르케스는 저서 <모든 인생은 불안하다>에서 ‘인생의 동반자’ 불안을 삶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브라질에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저자는 수없는 심적 고난을 이겨내고 하버드대 교수가 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며 그 자체로 강한 설득력을 더한다. 그는 “사람들은 불편한 감정만 사라지면 삶이 즉각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진정한 문제는 불편한 감정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감정에 대응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한다.
저자는 불안을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받아들이라고 조언한다. 불안은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감정이 아닐뿐더러, 오히려 뇌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가령 불안한 마음은 수험생이 한 시간이라도 책상에 더 앉아 공부할 수 있게 하는 자극제가 된다. 불안보다 더 큰 문제는 회피다. 불편한 감정을 밀어내기 위해 공부와 거리를 두는 식으로 상황을 회피한다면 결과는 더 안 좋아진다. 저자는 “회피할 때마다 기분은 좀 나아지지만, 더 나은 ‘기분’과 더 나은 ‘상태’는 결코 같은 것이 아니다”라며 “회피는 우리의 적이 돼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삶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한다.
불안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부터 바꿔야 한다. 저자는 이를 ‘전환’ 전략이라고 부른다. 친한 친구에게 조언해주듯 스스로 다정한 이야기를 건네라는 것이다. 예컨대 급여 인상을 요청할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자책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럴 땐 같은 고민을 가진 친구에게 말하는 것처럼, “넌 업무 할당량을 모두 채웠기 때문에 급여 인상을 요청할 자격이 있다”며 자신에게 관대해질 수 있다. 이 같은 전환적 사고를 위해선 ‘OO이라면 어떻게 말했을까?’라는 식으로 상황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저자는 조언한다.
불안을 느낄 때 작은 행동 하나로 자신을 통제하는 것도 방법이다. 예를 들어, 연인과의 관계에서 불안을 느껴 상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면 연락에 매달리는 대신 헬스장에 가는 등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 이는 연인에게 문자폭탄을 보내는 등 충동적인 감정에 따르기보다, 반대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접근’ 기술이다. “이 기술에 익숙해지면 힘들거나 짜증나는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을 멈출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마지막은 자신의 핵심 가치와 삶의 방향성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정렬’이다. 직장에서의 성공과 가족에 대한 헌신처럼 충돌하는 가치 사이에서 불안은 자라난다. 이러한 양자택일 상황에서 우리는 문제를 회피하는 대신 우선순위로 꼽는 가치를 기준으로 삶을 정립해야 한다. 가치 기반의 삶은 당장은 힘들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선 더 충만하고 용감한 삶을 만든다. 물론 삶의 가치는 언제든 변할 수 있다.
불안을 껴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용기를 주는 책이다. 저자가 제시한 세 가지 기술 중 하나만 제대로 익혀도 어제보다 단단해진 자신을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허세민 기자

 1 day ago
2
1 day ago
2



!["요리에 항상 쓰는데"…충격적인 연구 결과 나왔다 [건강!톡]](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01.40212052.1.jpg)


!['무조건 튀어야 산다'…오랜만에 성수동서 대박 터진 곳 [영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01.40206425.1.jpg)
!["죽어도 좋아, 난 꼭 유명해질 거야"…26살에 요절한 천재 소녀 [성수영의 그때 그 사람들]](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01.40210897.1.jp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