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Hermes), 루이비통(Louis Vuitton), 샤넬(Chanel) 등 이른바 ‘에루샤’ 3사는 같은 해 한국 시장에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해당 브랜드들은 2023년 대비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줄지 않았으며 일부 제품은 오히려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판매가 증가했다.
에르메스코리아의 2024년 매출은 9643억 원으로 전년 7970억 원 대비 21%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667억 원으로 2023년 2358억 원보다 13.1% 늘었다. 루이비통코리아는 1조7484억 원의 매출과 3891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각각 5.9%, 35.7% 증가한 수치다.
샤넬코리아는 매출 1조8446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1조7038억 원 대비 8.3%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2695억 원으로 2,871억 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에루샤 3사의 총매출은 4조5573억 원, 총영업이익은 9253억 원에 달한다.이들 브랜드는 2023년과 2024년 사이 2~3차례 이상의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특히 샤넬은 클래식백의 가격을 1만5000만 원대까지 올렸으며, 한정판 품귀 현상까지 더해지며 구매 경쟁이 과열됐다. 그럼에도 구매 행렬은 이어졌다. 업계는 이를 ‘베블렌 효과’의 대표 사례로 본다. 가격이 오를수록 수요도 함께 증가하는 역설적 소비 심리가 명품 시장에서 반복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의 배경에는 ‘샤테크(샤넬+재테크)’라는 유행어로 상징되는 명품 자산화 경향이 있다. 샤넬, 에르메스 등 일부 브랜드의 인기 제품은 실구매가보다 높은 리셀 가격을 형성하고 있으며 일부 한정판 제품은 구매 직후 1.5배 이상 가격이 오르기도 한다.
중고 명품 거래 플랫폼 크림, 트렌비, 리본즈, 번개장터 등에서도 샤넬·루이비통·에르메스 제품이 정가 이상으로 거래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명품이 더 이상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실물 투자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에루샤 브랜드 3사는 모두 본사에 막대한 배당금을 지급했다. 루이비통코리아는 프랑스 본사에 2170억 원, 에르메스코리아는 1950억 원, 샤넬코리아는 1300억 원을 배당했다. 반면, 이들이 국내에서 집행한 사회공헌 예산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샤넬코리아는 19억 원(배당 대비 1.46%), 에르메스코리아는 5억5000만 원(0.28%), 루이비통코리아는 4억500만 원(0.18%)을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했다.전문가들은 이러한 소비 구조가 명품에 대한 자산화 인식, 리셀 플랫폼의 성장, 고물가 환경에서의 자산 방어 수요 등이 결합된 결과라고 진단한다. 한국소비문화학회 관계자는 “명품은 이제 단순한 사치품이 아니라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에루샤를 중심으로 한 초고가 브랜드의 실적 호조와 달리, 중위권 명품 브랜드는 실적 부진을 겪고 있다. 2024년 펜디코리아와 페라가모코리아의 한국 매출은 각각 전년 대비 21.9%, 12.7% 감소했다. 이는 명품 시장 내에서도 상층 브랜드로의 소비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2024년 한국 사회는 실질임금 감소, 생계비 증가, 자영업 붕괴 등의 총체적 어려움 속에서도 명품 소비가 급등한 이중적인 소비 양상을 보였다. 명품의 자산화, 리셀 시장 활성화, 사회적 과시 소비 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앞으로도 유사한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와 산업계는 이러한 소비 양극화가 실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정책적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황소영 동아닷컴 기자 fangso@donga.com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1 day ago
1
1 day ago
1

![뉴욕증시, 약보합 숨고르기…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모닝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01.12608176.1.jpg)




!["소주성 2탄 나올까"…盧·文이 아낀 경제학자들 '기지개'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AA.17970492.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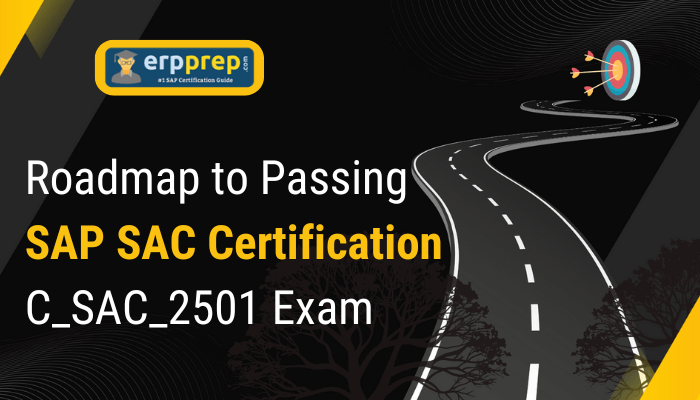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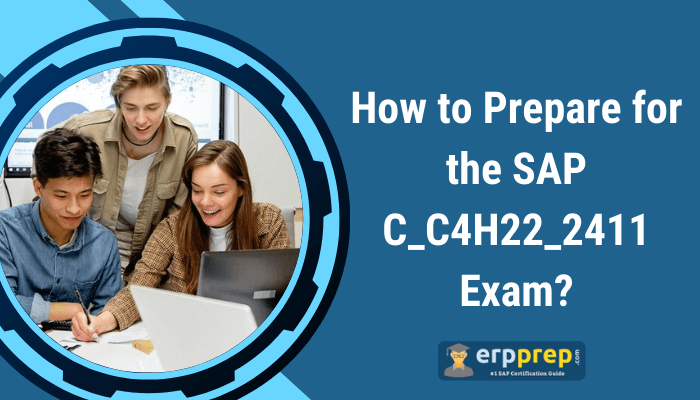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