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의 아픔에 너무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 곧 이겨낼 것이기 때문이다. 자칫 우리 모두 우울증에 걸릴 판이다. 잘 안다.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궁극으로 구원하는 것은 문학과 예술이다. 문화가 내재한 힘만이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표도르 도스토옙스키가 한 말이다.
부서진 일상을 일으켜 세우는 '렛 미 인'

오는 15일 재개봉하는 스웨덴 출신 토마스 알프레드슨 감독의 걸작 ‘렛 미 인’은 2008년 개봉한 영화다. 17년 전이다. 한국에선 서울 저동의 중앙시네마에서 상영됐다. 당시 중앙시네마는 폐관(2010년) 직전이어서 낡고 냄새까지 나는 데다 등받이도 낮았다. 옛날식 극장이지만 좋은 영화라면 마다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찾는 그런 극장이었다.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앞에 앉은 남자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단순히 우는 것이 아니라 뒤에 앉은 내가 알 수 있을 만큼 몸을 흔들며 울기 시작했다. 남자는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 옆에 앉은 여자가 영화에서처럼 알고 보면 드라큘라여서일까. ‘렛 미 인’은 슬픈 뱀파이어(카레 헤레브란트·사진)의 이야기다. 죽지 않는 여자, 어린 모습 그대로의 드라큘라 여자아이를 평생 사랑하며 그녀를 위해 살인도 마다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피가 필요하니까) 남자(들) 얘기다. 사랑은 공포이며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얘기를 품고 있다. 영화 ‘렛 미 인’은 무서운 영화가 아니다. 잔인한 영화도 아니다. 오히려 세상사의 고통과 고뇌를 잊게 해준다. 힐링이라는 건 한참을 울고 난 후의 카타르시스 같은 것이다.
죽음과 사랑은 동의어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

이 작품은 샌드라 불럭이 나온 영화(무려 스티븐 달드리가 감독을 한)보다 조너선 사프란 포어가 쓴 소설이 훨씬 눈물이 난다. 9·11 참사 희생자들의 마음은 그 누구도 짐작할 수 없을 만큼 갈가리 찢겨 있어서 일상의 표정은 오히려 담담하고 평온하곤 했다. 그러나 그 내면의 폭풍은 거의 퍼펙트 스톰 급이어서 자칫 조금만 건드려도 물풍선의 물만큼 눈물이 터져 나온다. 엄마 린다는 남편이 떠난 뒤 아무런 의욕도, 더 이상의 분노와 슬픔도 느끼지 않으며 살고자 한다. 하지만 아들 오스카(토마스 혼·사진)의 이런저런 이상한 행동에 정신을 차린다. 그녀는 다시 살아내고자 한다. 그건 표면적으로 아들을 위해서지만 종국적으로는 죽은 남편과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 결심 아닌 결심은 내면적으론 ‘엄청나게 시끄러운’ 의지다. 죽은 남편은 아들인 오스카만큼 ‘믿을 수 없게’ 가까운 곳에 늘 있는 것이다. 죽음과 사랑은 이음동의어다. 소설은 2006년 쓰였고 영화는 2011년 개봉했다. 소설은 시기가 적당했지만 영화는 너무 빨랐다. 대규모 참사가 영화로 만들어지는 건 20년쯤은 지나야 좋다. 그 정도 돼야 거리를 두고 바라 볼 수 있다.
우리 안에 신이 있다면 '오토라는 남자'

고약한 성격의 오토는 동네 사람들을 상대로 독설을 일삼는다. 그가 그러는 데는 스스로가 잘 안 죽어져서다. 그는 아내 소냐가 사망한 뒤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하지만 줄이 끊어진다든지, 기차역에선 누가 뒤에서 잡아당긴다든지 죽는 게 영 쉽지 않다. 그런 오토에게 말콤이라는 배달부는 눈엣가시다. 오토는 항상 그에게 소리를 지르지만, 청년 말콤은 노인 오토에게 늘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군다. 말콤은 어느 날 한결같이 ‘지랄을 떠는’ 오토에게 말한다. “소냐 선생님 때문에 선생님도 알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아이들 앞에서 저의 여자 이름을 불러 주신 분이죠. 저도 선생님만큼 그분을 잊지 못해요.” 말콤은 트랜스젠더 성향의 게이다. 학교에서 늘 놀림과 따돌림의 대상이다. 오토의 아내 소냐는 따뜻한 선생님이자 인간의 평등한 가치를 잘 알고 실천한 여성이었다. 오토는 말콤을 통해 죽은 아내가 부활한 듯한 느낌을 받는다. 사람들에겐 저마다 예수의 모습이 담겨 있으며 예수의 의지가 구현되고 있는 것이다. 영화 ‘오토라는 남자’는 2022년 개봉했다. 원작 소설보다 영화가 더 눈물 나게 한다. 톰 행크스(사진)의 연기 덕이다.
헤밍웨이가 마주한 죽음 '킬리만자로의 눈'

고즈넉한 일상을 회복하고 싶다면 어니스트 헤밍웨이(사진)가 1936년에 썼지만 1961년 단편집으로 출간된 소설 <킬리만자로의 눈>을 읽는 것만 한 일도 없다. 물론 이 작품도 영화로 만들어졌다. 헨리 킹이라는 전설의 감독이 그레고리 펙과 에바 가드너, 수전 헤이워드 등 당대 톱스타만 데리고 찍었다. 1952년 영화다. 이 작품은 영화보다는 소설이 낫다. 죽어가는 한 남자의 그 가능한 한 ‘평평해지고 펑퍼짐해지려는 마음’이 보다 더 잘 읽히기 때문이다. 주인공 해리는 아프리카에서 사파리 사냥 중 다리를 다쳐 사경을 헤맨다. 그의 눈앞에 킬리만자로의 봉우리가 들어온다. 그는 줄곧 환영을 본다. 사랑했지만 죽은 연인 신시아(에바 가드너 분)가 찾아온다. 해리는 신시아가 죽었다는 걸 기억한다. 그러나 그의 마음엔 여전히 신시아가 담겨 있다. 죽어가는 남자는 늘 그렇듯 반성과 회한이라는 성찰의 태도를 보인다. 소설 <킬리만자로의 눈>은 새삼스레 우리 주변의 많은 죽음을 생각하게 한다. 지금처럼 죽음이 많은 시대라면 죽음을 좀 더 정면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킬리만자로의 눈>은 그런 면에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설이다.
오동진 영화평론가·아르떼 칼럼니스트

 3 weeks ago
9
3 weeks ago
9
![이병헌, '오징어게임2' 유명세..사칭 계정 등장 "피해 주의 " [공식]](https://thumb.mtstarnews.com/21/2025/01/2025012420543126548_1.jpg/dims/optimize/)


![‘더 딴따라’ TOP 5, ‘JYP 자회사’ 이닛엔터와 전속계약 [공식]](https://dimg.donga.com/wps/SPORTS/IMAGE/2025/01/24/130931481.1.jpg)

![여농 1-2위 맞대결 승자는 우리은행! BNK와 공동 선두 등극, 캡틴 김단비+신인 이민지 동반 활약 [부산 현장리뷰]](https://thumb.mtstarnews.com/21/2025/01/2025012417012070062_1.jpg/dims/optimize/)
!['尹 지지' 김흥국 또 사고쳤다, 무면허 운전 '벌금형'..과거엔 뺑소니→음주운전 [종합]](https://thumb.mtstarnews.com/21/2025/01/2025012420334568924_1.jpg/dims/optimize/)
![박보영, 파격적인 탈색 헤어 눈길…‘뽀블리’의 변신 [DA★]](https://dimg.donga.com/wps/SPORTS/IMAGE/2025/01/24/130931241.1.jpg)
![1월 둘째 주, 마켓PRO 핫종목·주요 이슈 5분 완벽정리 [위클리 리뷰]](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99.34900612.1.jpg)
!["이러다, 다 죽어!"…'오징어게임2' 망하면 큰일 난다는데 [김소연의 엔터비즈]](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9034730.1.jpg)
!["나랑 XX 할래"…돌봄 로봇과 성적 대화 하는 노인들 [유지희의 ITMI]](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164747.1.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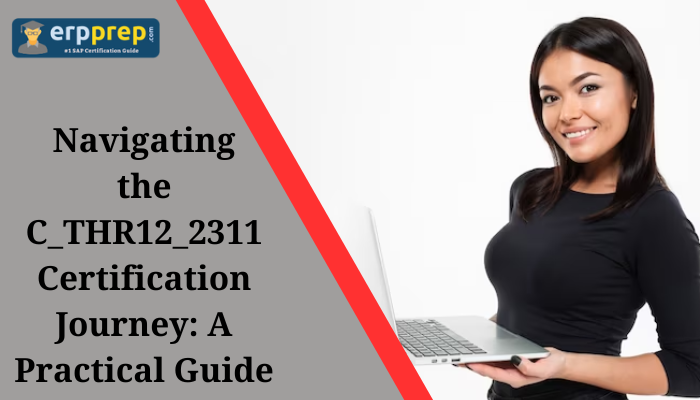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