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속 공간 역시 눈부시다. 마사의 뉴욕 아파트 벽면에는 아트 피스가 총 세 점 걸려 있는데 하나는 젊은 시절 본인을 그린 듯한 자화상이고, 중앙에 걸린 작품은 스페인 사진작가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로데로의 작품이다. 검은색 옷과 신발, 베일로 온몸을 감싼 이들이 서로 팔짱을 낀 채 연대하고 있는 모습. 스페인에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검은색으로 고인의 죽음을 추모하는 게 문화다. 마지막 그림은 글자 그 자체로 미술이 되는 ‘텍스트 아트’로 액자 안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 ‘나는 지옥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말하자면 그곳은 황홀했습니다(I HAVE BEEN TO HELL AND BACK. AND LET ME TELL YOU, IT WAS WONDERFUL).’ 삶과 죽음, 생의 고통과 환멸을 다룬 현대미술의 아이콘 루이즈 부르주아가 1996년 손수건에 자수 새긴 것과 같은 문구다.
영화의 주제와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는 이 미장센들을 보면서 스페인의 국보급 영화감독인 페드로 알모도바르의 재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이 작품으로 작년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최고 작품상인 황금사자상을 받았다. 생의 순간순간을 극도로 화사한 컬러로 채색함으로써 죽음의 절망을 극대화하고, 삶이 돌연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워지는 죽음의 모순 겸 미학을 설득력 있게 묘사한 것이 수상 배경이었다. 알모도바르 감독은 “세상과 깨끗하고 품위 있게 작별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라고 믿는다. 이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라고 밝혔다.이 영화를 보고 난 후 ‘우리네 삶은 평생 내 자리, 내 공간을 찾는 여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 방, 내 차, 내 집을 거쳐 마지막에는 내가 묻힐 그 자리까지. 영화 속 마사는 주삿바늘과 호스를 치렁치렁 매단 채 죽음을 맞는 병실 대신, 숲이 울창하고 새가 노래하고 수영장 물이 반짝이는 뉴욕 외곽의 그림 같은 별장을 생의 마지막 공간으로 택한다. 죽음에도 돈이 든다는 것이 씁쓸했지만 그 선택만큼은 깊이 수긍했다.
세월은 흐르고 시대정신은 계속해서 바뀐다. 스위스에서 조력 사망을 허용한 때가 이미 1942년이다. 어떻게 살지만큼이나 어디에서, 어떻게 생을 마감할지가 개개인이 풀어야 할 마지막 숙제로 다가올 날이 머지않은 것 같다. 바라건대 최종의 그 자리에 많은 선택지가 있기를, 우리 모두가 말년의 인생에 평안히 가 닿기를.
정성갑 갤러리 클립 대표·‘건축가가 지은 집’ 저자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1 day ago
3
1 day ago
3
![[단독]민간인 노상원 지시에…'고무탄·가스총 무장' 선관위 서버반출조 대기](https://thumb.mt.co.kr/21/2025/01/2025011811210226673_1.jpg)
![[부음]나형근(한경협국제경영원 부원장)씨 부친상](https://img.etnews.com/2017/img/facebookblank.png)
![[사설]39% 대 36%… 홀로 과속하다 지지율 역전당한 野](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1/17/130886910.1.jpg)
![[횡설수설/장원재]돈 걷어 ‘간부 모시는 날’, 공직사회 아직도 이런 폐습이…](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1/17/130886903.1.jpg)
![[오늘과 내일/우경임]건보료 개편과 연금 개혁의 ‘평행 이론’](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1/17/130886897.1.png)
![[동아광장/송인호]위축된 경제 심리의 경고음이 들리는가](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1/17/130886895.1.png)
![1월 둘째 주, 마켓PRO 핫종목·주요 이슈 5분 완벽정리 [위클리 리뷰]](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99.34900612.1.jpg)
!["이러다, 다 죽어!"…'오징어게임2' 망하면 큰일 난다는데 [김소연의 엔터비즈]](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9034730.1.jpg)


!["나랑 XX 할래"…돌봄 로봇과 성적 대화 하는 노인들 [유지희의 ITMI]](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164747.1.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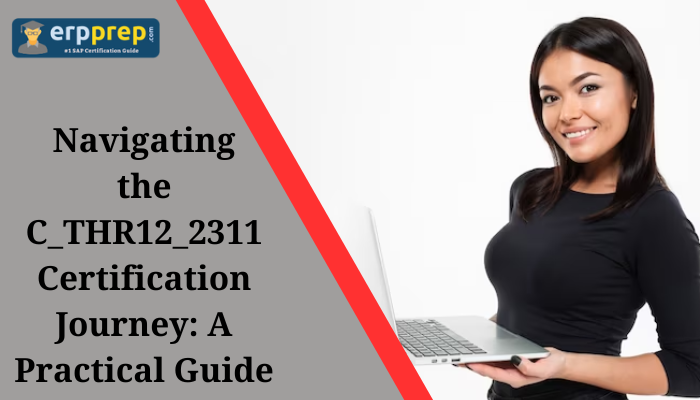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