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K바이오의 슬기로운 생존법](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7.35844552.1.jpg)
올해 늦여름에 투자 행사장에서 만난 바이오벤처 최고경영자(CEO) A대표는 머리카락이 어깨에 닿을 만큼 치렁치렁하고 수염도 깎지 않은 채였다. 록밴드 멤버 같은 그를 하마터면 몰라볼 뻔했다. 머쓱했던지 첫마디가 이랬다. “혹시나 부정 탈까봐서요.” 최근 만난 A대표의 모습은 그다지 달라진 게 없었다. “속이 숯검댕이가 됐습니다. 그래도 머잖아 좋은 소식 들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존 기로에 선 신약벤처
최근 제약·바이오업계에서 가장 핫한 분야인 비만약을 개발 중인 이 회사는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수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통상 기술이전 계약에 걸리는 기간이 1년6개월 남짓인 것을 감안해 업계에서는 올해 말께는 이 회사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것이라는 풍문이 돌았다. A대표의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계약 협상은 또 해를 넘기게 됐다. 이러는 사이 기술수출 기대감에 급등했던 주가는 고꾸라졌고, 투자자들의 항의도 빗발쳤다.
A대표뿐만이 아니다. 기술수출 계약을 염원하는 마음에 평소 다니지도 않던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심지어 점집까지 찾았다는 바이오기업 CEO가 한둘이 아니다. 과학을 한다는 이들이 오죽 답답하면 이럴까. 게다가 자금이 바닥났거나 코스닥 상장유지 조건을 맞추지 못한 기업의 CEO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연 매출 30억원 미만, 4년 연속 영업손실, 자본잠식률 50% 등에 해당하면 관리종목에 편입된다. 내년에는 바이오기업 수백 곳이 도산하고, 최소 10곳 이상이 관리종목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뒤숭숭한 세밑 풍경의 원인은 바이오 돈맥경화다. 벤처캐피털 등 투자 시장이 올스톱되면서 신약 연구개발(R&D)에 필요한 자금 조달 길이 막혀버렸다. 국가 R&D 지원마저 급감했다. 신약벤처의 코스닥 상장도 막혀 있다. 이렇다보니 기술수출로 받는 계약금이 유일한 매출원이자 자금 조달 수단이 되다시피 했다. 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세계 경기 침체로 글로벌 제약사들의 신약 후보물질 확보 경쟁이 시들해졌다. 기술수출 계약이 금방 될 듯하면서도 차일피일 미뤄지는 배경이다.
바이오업계가 기댈 곳은 이젠 거의 없다.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통령 직속 바이오위원회 출범은 물거품이 됐다. 10년 넘게 수천억, 수조원의 자금을 쏟아부어야 성공을 기약할 수 있는 신약 개발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각종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던 기대를 아예 접었다.
자력갱생이 유일한 돌파구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바이오업계에 최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꿋꿋하게 신약 개발에 올인하던 전략을 버리고 돈벌이 되는 사업을 찾느라 부산하다.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사업은 이젠 신약벤처에 기본이 됐다. 매출 30억원을 넘겨 상장유지 조건도 충족하고, 신약 개발 캐시카우도 만들어야 해서다. 자본시장에도, 정부에도 기댈 게 없는 현 상황에서 신약벤처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지금의 위기를 이런 사업구조가 한국식 신약벤처 모델로 정착되는 계기로 삼는 건 어떨까.
새해 우리 경제 전반에 경고등이 커졌다. 수년간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여온 바이오업계는 더 큰 시련에 직면할 게 분명하다. 이제는 각자도생 외에는 길이 없다

 3 weeks ago
4
3 weeks ago
4
![[단독]민간인 노상원 지시에…'고무탄·가스총 무장' 선관위 서버반출조 대기](https://thumb.mt.co.kr/21/2025/01/2025011811210226673_1.jpg)
![[부음]나형근(한경협국제경영원 부원장)씨 부친상](https://img.etnews.com/2017/img/facebookblank.png)
![[사설]39% 대 36%… 홀로 과속하다 지지율 역전당한 野](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1/17/130886910.1.jpg)
![[횡설수설/장원재]돈 걷어 ‘간부 모시는 날’, 공직사회 아직도 이런 폐습이…](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1/17/130886903.1.jpg)
![[오늘과 내일/우경임]건보료 개편과 연금 개혁의 ‘평행 이론’](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1/17/130886897.1.png)
![[동아광장/송인호]위축된 경제 심리의 경고음이 들리는가](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1/17/130886895.1.png)
![1월 둘째 주, 마켓PRO 핫종목·주요 이슈 5분 완벽정리 [위클리 리뷰]](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99.34900612.1.jpg)
!["이러다, 다 죽어!"…'오징어게임2' 망하면 큰일 난다는데 [김소연의 엔터비즈]](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9034730.1.jpg)


!["나랑 XX 할래"…돌봄 로봇과 성적 대화 하는 노인들 [유지희의 ITMI]](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164747.1.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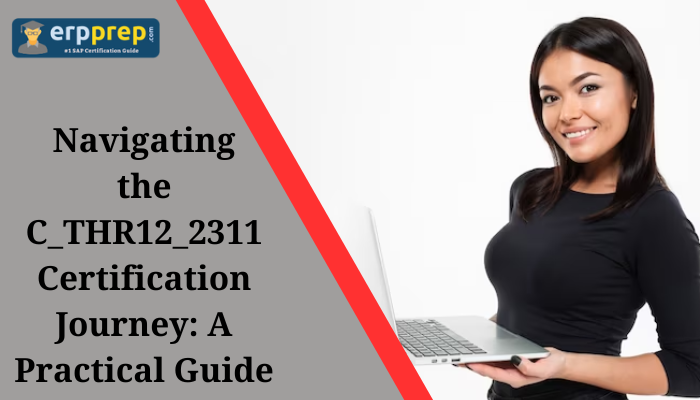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