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격차인 예대금리차가 역대급으로 커지고 있다. 요지부동인 대출금리에 비해 예금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지면서다. 벌어진 예대금리차로 은행들이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이자이익을 거두는 것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1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월 5대 시중은행 예대금리차는 1.47%포인트로 집계됐다. 불과 6개월 새 0.44%포인트 뛰어 2023년 5월 이후 근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은행마다 사상 최대 예대금리차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하나은행은 2월 예대금리차(1.40%포인트)가 은행연합회가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22년 이후 가장 컸다.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일부 지방은행은 예금금리와의 격차가 최대 6%포인트까지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예대금리차가 커지는 것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를 낮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금리보다 확 빠진 예금금리…금융소비자만 속탄다
예대금리차 2년 만에 최대…은행들은 '표정 관리'

‘금리 변경 안내’. 은행마다 예금금리를 끌어내리면서 각 은행 홈페이지엔 이 같은 공지글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경남 광주 부산 전북 등 4대 지방은행이 올해 들어 소비자에게 예금금리 인하를 공지한 것만 30건에 달한다. 조만간 연 1%대 상품만 즐비할 것으로 예상되자 예테크족(예금+예테족)은 속이 타고 있다. 예금금리 인하 속도를 대출금리가 따라오지 못하면서 일부 은행의 예대금리 차는 사상 최대치로 불어났다. 업계에선 은행을 등에 업은 금융지주가 일제히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돼 정치권의 상생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금리 인하기에 대출금리 되레 올라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올 들어 세 차례 금리를 조정해 정기예금(12개월 기준) 금리를 연 2.85%에서 연 2.10%로 낮췄다. 같은 기간 광주은행 예금금리는 연 3.17%에서 연 2.70%로 떨어졌다.
반면 올해 부산은행 평균 대출금리는 0.13%포인트 내려갔다. 단순 비교하면 예금금리 하락 폭이 대출금리 대비 약 5배에 달한다. 광주은행은 작년 말 대비 지난 2월 평균 대출금리가 0.01%포인트, 가계대출 금리가 0.19%포인트 올랐다. 하나은행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2월 말 이후 주택담보대출(5년 혼합) 금리 하단이 0.004%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업계에선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을 옥죄면서 이 같은 시장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실제 전북은행의 2월 예대금리 차는 역대 최고치인 6.39%포인트였다. 제주은행 역시 6개월 새 예대금리 차가 두 배 넘게 치솟으며 사상 최고 수준(2.16%포인트)으로 뛰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은행 가계대출을 월별로 관리하라고 권고하면서 대출금리를 빠르게 조정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금리 차를 인위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이상 예대금리 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 실적 잔치 상생 압박으로 이어지나
예대금리 차가 확대되면서 올해도 은행들의 ‘실적 잔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예대금리 차가 커질수록 은행 이자이익이 급증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은행 이자이익의 약 40%가 예대금리 차 영향에 기반해 발생한다.
이자이익에 힘입어 KB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는 올해 연간 순이익 17조6197억원(증권사 추정치 평균)을 거뒀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작년(16조5268억원)보다 6.6% 증가한 규모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연간 순이익 5조원 시대를 연 KB금융은 올해 순이익 5조4151억원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금융 역시 5조원에 육박(4조9324억원)하는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1분기에 주춤한 하나금융(3조9039억원), 우리금융(3조957억원)도 전년 대비 연간 이익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은행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사이 대출금리 인하가 더뎌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만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권을 향한 상생 압박이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최근 은행들이 이자 장사 논란과 내부통제 실패 등으로 사회적 반감을 사고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대선 정국이 본격화하자 은행을 향한 정치권 압박도 가시화하고 있다. 1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달 9일 은행장을 소집해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과거 민주당이 추진한 횡재세(초과 이익 환수)가 다시 검토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박재원/장현주 기자 wonderful@hankyung.com

 3 weeks ago
6
3 weeks ago
6

!["먹으면 망한다" 말렸지만…승부사의 '통 큰 베팅' 통했다 [반도체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1.40438109.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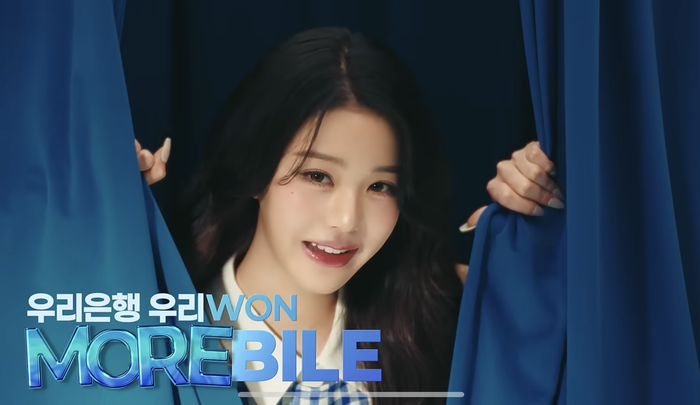

!["차에서 내리기 싫어요"…불티나더니 대표모델로 뜬 아빠車 [신차털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1.40397938.1.jpg)
![절세하려다 탈세?..이준기·이하늬 세금폭탄 맞은 이유[세상만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5/PS25051100256.jp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