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합계출산율 가임여성 감소 반영 못해
출생아수 집중된 ‘조출산율’
‘유배우 출산율’ 활용 등 거론
현재 사용되는 대표적인 출산지표는 ‘합계출산율’이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이 높아져도 실제 태어나는 신생아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착시가 발생한다.
정부 관계자는 2일 “지금 합계출산율은 줄어드는 가임 여성의 수를 감안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할 것”이라며 “합계 출산율을 보조할 수 있는 지표를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계출산율은 분모에는 15~49세 가임 여성의 수가 들어가고 분자에는 0~4세 영유가 숫자가 들어간다. 이 때문에 합계출산율이 늘어도 출생아 수는 늘지 않을 수 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를 들어 10년전 합계출산율이 1이었다고 가정하고 지금도 1이라고 가정해보면, 10년 전에는 가임기 여성이 100명이니 출생아수도 100명인데 지금은 가임기 여성이 20명밖에 안되니 합계출산율은 1로 같지만 출생아 수가 20명밖에 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계출산율은 현재 태어난 출생아수보다 ‘한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를 측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년 초에 발표할 예정인 합계출산율을 보조할 출산지표는 △‘조출산률’을 변형해 연령별로 나눠 발표하는 방안과 △유배우 출산율을 월별로 발표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조출산률은 1년 간의 총출생아수를 당해연도의 총인구로 나눠 1000분비로 나타낸 수치로 가장 단순한 출산율 지표다. 홍 교수는 “출생아 수를 연령대별 여성 수로 나눠서 보면 실제 출생아수 추이를 더 잘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배우 출산율은 현재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는 나라이기 때문에 출산율이 얼마나 결혼을 했는지, 결혼한 분들이 얼마나 아이를 낳는지 두 가지에 의해 결정된다”며 “합계 출산율에는 그 두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유배우 출산율을 따로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을 결혼, 궁극적으로는 출산까지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할지 아니면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도록 해야하는지 정책의 초점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같은 보조지표가 인구구조 변화를 출산율에 반영함으로서 출생아수 감소의 심각성을 과소평가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인구 전문가는 “유배우 출산율은 결혼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출산율을 계산하기 때문에 출산율이 올라가 보일 수 있다”며 “최근 신혼부부가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배우 출산율 역시 올라갈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성을 따지는 데 적절한 지표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떠난 스타트업 10곳 중 4곳은 '충청'으로 갔다 [고은이의 스타트업 데이터]](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9010558.1.png)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1500원 향하는 환율, 브레이크가 없다](https://image.edaily.co.kr/images/content/defaultimg.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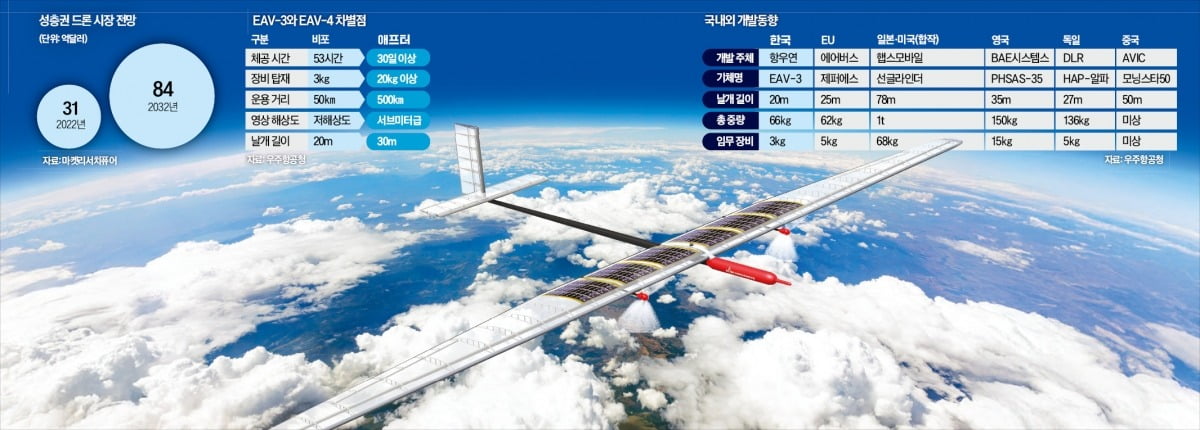
![트레저 내년 플랜 나왔다..양현석 "YG 새 데뷔 아이돌도 공개"[공식]](https://thumb.mtstarnews.com/21/2024/12/2024120209091479625_1.jpg/dims/optimize/)




![‘10안타 9득점’ 타선 응집력 앞세운 일본, ‘미리보는 결승전’서 대만 제압…국제대회 27연승 질주! [프리미어12]](https://pimg.mk.co.kr/news/cms/202411/23/news-p.v1.20241123.412a03f6ae18450291150c4e6a78d0d6_R.jp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