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는 돈(보험료)도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도 올리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한 달 하고도 열흘이 더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적지 않은 2030 청년들이 개혁안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일각에선 이들의 분노를 “왜 중장년층만 돈을 더 받아가나요”라는, 일차원적인 수준의 이기적인 외침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2030의 목소리는, 정확하게는 중장년층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그 자체에 대한 질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청년층의 목소리가 소외될 수 밖에 없는 지금의 의사결정 방식의 근본적인 한계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2064년 이후는 누가 책임지나요?"
이번 개혁안으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2056년에서 2064년으로 늦춰졌습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 이뤄졌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8년 가량 늦출 수 있었습니다.
2030 청년들의 첫번째 질문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지금 25살 청년은 40년 뒤, 즉 2065년부터 연금을 받게 됩니다. 현재의 개혁안에 따르면 이미 기금이 고갈된 뒤입니다.
다시 말해, 보험료율 추가 인상이나 근본적인 구조개혁 없이는 지금의 2030 청년들은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을 때 실제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자동조정장치 등의 도입 및 구조개혁이 필수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고령화 등 인구구조나 성장률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하며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가 있어야 고갈을 늦출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정치권 일부는 표 이탈 우려로 구조개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동조정장치의 취지를 고려하면 받는 추후 연금액이 어느정도 깎이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구조개혁의 ‘구’ 자도 꺼내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처음 개혁을 설계할 때 ‘더 내고 더 받는’ 게 아니라, ‘더 내고 내는 만큼 받는’ 안을 고려했던 겁니다. 2064년이면 내가 아무것도 받을 게 없는데 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금 내야 하냐는 청년들의 말은 일리가 있는 거에요.그래서 적립식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죠. 낸 만큼 적립했다가 나중에 돌려주자는 겁니다. DB형(확정급여형)에서 DC형(확정기여형)으로 바꾸자는 건데 이건 구조개혁이죠. 그리고 부채도 해결해야 하는데 이것도 구조개혁입니다. 지금 내는 돈 자체가 지급하는 연금에 비해 낮기 때문에,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부채는 쌓여요.
이 모든 것을 다 하자니 시간이 촉박하고 쟁점도 많으니 우선 급한 보험료율부터 올리는 데 합의한 겁니다. 그게 지난 3월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이죠.
-보건복지부 관계자
정치 구조서 청년 목소리 배제되는 한계

정치권에서도 이런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3월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 등 3040 의원들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젊은 의원들이, 그것도 초당적으로 목소리를 내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안에 대해 “나는 반대한다”고 밝히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들은 내년부터 연금소득세를 국민연금에 적립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기성세대가 연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 일부를 기금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긴 방안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금특위에서 이러한 논의들이 전면에서 다뤄지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젊은 정치인들이 부상하고 있는 시점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선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 구조에서 주목받기는 힘든 게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연금특위에서도 청년들이 연금 개혁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수개혁은 '첫 단추' 일뿐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이 일보 진전인 것은 맞습니다. 사회연대라는 기본적인 원칙 하에서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단순히 내가 미래에 받을 돈이 아니라, 2030 청년들의 부모님 세대인 6070의 노후를 지탱해 주고, 훗날 2030 청년들의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기금입니다.
현재 30대 초중반에 들어선 1991~1996년 생들은 매년 출생아가 70만 명을 웃돈 ‘제2차 에코붐 세대’로 불립니다. 그리고 지난해 연간 태어난 출생아 수는 23만명입니다.
지금은 70만명이 90만~100만을 부양하는 시대지만, 이들이 노인이 됐을 때는 20만명이 70만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올해 모수개혁을 이뤄낸 것은 일보 진전이라는 데 정부 안팎에서도 이견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연금특위에서 어떤 내용이 추가로 논의될 것이냐 하는겁니다. 청년들이 던지는 물음표를 곱씹어보면 이번 모수개혁은 국민개혁의 첫 단추일 뿐입니다.
복지부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세대별 총연금수급액’ 자료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현재 20세 가입자의 연금수급비율이 30세 이상보다 덜 깎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36년부터 자동조정장치를 적용하면 2006년생의 총수급액은 2억6787만원으로 14.9% 줄어들고 1976년생은 약 16.3% 줄어듭니다.
지난달 연금특위 전체회의는 8일, 30일 두 번 열렸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과는 별개로 연금특위가 자동조정장치 등 구조개혁을 폭넓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11 hours ago
1
11 hours ago
1
!["지금도 삼겹살 사 먹기 겁나는데"…암울한 전망 나왔다[食세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5/PS25050300518.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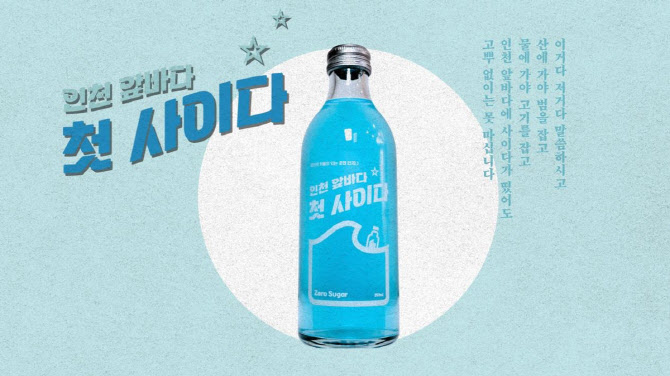

![[속보] 美, 외국산 車부품에 25% 관세 발효…韓 부품업계 타격 예상](https://pimg.mk.co.kr/news/cms/202505/03/rcv.YNA.20250429.PYH2025042911420006100_R.jp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