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6월 ‘인구 비상사태’까지 선언하며 출산율 반등에 총력을 기울여 온 정부도 반색하는 분위기다. 인구 위기를 다루는 정부 부처에선 “출산율 반등 등 역사에 남을 성과를 냈다”고 자평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노력을 폄하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아직 기뻐하기엔 이르다. 많은 전문가가 출산율 반등 배경에 인구 효과와 팬데믹 기저 효과가 있다고 분석한다. 출생아가 많았던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결혼·출산 적령기에 진입했고, 코로나19 탓에 감소했던 혼인이 늘어나면서 출산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런 효과가 사라지면 출산율은 언제든 다시 고꾸라질 수 있다. 자연 증가 효과에만 기대지 않으려면 지난 10년 가까이 이어진 ‘출산파업’ 배경을 제대로 복기해야 한다.시간을 10여 년 전으로 되돌려 보자. 합계출산율은 2016년(1.17명)부터 감소했다. 젊은 층에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크게 확산한 시기다. 당시 2030세대에선 정부에 대한 불신과 각자도생해야 한다는 불안이 팽배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는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불신을 키웠다. 한국을 지옥에 빗댄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노력해도 바뀔 게 없다는 청년층의 좌절감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자신의 신분을 금수저와 흙수저 등으로 나눈 수저 계급론으로 나타났다.
이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으로 젊은 층의 상실감은 더 커졌다. 결국 이들의 선택은 결혼 대신 비혼, 출산 대신 딩크(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를 안 갖는 가정)로 급격히 쏠렸다. 그사이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서 2019년 0.92명까지 떨어졌다. 초저출생을 고착화시킨 ‘잃어버린 5년’인 셈이다. 김영미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온 나라가 청년들에게 ‘아이 낳지 말라’는 신호를 준 것”이라며 “한국의 출산율 하락 요인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했다.
지금 청년층이 느끼는 불안과 좌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제목만 봐도 기가 질려 버리는 정치 뉴스에 가려 주목받지 못했지만, 일이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15∼29세 청년 인구는 지난달 사상 처음 50만 명을 넘었다. 지난해 사교육비는 역대 최대인 29조 원대로 치솟았다. 국민을 둘로 가르는 분열의 정치, 결혼·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경제적 사회적 지표는 청년층에 ‘아이 낳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출산율을 끌어올린 팬데믹 기저 효과는 이제 ‘끝물’이고, 인구 효과는 에코붐 세대가 평균 출산연령(33.6세)에 머무르는 향후 4∼5년이 마지막이다. 정부가 저출생 극복의 ‘골든타임’으로 보는 시기다. 정부가 자원을 쏟아붓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청년 불안을 덜어주는 것이다. 그래야 ‘잃어버린 O년’을 반복하지 않는다.박성민 정책사회부 기자 min@donga.com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2 days ago
5
2 days ago
5

![[사설]尹 탄핵 심판 4일 선고… 불확실성의 짙은 안개 걷히길](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4/01/131330575.1.jpg)
![[김승련 칼럼]‘연어 술파티’ 주장을 대하는 2가지 방식](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4/01/131330450.1.jpg)
![[횡설수설/신광영]트럼프 피해 ‘학문적 망명’ 떠나는 美 석학들](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4/01/131330445.1.jpg)
![[오늘과 내일/김재영]‘美 해방의 날’, 예언서로 본 트럼프의 속내](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4/01/131330440.1.jpg)
![[데스크가 만난 사람]“의성 산청 산불 위험도 평년의 4배… 기후변화로 한반도 전역 위험권”](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4/01/131330433.1.jpg)
![[광화문에서/이유종]사업주-청년도 만족하는 묘수의 정년연장 논의를](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4/01/131330425.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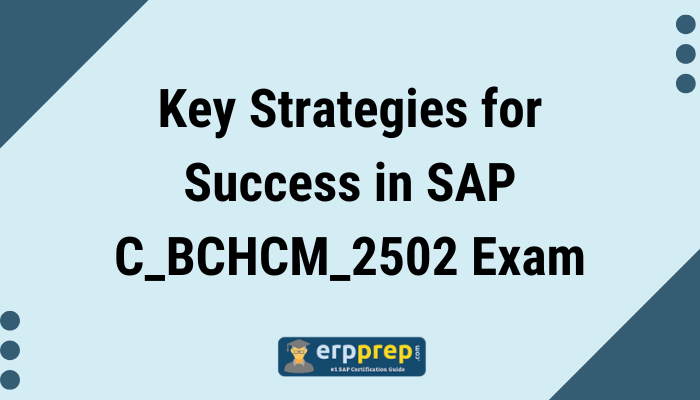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