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규의 데이터 너머] 1%대 저성장 시대, 어떻게 봐야할까](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7.32510063.1.jpg)
“어느 정도 성장률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10월 서울 한 대학교에서 강연을 하다가 학생에게 한국의 저성장을 우려하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이같이 되물었다. 질문한 학생은 “연 6% 성장률이 적당한 것 같다”고 답했다. 한국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뒤 저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수출 중심의 과거 고성장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국민이 있던 것이다. 이 총재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면서도 “현재 잠재성장률은 2% 정도”라며 눈높이를 낮췄다.
한 나라는 보통 급격한 성장의 시대를 거쳐 선진국이 된다. 그 이후로는 대체로 안정적이지만 낮은 수준의 성장을 한다. 한국은 1970년대 이후 10% 안팎의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기록했으나 국내총생산(GDP)이 1조3000억달러를 넘어선 2010년대 초반부터 3%대 밑으로 내려갔다.
한국이 6% 넘게 성장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기저효과가 있던 2010년(7.0%)을 제외하면 2002년(7.7%)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6%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베트남 필리핀 코트디부아르 탄자니아 등 개발도상국이다.
1.9% 성장률의 의미
![[강진규의 데이터 너머] 1%대 저성장 시대, 어떻게 봐야할까](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AA.39198235.1.jpg)
한국은 올해 1%대 성장률을 피하기 어렵다. 한은이 지난해 11월 말 1.9%, 정부는 이달 초 1.8%를 전망했다. 이 같은 수준의 저성장까지 받아들여야 할까.
당국자들은 그렇다고 본다. 이 총재는 최근 1.9% 성장률을 언급하며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 이상인 26개국의 성장률 전망치 평균인 1.8%를 웃돈다”고 했다. 그러면서 “(1.9% 성장률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상황으로 보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IMF의 지난해 10월 경제전망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선진국은 1%대 이하 성장률이 예상된다. 독일(0.8%)과 이탈리아(0.8%)는 0%대가 우려된다. 한국은 뉴질랜드(1.9%)와 함께 13위로 딱 중간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변수
하지만 이 같은 숫자에는 아직 고려되지 않은 불확실성이 있다. 탄핵 정국과 이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은 성장률을 추가로 끌어내릴 요인으로 지목된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은 이를 반영해 잇달아 전망을 낮추고 있다. JP모간은 최근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1.3%로 내렸다. 모건스탠리와 씨티, 캐피털이코노믹스 등은 1.5%를 전망했다. 한경 이코노미스트 클럽 전문가 20명이 제시한 평균 성장률은 1.65% 수준이다.
IB 전망치 중 최저 수준인 1.3% 성장이 현실화하면 26개국 평균보다 높다던 한국 성장률은 평균(1.8%)을 크게 밑돌게 된다. 순위도 13위에서 19위로 내려가 하위권으로 추락한다. ‘위기’라는 판단이 더 이상 과장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1%대 성장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해도 그것이 1%대 초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성장률 전망치가 잠재성장률에 크게 못 미치는 1%대 초반으로 내려가면 경제는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경제 주체의 심리를 회복하는 일도 더 어려워진다. 정부가 단기적 부양책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한은이 이례적인 3연속 금리 인하 카드까지 배제하지 않고 고민해야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중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이 절실하다. 한은에 따르면 2024~2026년 2.0%로 추정된 잠재성장률은 2025~2029년 1.8%로 떨어지고 2040년께 0%대에 진입한다. 1%대 후반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조차 도전적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노동시장, 교육, 산업 재편 등과 관련해 분야를 넘나들며 개혁을 외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여기에 있다.

 3 days ago
4
3 days ago
4
![[단독]민간인 노상원 지시에…'고무탄·가스총 무장' 선관위 서버반출조 대기](https://thumb.mt.co.kr/21/2025/01/2025011811210226673_1.jpg)
![[부음]나형근(한경협국제경영원 부원장)씨 부친상](https://img.etnews.com/2017/img/facebookblank.png)
![[사설]39% 대 36%… 홀로 과속하다 지지율 역전당한 野](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1/17/130886910.1.jpg)
![[횡설수설/장원재]돈 걷어 ‘간부 모시는 날’, 공직사회 아직도 이런 폐습이…](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1/17/130886903.1.jpg)
![[오늘과 내일/우경임]건보료 개편과 연금 개혁의 ‘평행 이론’](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1/17/130886897.1.png)
![[동아광장/송인호]위축된 경제 심리의 경고음이 들리는가](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1/17/130886895.1.png)
![1월 둘째 주, 마켓PRO 핫종목·주요 이슈 5분 완벽정리 [위클리 리뷰]](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99.34900612.1.jpg)
!["이러다, 다 죽어!"…'오징어게임2' 망하면 큰일 난다는데 [김소연의 엔터비즈]](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9034730.1.jpg)


!["나랑 XX 할래"…돌봄 로봇과 성적 대화 하는 노인들 [유지희의 ITMI]](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164747.1.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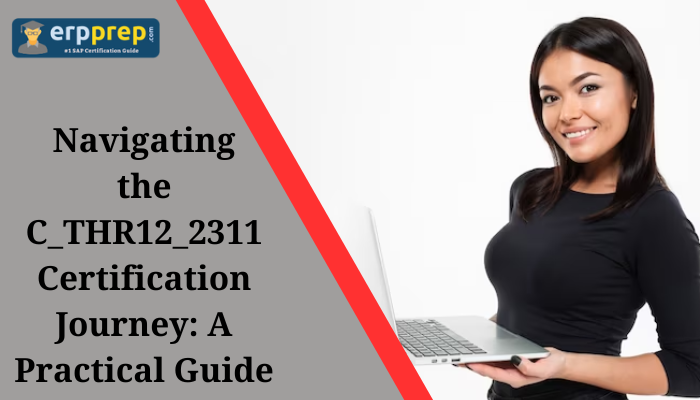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