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 톡톡] 미쉐린 빕구르망 식당의 '이용자 경험'](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7.32614778.1.jpg)
“이 음식에는 ‘킥’(강력한 한 방)이 없네요.” “오늘의 메뉴는 무엇인가요?”
넷플릭스의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흑백요리사’를 보지 않으면 대화에 참여할 수 없었다. 직장 동료들은 점심시간에 심사위원이 됐다. 무심코 지나쳤을 반찬 하나에도 심사평을 남겼다. 프로그램 참가 셰프가 운영하는 식당은 몇 분 만에 한 달 치 예약이 마감됐다.
파급 효과는 음식 맛에 대한 표현이나 기법에서 기인하지 않았다. 서사가 주요한 역할을 했다. 참가자 에드워드 리 셰프는 밥에 속재료를 넣고 비벼 주먹밥처럼 뭉치고 참치로 감싸 비빔밥을 만들었다. 숟가락으로 비비지 않고 칼로 썰어 먹는 방식에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담았다. ‘급식대가’라는 별명으로 출연한 이미영 조리사는 하루 120인분 식사를 준비하며 터득한 빠른 칼질과 함께 심사위원 안성재 셰프에게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맛”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얼마 전 부산에 2박3일 출장을 다녀왔다. 흑백요리사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부산에 있는 ‘미쉐린 빕 구르망’ 식당들에 방문했다. 미쉐린 가이드는 타이어 제조사 미쉐린이 발간한 식당 가이드북이다. 미쉐린 가이드에서는 평가 방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식당의 편안함, 분위기, 서비스, 식기는 별점(스타)의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음식의 본질인 맛 그 자체만을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빕 구르망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훌륭한 맛을 내는 식당에 부여하는 미쉐린 등급의 일종이다. 빕 구르망을 받은 식당들은 고가의 파인다이닝 레스토랑과는 달리 소위 가격 대비 맛이 훌륭한 곳으로 꼽힌다. 대부분 식당 규모가 주방을 가까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작다.
빕 구르망 식당에는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고객경험’과 ‘팀워크’가 있다. 고객경험은 손님의 입장에서 시작한다. 주방과 홀에서는 업무를 하는 동시에 고객과 소통한다. 주방과 홀의 소통은 짧다.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홀에서 전달하면 주방에서 복창한다. 크로스 체크를 진행하는 셈이다. 주문한 요리가 손님 앞으로 나가는 것에서 소통이 끝나지 않는다. 홀에서는 반찬이나 음식 상태를 수시로 점검한다. 계산할 때마다 고객에게 맛이 어땠는지 반드시 묻는다. 편리한 사용성으로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이용자 경험(UX)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제품을 개발하고 출시하는 과정과 다를 바 없었다.
“한국 음식에서 된장, 김치, 젓갈은 빠진 적이 없잖아요. 기본 양념입니다. 장아찌는 기다림, 그리움의 맛입니다.” ‘방랑 식객’으로 알려진 자연요리연구가 임지호 셰프는 “음식은 한 편의 드라마”라고 말했다. “모든 식재료는 자기만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어요. 요리사는 테이블 위에 음식이 아니라 이야기를 늘어놓는 존재입니다.”
음식을 비롯한 모든 창작물의 본질에는 개인과 조직의 고유한 가치관이 반영돼 있다. 엇비슷한 결과물도 이야기를 구현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빛을 발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20 hours ago
2
20 hours ago
2
![[단독]민간인 노상원 지시에…'고무탄·가스총 무장' 선관위 서버반출조 대기](https://thumb.mt.co.kr/21/2025/01/2025011811210226673_1.jpg)
![[부음]나형근(한경협국제경영원 부원장)씨 부친상](https://img.etnews.com/2017/img/facebookblank.png)
![[사설]39% 대 36%… 홀로 과속하다 지지율 역전당한 野](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1/17/130886910.1.jpg)
![[횡설수설/장원재]돈 걷어 ‘간부 모시는 날’, 공직사회 아직도 이런 폐습이…](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1/17/130886903.1.jpg)
![[오늘과 내일/우경임]건보료 개편과 연금 개혁의 ‘평행 이론’](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1/17/130886897.1.png)
![[동아광장/송인호]위축된 경제 심리의 경고음이 들리는가](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1/17/130886895.1.png)
![1월 둘째 주, 마켓PRO 핫종목·주요 이슈 5분 완벽정리 [위클리 리뷰]](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99.34900612.1.jpg)
!["이러다, 다 죽어!"…'오징어게임2' 망하면 큰일 난다는데 [김소연의 엔터비즈]](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9034730.1.jpg)


!["나랑 XX 할래"…돌봄 로봇과 성적 대화 하는 노인들 [유지희의 ITMI]](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164747.1.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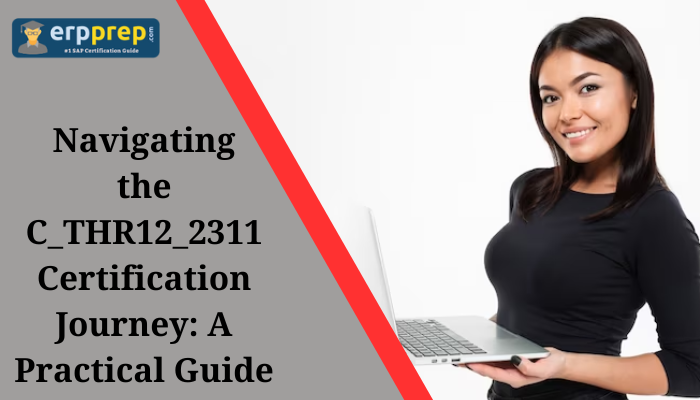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