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라 휴즈·오스틴 에디 展
용산 P21서 5월 17일까지

나무 그림이지만 나무를 그린 게 아니다. 캔버스에 그려진 한 그루의 나무는, 나무가 아니라 작가 자신의 내면이다. 따지고 보면 회화란 건 대상 그 자체의 사실적 묘사보다는 그 작가의 심리를 말해주는 대체 사물인 경우가 많다. 그건 모든 예술에도 자주 적용되는 명제다.
스위스 대표 갤러리 에바 프레젠후버가 서울 용산구 P21갤러리에서 협업 전시 중인 미국 작가 샤라 휴즈의 작품들은 저 명제를 거듭 확인시켜 준다. 최근 전시장에서 샤라 휴즈의 작품을 살펴봤다.
'Just Peachy'는 언뜻 봐선 그저 한 그루의 복숭아나무일 뿐이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강렬한 원색들로 그려진 나무의 형태가 불분명하다. 과일인지 가지인지, 꽃잎인지 풀인지 알 수가 없다. 나무 주변의 풍경도 노을인지 박명(薄明)인지, 현실인지 꿈인지 온통 모호하다.

샤라 휴즈의 모든 작품이 이처럼 '의도된 모호성'에 기댄다. 환희와 절망, 밝음과 어둠, 삶과 죽음이 명징하지 않은 것처럼.
전시장에서 만난 샤라 휴즈는 "난 주로 풍경을 다룬다. 그러나 인물을 대체하는 요소로 꽃이나 나무에 집중한다"며 "세상에서 우리가 맺는 관계와 경험, 사적인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관계 맺는 방식을 탐구한다"고 설명했다.
샤라 휴즈는 지난 10년간 관심이 폭증한 미국 여성 화가로, 미술비평가 로버타 스미스의 극찬을 받으며 중요한 작가로 떠올랐다.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루이비통재단미술관 등이 샤라 휴즈의 작품을 소장 중이다.
이번 전시에는 샤라 휴즈의 남편인 화가 오스틴 에디의 작품도 함께 전시됐다.
샤라 휴즈가 식물이 배치된 풍경 안팎에서 사유와 성찰을 이어간다면, 오스틴 에디는 과일이 놓인 정물을 통해 인간 내면을 들여다보려 한다.
오스틴 에디의 작품 'Vulnerable(취약한)'은 반으로 자른 사과를 옆으로 눕힌 그림이다. 반으로 잘린 사과는 산화돼 곧 갈변되기 마련이고, 그것의 중심부인 씨앗이 함부로 노출돼 있다는 점에서 위기의 한 징후처럼 보인다.
역시 전시장에서 만난 오스틴 에디는 "나는 나의 취약성을 관람객에게 보여주지만, 그 취약성은 사과로 변하는 순간 사라진다. 이 사과는 곧 나"라고 말했다. 전시는 5월 17일까지. 무료.
[ 김유태 기자]





!['천국보다' 이정은, 지옥에 떨어졌다..한지민 정체는?[★밤TView]](https://thumb.mtstarnews.com/21/2025/04/2025042721501915670_1.jpg/dims/optimize/)

![허영만 "딸 안 낳냐" 난감 질문..이현우 "'딸 원한다' 얘기하면 두 子에 예의 아니라 생각"(백반기행)[★밤TView]](https://thumb.mtstarnews.com/21/2025/04/2025042722401078330_1.jpg/dims/optimize/)
!['천국보다' 김혜자, 한지민 정체 의심.."이정은 떠올라"[별별TV]](https://thumb.mtstarnews.com/21/2025/04/2025042721500735753_1.jpg/dims/optimiz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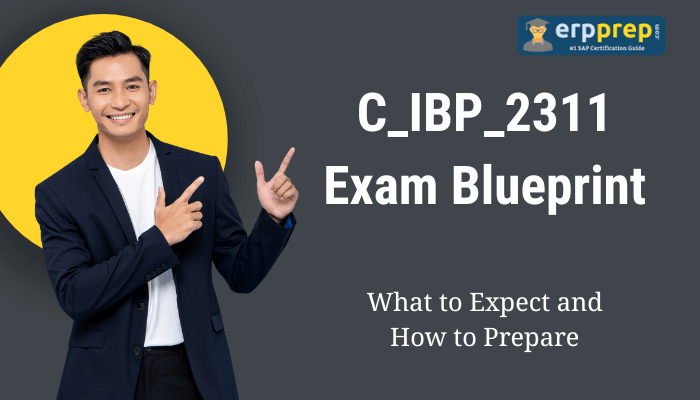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