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한주형 기자]](https://pimg.mk.co.kr/news/cms/202507/04/news-p.v1.20250702.4253dce4acea4b6a93c295ad591c0bc4_P2.jpg)
“자괴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지방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A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가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경험을 했다. 평생을 바친 회사를 살려보려는 절박한 심정으로 법원을 찾았지만 판사에게서 돌아온 건 냉소 섞인 반응이었다. 판사는 첫 만남부터 “굳이 회생을 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이 정도면 파산이 맞지 않느냐”며 면전에서 회생 의지를 깎아내리는 발언을 이어갔다.
이후로도 회생 절차는 난관의 연속이었다. 채권자 목록 검토나 회생계획안 심리 등을 이유로 매번 대면을 요구했고,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공개 면박을 주기도 했다. 회생계획안에 기재된 매출 예상치에 대해 “근거가 뭐냐”는 질문을 받아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추정한 수치”라고 설명하자 재판부는 보고서를 작성한 조사위원을 법원으로 불러 질책하기도 했다. 사건을 대리한 변호인은 “재판부 앞에 설 때마다 벌 받는 기분이었다”고 털어놨다. 알고 보니 해당 재판부는 ‘걸리면 복불복’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법조계에선 이미 악명 높던 곳이었다.
예측 가능성은 회생 절차의 생명과도 같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실무 준칙이 일정 수준 이상 정립돼 있어 비교적 예측할 수 있는 절차 운영이 가능하지만 지방 법원은 재판부별 실무 편차가 크다. 이 때문에 같은 사안임에도 결과가 엇갈리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예컨대 불가피한 이유로 물품 대금 등 회생채권에 대해 조기 변제를 신청하면 어떤 법정은 이를 신속히 허가하는 반면, 다른 법정은 결정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일선에서 ‘복불복’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면 이는 단순한 불만 수준을 넘어 제도의 신뢰 자체를 흔드는 문제다.
출발점은 인식의 변화다. 기업을 경영하며 생존을 고민해본 사람이라면 숫자 너머에 있는 직원들의 생계, 거래처와의 신뢰, 재기 가능성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 책상 위에서 법률 논리만을 고수하는 태도로는 그 현실의 무게를 제대로 가늠하기 어렵다. 낙담한 기업인들이 고개를 들고 법정을 나설 수 있을 때 회생제도는 비로소 재도약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속보] 김건희 특검팀,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 소환조사](https://img.hankyung.com/photo/202507/02.41007456.1.jpg)
![[포토] 무더위엔 계곡이 최고!](https://img.hankyung.com/photo/202507/01.41023843.1.jpg)
![[속보] 특검 "尹 외환 혐의 관련 군 관계자 상당수 조사"](https://img.hankyung.com/photo/202507/02.22579247.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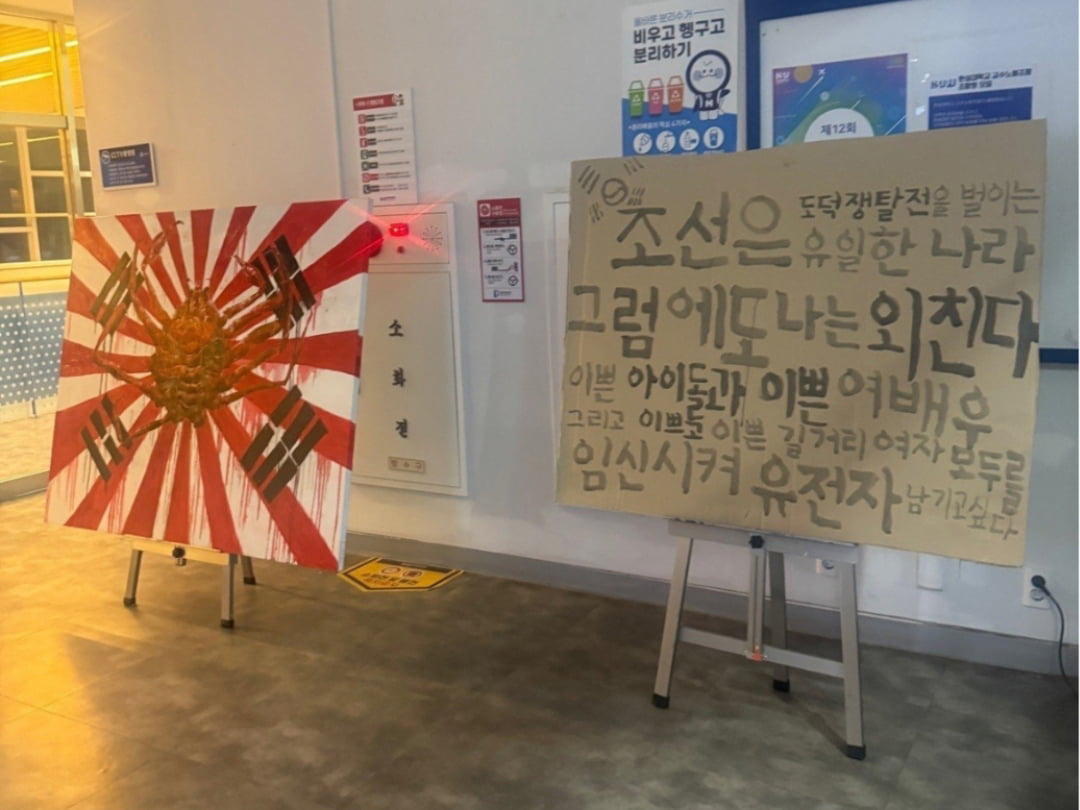
![[속보] SKT, 1조원대 ‘고객 보상·정보보호책’ 마련…위약금 면제 수용](https://amuse.peoplentools.com/site/assets/img/broken.gif)
![[속보] 특검 “尹변호인 수사방해 의혹, 파견경찰관 3명이 자료수집 중”](https://pimg.mk.co.kr/news/cms/202507/04/news-p.v1.20250704.8dc373c33dc24623996444334d2d55b2_R.jpg)






![[속보]李대통령, G7 참석차 내일 출국…“주요국 정상과 양자회담 조율”](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6/15/131807427.2.jp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