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창 '사물의 초상' 展
조선 백자에 비누·콘크리트 등
잊히고 낡은 사물들 포착해
10m 전시장 층고 압도적 활용
내년 3월 30일까지 광주ACC

그는 사진으로 시를 쓴다. 시는 '걸어가다'란 뜻의 행(行)과 '이어지다'란 뜻의 연(聯)으로 구성되는데, 이번 전시는 각 작품이 하나의 행, 각 연작 시리즈가 하나의 연을 이룸으로써 전체적으로 '걸어가며 읽는 한 편의 시'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다 보고 나면 한 편의 압도적인 시를 읽은 듯 뭔가가 명치에 얹히고야 만다.
"한국 사진계의 국면(局面)을 바꿔버렸다"고 극찬받는 사진 거장 구본창(71·사진)의 사진전 '사물의 초상'이 광주 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구 작가의 '사물 연작' 여러 편을 한자리에서 조감하는 귀한 전시다. 개막일인 22일 전시장에 오래 머무르며 거장의 시선과 시선 사이를 걸어봤다.
관객이 조우하는 첫 작품은 구 작가 일생의 대표작으로 평가받는 '백자' 연작이다. 때는 2004년. 구 작가는 도쿄, 교토, 오사카, 뉴욕, 런던, 파리 등 이국땅의 박물관을 떠돌았다. 아시아와 유럽에 각각의 이유로 흩어진 조선 백자를 카메라에 담기 위한 발걸음이었다. 구 작가가 포착한 피사체인 백자는 각자가 세상의 끄트머리로 흩어져버린 것들인데 구 작가는 잊히는 중인 것들, 부서지는 중인 것들, 무소용해지는 것들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구 작가가 그때 찍은 백자 사진들이 이번엔 층고 10m(아파트 3~4층)에 달하는 전시장 천장에 무려 5.5m짜리 거대한 흰 천으로 프린팅돼 내걸려 압도적인 느낌을 준다.
작품 아래서 고개를 들어 백자를 들여다보면, 그것에 내재된 초월적인 감정은 '그림자의 부재'로부터 온다. 사진 어느 한 점에도 음영(陰影)이 없어서다. 구 작가는 피사체를 밝게 촬영해 모국으로 반가이 소환시킨 것만 같다.

'콘크리트 광화문' 연작도 구 작가의 세계관과 맞닿는다. 2006년 경복궁 복원 사업에 따라 철거된 광화문의 부재(部材)를 2010년 촬영한 사진들이다. 광화문은 목재로 건립됐다가 한국전쟁 때 폭격으로 불태워졌다. 전후(戰後) 1960년대에 복원됐으나 실상은 '단청을 바른 콘크리트 구조물'이었다.
구 작가는 화려한 단청 이면의, 회백색 콘크리트 구조물의 절단면을 찍어 관객 눈앞에 전시한다. 밥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대의 경직된 물성(콘크리트)과 그것이 절단된 형태(토막된 단면)란 점이 시각적 충격을 안긴다.
세월의 흔적을 뒤따르는 구 작가의 긴 여정은 중세 유럽 건물 앞에 놓인 철제 구조말 '샤스루'와도 연계된다. 샤스루(chasse-roue)란 '15세기 이후 마차 바퀴로부터 건물 모퉁이 또는 문을 보호하려 설치했던 작고 무거운 철기둥'을 뜻한다. 2003년 프랑스 파리에 머무르던 시절, 구 작가는 유럽의 샤스루를 찾아다녔다.
사진 속 샤스루를 자세히 보면 겉면이 상처투성이다. 차이고 부딪치면서도 그 자리에서 묵묵히 시간을 견딘 샤스루의 외면은, 말수 없는 노파의 깊이 파인 얼굴 주름살을 응시하듯 처연해진다.
또 다른 대표작 '비누' 연작도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다.
더는 사용하기 어려워 버려야 할 낡은 비누를 찍은 작품이다. 쓰임을 다해 폐기(죽음)를 앞둔 사물들이다. 비누의 쓸모란, 자신을 소멸시킴으로써 존재의 이유를 다할 때 가능해진다. 구 작가는 버려져야 할 비누를 촬영함으로써 생명력을 부여한다. 그래서인지 구 작가의 '비누' 연작은 다 쓴 조각비누를 "아름다운 소모(消耗)"라 은유했던 시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정진규의 '비누').
소설가 한강의 사진도 이번 전시장에 함께 전시돼 눈길을 끈다. 한강 작가의 나이 만 32세였던 2003년 구 작가가 찍은 사진으로 배우 안성기, 강수연, 윤정희, 최민식, 이정재, 문근영의 사진과 함께 걸렸다. 전시장 마지막 공간엔 구 작가가 수십 년간 촬영했던 피사체 사물 원본들이 선반에 가지런히 놓여 '육신과 영혼' 등을 고민하게 한다. 전시는 내년 3월 30일까지. 무료.
[김유태 기자]


![소녀시대 태연, 명품 두건 두르고 매력 발산..일상이 화보[스타IN★]](https://thumb.mtstarnews.com/21/2024/12/2024122300363012553_1.jpg/dims/optimize/)

![임지연, 죄인 김동균 변호 "시父 성동일 약속 지키고자"[옥씨부인전][★밤TView]](https://thumb.mtstarnews.com/21/2024/12/2024122223115764041_1.jpg/dims/optimize/)
![추영우, ♥임지연에 조언 "법을 무기로 휘두르지 않길"[옥씨부인전][별별TV]](https://thumb.mtstarnews.com/21/2024/12/2024122222594566560_1.jpg/dims/optimize/)

![정지영, 12년 만에 라디오 하차[연예뉴스 HOT]](https://dimg.donga.com/wps/SPORTS/IMAGE/2024/12/22/130699859.1.jpg)
![영화 ‘소방관’ 우여곡절 끝에 손익분기점 돌파[연예뉴스 HOT]](https://dimg.donga.com/wps/SPORTS/IMAGE/2024/12/22/130699856.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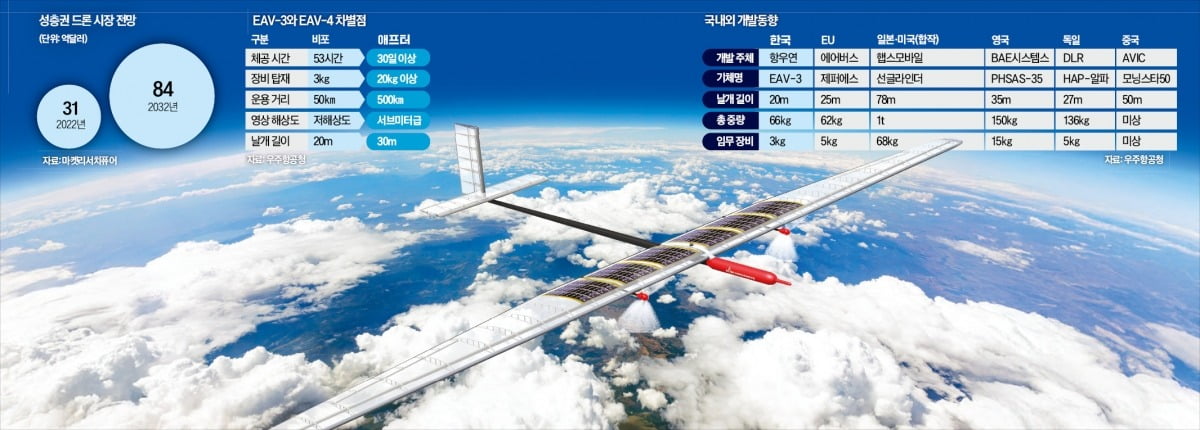
![트레저 내년 플랜 나왔다..양현석 "YG 새 데뷔 아이돌도 공개"[공식]](https://thumb.mtstarnews.com/21/2024/12/2024120209091479625_1.jpg/dims/optimize/)




![‘10안타 9득점’ 타선 응집력 앞세운 일본, ‘미리보는 결승전’서 대만 제압…국제대회 27연승 질주! [프리미어12]](https://pimg.mk.co.kr/news/cms/202411/23/news-p.v1.20241123.412a03f6ae18450291150c4e6a78d0d6_R.jp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