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건축 거장 김중업-김종성 작품
80년대 지어졌다 폐관-철거 운명… 고도성장 겪은 도시 현실 보여줘
공공-역사성 지난 건물 사라지면, ‘삶의 총체’인 도시 기억 잃는 것
기억과 재생산 통해 가치 이어야

최근 제17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에서 11년간 폐관됐던 전북 군산시민문화회관의 리모델링과 새 운영방식의 실험 과정을 담은 정동구 감독의 다큐 영화 ‘움직이는 회관’이 상영됐다. 며칠 후 서울 남산의 전시문화공간 ‘피크닉(piknic)’에서 한국 모더니즘 건축을 대표하는 ‘밀레니엄힐튼서울’(힐튼호텔)의 생애를 다루는 ‘힐튼서울 자서전’이 열려 현재 전시 중이다.》


두 건물의 두 번째 공통점은 1980년대에 지어졌고, 두 건물 모두 폐관됐다는 것이다. 군산시민문화회관의 경우 군산의 인구가 줄고 새 문화회관이 지어지면서 누적된 적자로 운영이 중지됐다. 힐튼호텔은 부동산 개발 목적으로 올해부터 철거돼 해당 부지에는 오피스, 호텔, 상업시설 등 대규모 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1970, 80년대 한국 고도 성장기에 수많은 건물이 지어졌다. 그 후 반세기 동안 사회가 급격히 바뀌면서 물리적 수명을 다하거나 경제적 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건물이 속출했다. 그 결과 곳곳에서 건물이 철거되거나 새로 지어지는 모습을 목격한다. 건축은 시대와 함께하기에 당연한 얘기다. 하지만 공공성과 역사성을 지닌 건물들 역시 사회적 변화에 휘말려서 그 가치를 함께 음미하는 충분한 과정 없이 사라지고 있다.
도시와 건축, 기억이라는 주제로 유명한 이탈리아 건축가 알도 로시는 1990년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받았다. 로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도시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남아있는 것들, 그리고 도시에 대한 사람들의 집단 기억 등을 주제로 다양한 작품을 남겼다. 특히 1979년 물 위에 뜬 건축 ‘테아트로 델 몬도(Teatro Del Mondo·세계의 극장)’는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베니스(베네치아)라고 하면 떠오르는 기억을 바탕으로 고딕 양식의 외관에 베니스의 특성이 드러나도록 배 위에 극장을 지었다. 놀라운 사실은 그해 베니스 비엔날레가 끝날 때 극장은 예인선으로 옮겨진 뒤 해체됐다는 것이다. 배 위에 있는 건축물은 세계 어느 곳으로도 갈 수 있지만, 만약 다른 장소로 옮겨져 전시된다면 그것은 베니스만의 기억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사실 이 극장 작업의 핵심은 건물 자체가 아니라, 사라져서 그곳의 기억으로 존재하는 건축이었다. 스스로 해체된 극장은 사라졌지만, 역설적으로 극장의 ‘부재(不在)’는 베니스의 영원한 기억이 됐다.역사는 역설적으로 사라진 후 부재한 자리를 메운다. 그것에 담긴 의미도 시대에 맞게 사실을 기반으로 재편된다. 박물관 역시 과거의 파편화된 유물들에 의해 의미가 재구성돼 새로운 시대적 가치가 전달되는 공간이다. 대부분 건물은 시대의 변화와 함께 사라지거나, 건물의 기능을 전환해서 생존한다. 건물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 가치는 역설적으로 부재의 상황에 맞닿는 순간 불꽃처럼 타오른다.
지금 내 삶의 의미를 당장 확언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산의 의미와 가치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 선명해진다. 하지만 가치 있는 것이 어떠한 이유로 사라지는 것을 안다면,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그 존재의 가치를 함께 나누고 가능하다면 일부라도 미래에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건물의 실체에 대한 보존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다. 또 사라지는 것에 그리움이 남는다고 해도 그것이 보존의 정당성이 될 수도 없다. 대부분의 역사는 그 자체가 아니라 일부의 유물로, 장소로, 글로, 전시로, 영화로, 축제로 변해서 지금과 함께하고 있다. 이런 창조적 재생산이 인류가 문명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훌륭한 유산은 많은 문화적 가치를 내재하고 있다. 그 가치를 다양한 방법으로 발굴하고 의미를 재생산해서 함께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가치를 이어나가는 것이 미래를 위한 지금 우리의 몫이다. 도시는 축적된 삶과 기억의 총체다. 건축은 개인적인 결과물인 동시에 사회적 결과물이며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된다. 도시의 기억이 오래도록 이어지게 하는 것은 그 사회 구성원의 결속과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김대균 건축가·착착스튜디오 대표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5 hours ago
2
5 hours ago
2
![[사설]日 총리에 강성우파 다카이치… 한일관계 퇴행은 안 된다](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10/08/132527351.1.png)
![[사설]요양병원 수면제 처방 일반병원 22배… 여기가 병원 맞나](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10/08/132527495.1.jpg)
![[사설]EU도 철강 관세 50%… 여야 ‘1호 합의’ K스틸법은 어디서 잠자나](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10/08/132527490.1.jpg)
![[김순덕 칼럼]‘실패한 대통령 만들기’가 민주당 DNA인가](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10/08/132527354.1.jpg)
![[횡설수설/박중현]“연구비 삭감은 재앙”](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10/08/132527120.2.jpg)
![[오늘과 내일/김재영]오리무중 관세 협상, ‘예언서’ 다시 보기](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10/08/132527347.1.jpg)
![[광화문에서/김상운]인재 확보 경쟁 앞에선 함께 피흘린 동맹도 없다](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10/08/132527344.1.png)
![경복궁 플래그십 스토어, 비슷하면 가짜다[기고/이광표]](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10/08/132527302.1.jpg)




![[단독] 만취해 운전대 잡은 30대 여성…중앙선 침범해 택시와 충돌](https://amuse.peoplentools.com/site/assets/img/broken.gi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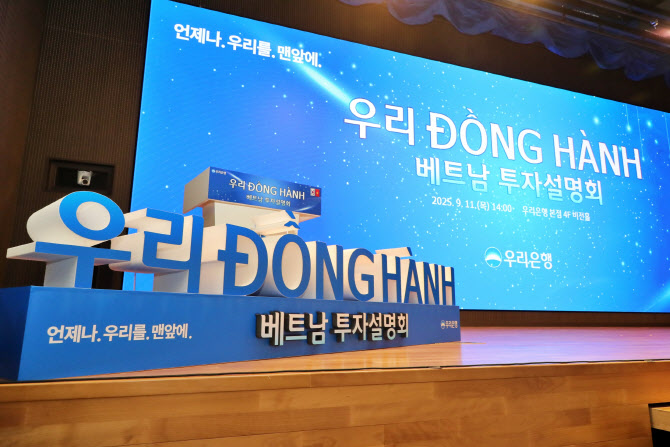
![JYP 박진영, 이재명 대통령 손 잡는다…“K팝 기회 살리려 결심” [이번주인공]](https://pimg.mk.co.kr/news/cms/202509/14/news-p.v1.20250910.34b4477db9874ff8a7eb9cb0d1087d7d_R.pn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