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제한서. 1998년 외환위기 이전 5대 시중은행 조흥·상업·제일·한일·서울은행의 줄임말이다. 은행 서열 기준으로, 이 중 꼴찌가 서울은행이다. 서울은행과 한국신탁은행이 합병해 서울신탁은행이 됐다가 후에 행명을 다시 서울은행으로 고친 이곳은 직장 파벌의 한 전형이었다.
![[천자칼럼] 은행 파벌 싸움](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AA.39120912.1.jpg)
서울은행(1959년)보다 9년 늦은 1968년 한국신탁은행 설립 때, 서울은행에서 행원을 대거 스카우트했다. 직장을 옮길 때 대부분 그렇듯 더 좋은 봉급 조건으로 이직했다. 1976년 합병하고 보니, 서울은행 시절 동기 간 봉급 격차는 물론 선후배 간 역전 현상까지 나타났다. 서울파와 신탁파 간의 파벌 싸움은 이렇게 호봉 문제로 시작했다. 행장 선출 과정에서 각 진영 간 투서가 난무하는 이전투구가 수십 년간 이어졌다. 김영삼 정부 시절 암투가 극에 달해 3년간 행장이 세 차례나 바뀌는 일까지 있었다. 내분에 시달리다가 결국 2002년 하나은행에 매각됐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 간 합병은 금융 파벌의 또 하나 씨앗이 됐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두 국책은행의 합병으로 탄생한 KB에는 ‘채널’이란 은어가 있다. 1채널은 국민은행 출신, 2채널은 주택은행 출신을 일컫는 말이다. 파벌 싸움을 막기 위해 외부 인사들을 수장에 앉혀 놨는데, 이들이 파벌 분쟁에 휘말려 한꺼번에 불명예 퇴진하는 사태까지 있었다.
우리은행은 더 하다. 1999년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이 합병해 우리은행 전신인 한빛은행으로 출범시 두 은행의 자산은 각각 53조여원과 48조여원으로 대등한 수준이었다.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이 합병 추진 사무실을 방문해 “파벌 싸움이 벌어지면 당사자들을 모두 쫓아내겠다”고 할 정도로 초기부터 자리싸움 조짐이 뚜렷했다. 2017년 채용 비리 사건으로 호되게 당한 상업파가 최근 불법 대출 건으로 한일파에 되갚아줬다는 설이 유력하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의 중재로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의 퇴직 직원 동우회가 통합된다. 인사 자료에서 출신 은행도 삭제하기로 했다. 합병 26년 만 이라고 한다. 그간의 반목이 얼마나 뿌리 깊었는지 짐작이 간다.
윤성민 논설위원 smyoon@hankyung.com

 1 day ago
3
1 day ago
3
![[기자수첩] '창업 요람' 액셀러레이터의 위기](https://thumb.mt.co.kr/21/2025/01/2025010711053397742_1.jpg)
![[목멱칼럼]부당한 명령은 이행하지 않는 것이 장교의 의무](https://www.edaily.co.kr/profile_edaily_512.png)
![헌재는 논란을 종결하는 곳이다 [광화문]](https://menu.mt.co.kr/common/meta/meta_mt_twonly.jpg)
![[우보세]아내가 내 카톡을 전부 본다면](http://thumb.mt.co.kr/21/2025/01/2025010614302232835_1.jpg)
![[투데이 窓]단파 라디오와 극우 유튜브](http://thumb.mt.co.kr/21/2025/01/2025010616284739097_1.jpg)
![[MT시평]인생 2막 신중년의 悲歌](http://thumb.mt.co.kr/21/2025/01/2025010616231544527_1.jpg)
![[사설]그날 당사의 50인과 6일 관저 앞 40인… “과천 상륙작전” 주장도](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5/01/07/130813260.1.jpg)
!["이러다, 다 죽어!"…'오징어게임2' 망하면 큰일 난다는데 [김소연의 엔터비즈]](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9034730.1.jpg)
!["근처 갈 만한 커피숍 알려줘"…'이 번호' 누르자 챗GPT가 받았다 [송영찬의 실밸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8983952.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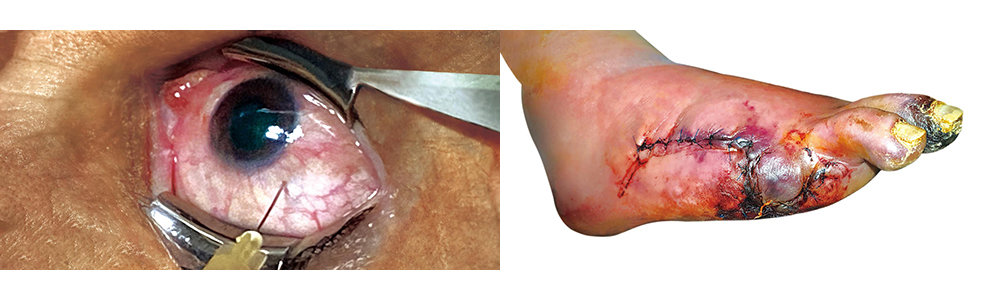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