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현장서 마주했던 장면들
트라우마 앓다 기록으로 치유
◇당신이 더 귀하다/백경 지음/248쪽·1만8000원·다산북스

8년간 소방관으로 재직한 저자가 목격한 응급현장의 여러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소방관으로서 겪어야 했던 고충과 인생 이야기도 담담하게 풀어냈다. 대학에서 영상을 전공해 독립영화를 찍던 저자는 30대에 늦깎이 소방관이 됐다. 사명감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여러 현장으로 출동하길 반복하며 입사 초기부터 트라우마로 극심한 불안장애에 시달렸다.
저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글쓰기를 시작했다. 그는 “마주하는 모든 죽음에 눈을 빼앗기면 마음이 남아나질 못한다”며 “지나간 죽음은 곱씹지 않는다”는 철칙을 세운다. 글은 좋은 해결책이 됐다. 죽음을 마음속 아무 곳에나 처박아 두기보다는, 잘 정리된 전화번호부나 백과사전처럼 정리해둬야 죽음의 잔상이 불현듯 자신을 뒤흔들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 있었다.
책에는 저자가 마주한 죽음 혹은 죽음에 가까웠던 사례가 다양하게 소개된다. 운이 좋게 구급대원이 환자를 일찍 발견해 무사히 응급실에 인계했는데 결국 지병으로 사망한 환자부터 아파트 7층에서 몸을 던진 학생, 연인과 결별한 뒤 목숨을 끊으려던 이들의 이야기도 나온다. 저자는 이런 사연을 통해 세상엔 남모를 고통을 안고 사는 이들이 많다고 전한다.‘웃픈’ 에피소드도 나온다. 길에서 구급차를 막아서는 이를 보고 좋지 않은 직감이 들어 몸이 굳었는데, 알고 보니 맛있는 어묵을 나눠주려는 선량한 시민이었다. 사고 현장에서 목숨을 건진 환자를 보고 “(이 정도라) 다행이야”라는 혼잣말을 했는데, 가족들이 “이게 왜 다행이냐”며 항의했단 일화도 나온다. 묵묵히 시민 곁을 지키는 소방관들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인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12 hours ago
2
12 hours ago
2





!['사극 배우' 박 씨, 치매 노모 요양원 방임 의혹.."집도 절도 없어"(궁금한이야기Y) [종합]](https://thumb.mtstarnews.com/21/2025/01/2025011811393681189_1.jpg/dims/optimize/)



![1월 둘째 주, 마켓PRO 핫종목·주요 이슈 5분 완벽정리 [위클리 리뷰]](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99.34900612.1.jpg)
!["이러다, 다 죽어!"…'오징어게임2' 망하면 큰일 난다는데 [김소연의 엔터비즈]](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9034730.1.jpg)


!["나랑 XX 할래"…돌봄 로봇과 성적 대화 하는 노인들 [유지희의 ITMI]](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164747.1.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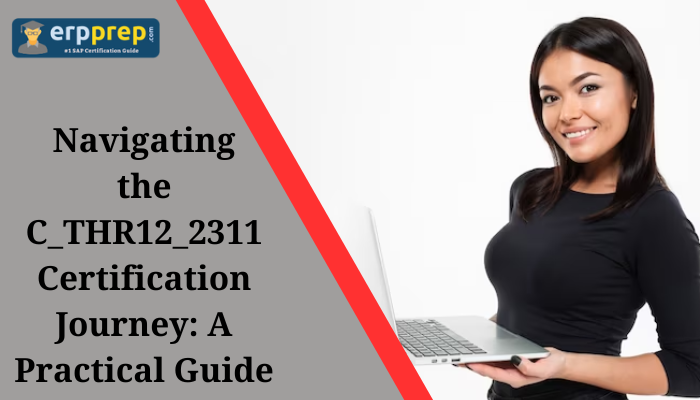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