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현모씨는 최근 수도권 외곽에 전셋집을 구한 김에 인근의 어릴 적 살았던 아파트를 찾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릴 적 뛰놀던 놀이터가 오간 데 없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현씨는 "이제는 지도 애플리케이션(앱) 로드뷰에서만 추억이 깃든 놀이터를 찾아볼 수 있다"며 "서울에 살고 있을 때는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 이사하고 보니 예전처럼 동네에 아이들이 많지 않아 저출산의 영향을 이렇게 체감했다"고 토로했습니다.
현씨의 사례와 같이 노후 아파트에서 놀이터와 테니스장 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8일 주택 업계에 따르면 노후 아파트 다수가 놀이터가 있던 자리를 주차장으로 바꾸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놀이터에서 뛰놀 아이들이 줄어든 반면, 자동차는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화성시의 A 아파트도 최근 단지 내 놀이터를 철거했습니다. 소규모 단지이기에 놀이터 관리 부담이 큰데, 단지 내 아이가 있는 집이 거의 없어 놀이터가 항상 비어 있었던 탓입니다. 입주민 투표에서 놀이터 용도변경에 동의한 비율도 70%가 넘었습니다.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예전 같으면 생각하기 어려운 비율"이라며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놀이터를 없애자는 얘기가 나오면 아이들 놀 곳이 부족하다는 항의가 쏟아졌지만, 최근 수년 사이 분위기가 크게 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아파트에서 뛰놀 아이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0∼14세 아동 수는 2000년 약 991만명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548만명에 그쳤습니다. 24년 만에 유소년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 셈입니다. 반대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같은 기간 339만명에서 993만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아파트 놀이터는 국내 놀이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내 놀이터는 약 8만여 곳에 달하는데, 절반 이상이 아파트 놀이터입니다. 국내 아파트에서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 비중은 절반을 넘어갑니다. 아파트 준공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인구 변화를 감안하면 노후 아파트에 자리한 약 2만개의 놀이터는 '바람 앞의 촛불' 신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변화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어린이놀이터 등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 가능 면적을 기존 50%에서 75%로 확대했습니다. 전체 입주민 3분의 2가 동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놀이터 등의 복리시설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놀이터가 사라진 자리는 주차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노후 아파트일수록 주차 공간이 부족한 탓입니다. 1980년대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은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60㎡ 미만은 가구당 0.2대, 전용 85㎡ 미만은 가구당 0.4대의 주차 공간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자동차는 사치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 설치도 1991년에서야 의무화됐습니다.
노후 아파트 주차장은 그대로인데 자동차는 빠르게 보급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629만8000대입니다. 국민 2명당 1대는 보유했다는 의미입니다. 자동차를 3~4대씩 보유한 가구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주민 불편이 커지면서 궁여지책으로 놀이터와 테니스장 등의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업계 관계자는 "신혼부부가 몰리는 지역이 아니라면, 대부분 아파트에서 아이들 웃음소리를 듣기는 어려워졌다. 문을 닫는 단지 내 어린이집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노후 아파트는 주차난이 심한 만큼, 놀이터와 같은 복리시설이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되는 사례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3 weeks ago
15
3 weeks ago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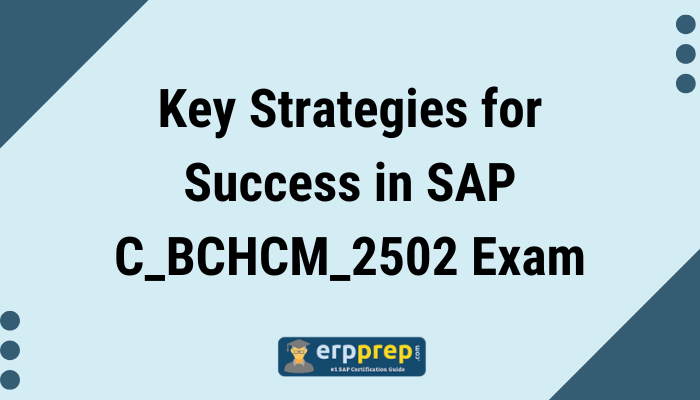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