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일론 끈처럼 질긴 햇살이 서쪽으로 발길을 돌리는 오후예요
청녹색 마노 밑에 깔만한 천을 찾다가
오래전 서랍 속에 넣어놓고 까맣게 잊었던 삼베 한줌을 봅니다 누런 천을 펼치자 한 여인의 손이 다가와 나를 만져요
이승의 문을 마지막 닫는 날 자신이 입고 갈 수의를 손수 짰던,
지금 그녀는 세상에 없어요 그녀가 지상에 산란한 푸른 계절들은
반다지 속에 고이 넣어두었던 여자의 음성을 기억하지 못했는지
그녀의 마지막 외출복은 장례식장에서 건넨 인스턴트 삼베였어요
몇 번의 손을 거쳐 내게 온,
한 올 한 올 원고지처럼 짜인 축축한 솔기들을 봅니다
긴 밤 삼베를 짜면서 얼마나 많은 오솔길을 밤새 더듬었을까요
수십 년 전, 그녀의 살구빛 저수지를 찢고 나온 후
이따금 좌우로 흔들렸을 첫째와 둘째의 책가방과
씨줄 날줄 같은 장대비를 휘몰고 와
조각보 같던 여자의 잠을 채찍처럼 갈겼을 한 사내의 거친 풍향계까지
터지고 해진 사연만 받아냈을 작고 동그란 그림자,
얼마 남지 않은 이승의 날짜들을 깨진 등잔불처럼 기대놓고
주름진 그 손은 오지 같은 골방에서 얼마나 긴 침묵을 짜고 또 짰을까요
이따금 실 끊어진 페이지마다 눈물로 매듭을 대신했을 아득한 밤들
바위보다 무거운 심호흡을 덧대가며 누군가 짜놓은, 자서전 몇 필
마지막 길에 끝내 입고가지 못한 기다란 삼베 한 권 펼쳐 읽는데
철컥 철컥 내 귓가에 누군가의 흐느낌이 우물처럼 차올라요
세상에는, 한 숨 한 숨 손끝으로 번역해야 읽히는
식물성 행간이 있어요
아직 못 다 짠 이야기가 남은 걸까요
밤이 깊자, 소쩍새 소리와 달빛을 베틀에 묶은 바람이
바디집과 북을 밀고 당기며
새벽까지 창문 밑에서 잘그락거렸어요
[심사평] 진한 여운으로 일렁이는 시
(정호승 시인·정과리 문학평론가)
올해의 응모작들에서 특징적인 현상을 하나 든다면 ‘다채로움’이라 할 것이다. 이는 만추에 지은 시라도 청춘의 의욕과 신생의 활기를 머금고 새싹처럼 푸르게 돋아나는 모습을 띤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런 시들에 기분좋게 취한 심사자들도 새벽 들판을 뛰어다니는 기분으로 흔감하다.
최종적으로 세 편의 시가 최종 후보작으로 선택되었다. 응모번호 61번의 ‘유리의 경계’, 139번의 ‘기다리다 1’, 175번의 ‘자서전을 짜다’이다. ‘유리의 경계’는 투명한 유리에 부딪쳐 죽은 참새를 통해서 외관의 매혹과 허위성을 다루고 있는데, 흔한 주제이지만 이야기를 꾸밀 줄 안다는 게 장점이다. 아름다운 대상의 거짓을 안다고 당장 돌아설 수 있는 게 아니다. 미련을 버리지 못해 온갖 궁리를 하고 실패는 거듭되고 그건 여전히 거기에 있다. 그런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준다. 다만 그런 사연의 의미를 묻는 데까지는 가지 못한다. ‘기다리다 1’은 철학적이다. 논리적인 생각의 흐름을 세상의 물상들에 비유하는 솜씨가 좋다. 다만 의미의 표출에 몰두하다 보니, 이미지들의 연관이 리듬을 얻지 못하고 있다. 무작위로 채집된 대상들이 무질서하게 부딪치며 왈강달강 어수선하다.
‘자서전을 짜다’는 우선 차분하게 읽힌다. 수의를 짜는 화자가 제 생을 그윽히 되새기고 있다. 그 묘사가 노을에 젖은 저녁강(박재삼)을 보듯 생생해서 읽는 이의 가슴이 뭉클해진다. 더욱이 그렇게 뜨겁게 살았어도 삶은 여전히 불가해하다. 그런 심사를 점자를 읽는 이의 마음에 투영한다. 생에 밀착할 뿐만 아니라 생의 의미까지에 밀착하기란 얼마나 어려운가? 진한 여운이 있다. 심사자들은 ‘자서전을 짜다’를 당선작으로 뽑는 순간에 단박에 맞장구를 쳤다. 당선자에게도 하이파이브를 보낸다. 아쉽게 탈락한 분들 역시 시를 쓰는 마음을 꾸준히 가꾸어가시라고 부탁드린다. 만추는 수확의 계절일 뿐만 아니라 새 삶이 시작되는 시대가 왔다.
[수상소감] 투박한 직물이라도 온기 품은 시들 넉넉하게 짜낼 수 있다면
(김인식 시인)
겨울 잡아당기는 십일월 밤비가 날줄로 내립니다. 바람소리와 지는 낙엽의 혼잣말이 이따금 씨줄처럼 창밖 어둠을 가로지릅니다.
쉽게 매듭지어지지 않는 문장 속 베틀에 앉아 배롱나무 마른 씨앗 위 빗방울처럼 흔들릴 즈음…. 당선의 기쁜 소식은 그렇게 메릴랜드 십일월 새벽 두시 반을 건너왔습니다. 파발이신 기자님의 친절이 도착하고 잠긴 제 목소리가 맨발로 뛰어 나갔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으로만 글을 썼습니다. 은퇴 후 조금씩 꺼내고 싶었지만 생각 뿐, 그 막막함이란! 서로를 멀리하던 팬데믹 그즈음 낮과 밤이 다른 곳에서 시시각각 붓끝 벼르던 눈빛들이 생생합니다. 세상과 시로 대화하는 법을 조금씩 깨닫게 해준 다락방, 그 온기는 지구 반대편까지 따뜻했습니다. 들꽃처럼 잔잔하게 시심을 가꾸는 워싱턴문인회, 시향의 특별한 향기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이제 내게서 존재가 모호해진 앞치마. 나 대신 설거지를 기꺼이 즐기는 남편. 이 글을 쓰는 지금, 거실에서 ‘You Raise Me Up’을 색소폰으로 불고 있는 그에게 큰 고마움을 전합니다. 엘크가족이 사는 고을에서 늘 응원해 주는 효, 가족에게도 이 기쁨 전합니다. 제가 알거나 모르는, 이 세상 수많은 늦꿈이님들께 희망을 줄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밤, 길게 늘이며 사유 속에서 실 고르다 지친 저의 튼 손 잡아주신 정호승, 정과리 두 분 심사위원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다정한 위로와 넘치는 칭찬까지 얹어주셔서 그 밤, 눈썹에 얹어 놓았던 잠을 아주 멀리 밀어놓았습니다.
남은 삶 동안, 투박한 직물이더라도 온기 품은 시 넉넉하게 짜낼 수 있다면 기쁘게 많이 써서 이 세상에 선물로 주고 가겠습니다.


![소녀시대 태연, 명품 두건 두르고 매력 발산..일상이 화보[스타IN★]](https://thumb.mtstarnews.com/21/2024/12/2024122300363012553_1.jpg/dims/optimize/)

![임지연, 죄인 김동균 변호 "시父 성동일 약속 지키고자"[옥씨부인전][★밤TView]](https://thumb.mtstarnews.com/21/2024/12/2024122223115764041_1.jpg/dims/optimize/)
![추영우, ♥임지연에 조언 "법을 무기로 휘두르지 않길"[옥씨부인전][별별TV]](https://thumb.mtstarnews.com/21/2024/12/2024122222594566560_1.jpg/dims/optimize/)

![정지영, 12년 만에 라디오 하차[연예뉴스 HOT]](https://dimg.donga.com/wps/SPORTS/IMAGE/2024/12/22/130699859.1.jpg)
![영화 ‘소방관’ 우여곡절 끝에 손익분기점 돌파[연예뉴스 HOT]](https://dimg.donga.com/wps/SPORTS/IMAGE/2024/12/22/130699856.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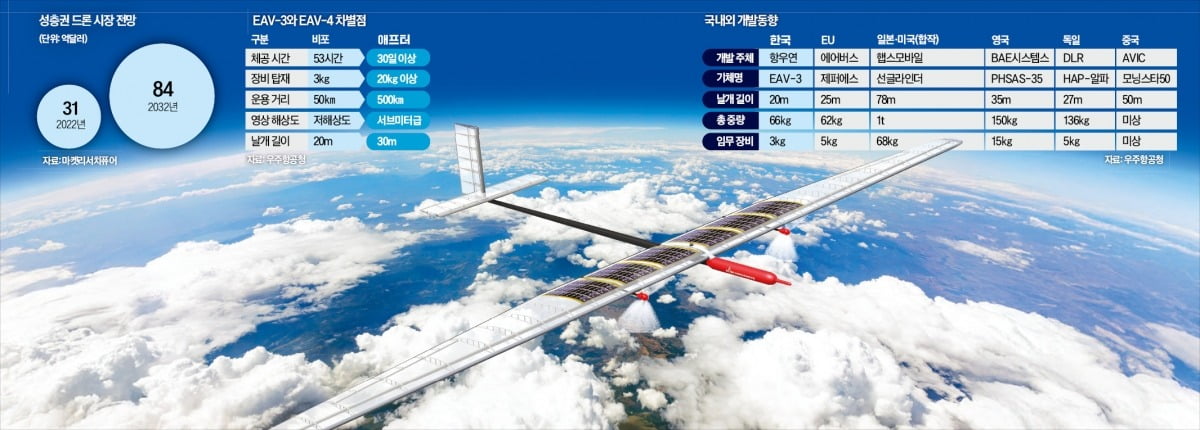
![트레저 내년 플랜 나왔다..양현석 "YG 새 데뷔 아이돌도 공개"[공식]](https://thumb.mtstarnews.com/21/2024/12/2024120209091479625_1.jpg/dims/optimize/)




![‘10안타 9득점’ 타선 응집력 앞세운 일본, ‘미리보는 결승전’서 대만 제압…국제대회 27연승 질주! [프리미어12]](https://pimg.mk.co.kr/news/cms/202411/23/news-p.v1.20241123.412a03f6ae18450291150c4e6a78d0d6_R.jp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