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집 골목
이현승
자주 가던 밥집이 하나 없어질 때
그것은 익숙한 표정 하나를 잃어버리는 일이고
가령 입맛을 다시는 것도 거기에 포함되겠지만
몸의 분별력이란
단순한 반복 속에서 예리해지는 것인데
혀의 경우도 그렇다
바람은 바깥양반이 피웠는데
소태 같은 나물무침을 손님이 받아내야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든 밥집이 있는 골목을 지날 땐
금세 타인의 허기도 내 것이 되고
이런 이상한 가족을 식구라고도 한다
골목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셈인데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표정을 하나로 합쳐놓은 것
그것이 배고픔의 표정이다
정든 밥집이 있는 골목은 초입에만 들어서도
거친 가슴을 다독이는 힘이 있다
자주 가던 밥집이 하나 없어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결딴난 연애보다 참혹한 표정이 된다
쫓을 대상은 없고 그저 쫓기는 자의 심정으로
----------------------------------------
![정든 밥집이 있는 골목 [고두현의 아침 시편]](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1.38272244.1.jpg)
“일상이 시고, 시의 재료이고, 삶 자체죠. 제 시가 구체적인 사건과 경험에서 나오다 보니 시를 쉽게 쓰기가 힘들어요. 한때는 좋은 시가 세상을 바꿀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세상을 바꾸려고 쓰던 시를 요즘은 저를 바꾸려고 써요. 제 시로 일상의 혁명 정도는 이룰 수 있겠지요.”
이현승 시인에게 시는 ‘삶의 질료’이자 ‘일상의 혁명’을 꿈꾸는 씨앗입니다. 생활 속의 사건들은 모두 그에게로 와서 시가 되지요. 그는 이렇게 복잡다단한 현실의 단층을 깊이 들여다보고 민감하게 조응하면서 그 이면의 풍경까지 하나하나 그려냅니다.
그의 두 번째 시집 『친애하는 사물들』에 나오는 시 ‘밥집 골목’에는 다섯 개의 ‘표정’이 겹쳐 있습니다. “자주 가던 밥집이 하나 없어질 때/ 그것은 익숙한 표정 하나를 잃어버리는 일”이라고 했으니, 그에게 밥집은 “익숙한 표정”입니다. 그 집이 있는 골목은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표정을 하나로 합쳐놓은 것” 같습니다. 시인은 이것을 “배고픔의 표정”이라고 말하지요. 그가 “자주 가던 밥집이 하나 없어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결딴난 연애보다 참혹한 표정이 된다”고 고백할 때, 그 골목은 “쫓을 대상은 없고 그저 쫓기는 자”의 표정이 됩니다.
“두 개의 얼굴”을 가진 골목은 또 다른 풍경에서 다시 한번 합쳐집니다. 밥집이 있는 그곳을 지날 때 “타인의 허기도 내 것”이 되어 함께 입맛을 다시게 하는 “식구”라는 이름이 그것이지요. “초입에만 들어서도/ 거친 가슴을 다독이는 힘”이 느껴지는 곳, 그 생활의 한 공간이 곧 밥집 골목이라는 시의 현장입니다.
이 골목은 일상 속의 두 갈래 길이 하나로 만나는 곳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그 길에서 소멸과 결핍, 먹는 일과 사는 일, 쫓는 일과 쫓기는 일을 동시에 비추는 거울을 발견합니다. 배고픔이란 결국 “타인의 허기”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식구”의 “혀” 같은 게 아니겠는지요.
그는 언젠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는 것이 시인의 상상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집에 실린 ‘다정도 병인 양’이라는 시에서 “삶은 늘 위로인지 경고인지 모를 손을 내민다”, “왼손등에 난 상처가/ 오른손의 존재를 일깨운다”고 말한 것과 맥을 같이합니다. 마치 “왼손에게 오른손이 필요한 것처럼/ 오른손에게 왼손이 필요한 것처럼” 그는 “엎드린 등을 쓸어줄 어둠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요.
그의 이런 심성은 세 번째 시집 『생활이라는 생각』에 나오는 표제시의 “한날한시에 한 친구가 결혼을 하고/ 다른 친구의 혈육이 돌아가셨다면,/ 나는 슬픔의 손을 먼저 잡고 나중/ 사과의 말로 축하를 전하는 입이 될 것”이라는 고백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는 “죄 안 지은 자들이 더 많이 회개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기부하고/ 상처 많은 사람들이 남의 고통에 더 아파”(‘일생일대의 상상’)하는 부조리한 세상과 “아픈 사람을 빨리 알아보는 건 아픈 사람”이고 “위로받아야 할 사람이 위로도 잘한다”(‘오줌의 색깔’)는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그가 ‘천국의 아이들 2’라는 시에서 “자기가 제일 아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모인 곳이 지옥일 테지”라거나 “하긴 아픈 사람만 봐도 같이 아픈 곳이 천국일 테지”라고 말하는 것 또한 ‘아픔’과 ‘위로’라는 인생의 양면을 동시에 볼 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생활의 한복판에서 그는 자신의 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삶의 질료’이자 ‘일상의 혁명’인 희망을 품고 날마다 새로운 시를 씁니다.
“상처는 상처로만 열린다./ 잔뜩 풀어 헤쳐 논 이 상처들은 다 뭔가./ 요즘은 아무도 시를 읽으면서 울지 않고 격앙되지도 않는데/ 아무도 안 보는 시를 명을 줄여가면서 쓰고,/ 조금 웃고, 조금 끄덕이고, 들렸다 가라앉았다 하면서// 뚫어지게 보고 있는 사람은 역시 쓰는 사람이다.” (‘천국의 아이들 2’ 부분)
■ 고두현 시인 : 1993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당선. 시집 『늦게 온 소포』, 『물미해안에서 보내는 편지』, 『달의 뒷면을 보다』, 『오래된 길이 돌아서서 나를 바라볼 때』 등 출간. 김달진문학상, 유심작품상 등 수상.

 3 weeks ago
3
3 weeks ago
3


![[홍순철의 글로벌 북 트렌드] "아프리카 발전 가로막는 주범은 서구 중심 경제학"](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AA.38506455.1.jpg)
![[책마을] 중국 茶 즐기며 생긴 적자를 아편 수출로 해결한 영국](https://static.hankyung.com/img/logo/logo-news-sns.png?v=20201130)
![[책마을] 전쟁은 결국 바다를 누가 차지하느냐의 싸움이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AA.38507674.1.jpg)
!["비만 몸에 안 좋은 건 알았지만"…'충격' 결과 나왔다 [건강!톡]](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1.38510284.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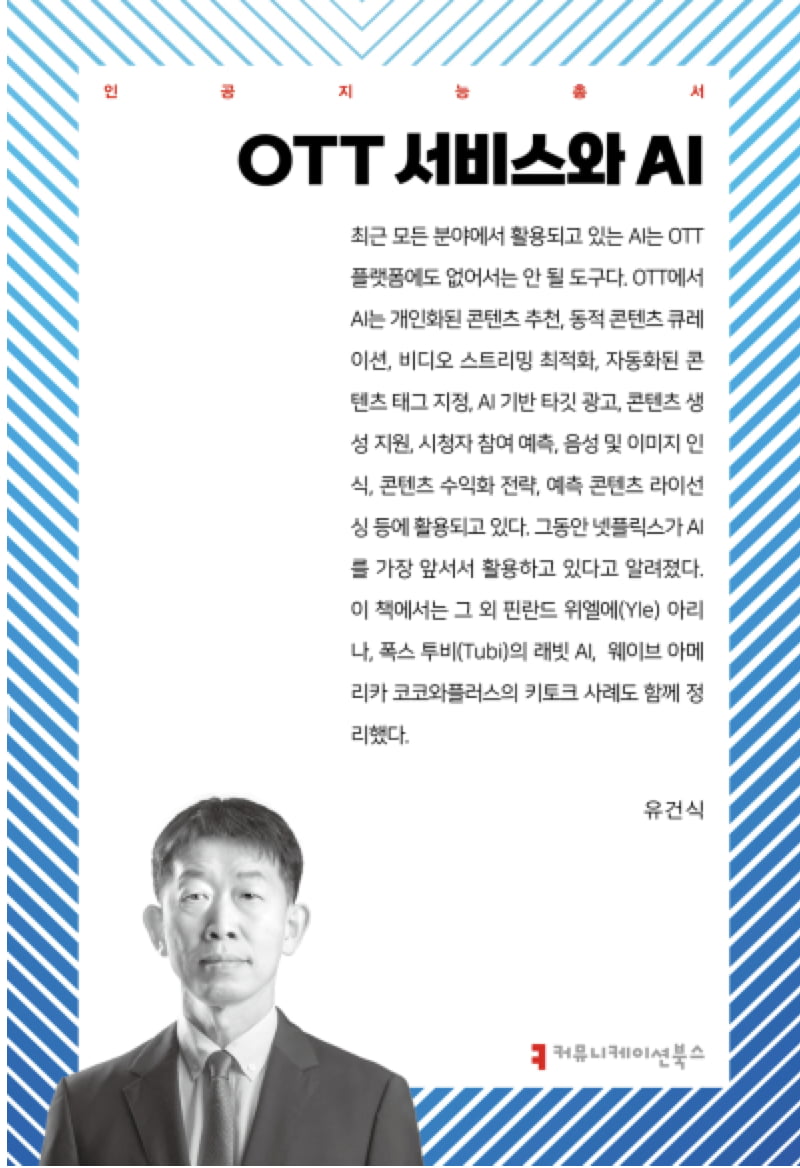
![[속보] “日이시바 총리, 내주 라오스서 한일 정상회담 예정”](https://pimg.mk.co.kr/news/cms/202410/03/news-p.v1.20241003.b881a32f3ee648e0ad4470b06c2902eb_R.jpg)
!['호부지가 돌아왔다!' NC, 이호준 제4대 감독 선임 "특별한 팀서 감독하게 돼 기뻐" [오피셜]](https://thumb.mtstarnews.com/21/2024/10/2024102215175357120_1.jpg/dims/optimiz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