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 한국도 흑연 보유국이었네 [김우섭의 헤비리포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AA.39208814.1.jpg)
천연흑연은 미중 무역 전쟁에서 중국이 꺼내들 수 있는 중요한 무기 중 하나다. 2023년 12월 미국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및 장비 수입을 막자 중국 상무부는 곧바로 천연흑연 수출 허가제를 도입했다.
이듬해 12월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조사와 규제를 강화하자 천연흑연의 최종 사용자 및 용도를 심사하는 방식으로 통제 수위를 높였다.
흑연 수출 통제의 직격탄은 한국이 맞았다. 흑연은 배터리 음극재를 만들기 위한 필수 원자재로, 수명 및 충전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 음극재 가격이 비싸지거나 부족해질수록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만 피해를 보는 구조다. 전기차 1대를 만들기 위해선 60㎏ 정도의 천연흑연이 필요하다. 중국은 음극재용 흑연 공급의 95%를 장악하고 있다.
한국 유일의 음극재 생산사인 포스코퓨처엠도 중국의 흑연 통제에 항상 고전한다. 포스코퓨처엠은 이런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 인조흑연을 만들고 있다. 제철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기요금이 높은 한국 산업 지형상 포스코퓨처엠이 만드는 인조흑연 가격은 천연흑연보다도 약 30% 더 비싸다.
결국 포스코퓨처엠은 중국에 의존했던 흑연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아프리카에 눈을 돌렸다. 호주 광산 업체 시라 리소시스가 아프리카 모잠비크 발라마 광산에서 채굴하는 흑연을 포스코퓨처엠이 들여오는 계약을 맺은 이유다. 계약 물량은 연간 2만4000∼6만t 선이다.
포스코퓨처엠은 올해 2만4000t을 시작으로 이후 연간 최대 6만t의 천연 흑연 원료를 들여와 음극재를 생산할 전망이다. 천연 흑연 6만t으로는 음극재 3만t을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전기차 60만대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중국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 한국도 흑연 보유국이었네 [김우섭의 헤비리포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AA.38153287.1.jpg)
흑연은 전세계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광물 중 하나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전 세계 흑연 매장량은 2억9000만t으로 추정된다. 중국이 8100만t으로 가장 많지만 브라질(7400만t)과 모잠비크(2500만t), 마다가스카르(2400만t) 등도 만만찮은 매장량을 보유 중이다.
한국엔 전기차 4300만대를 만들 수 있는 260만t의 흑연이 매장돼 있다. 실제 채굴할 수 있는 흑연은 180만t이란 분석도 있다. 한국엔 채굴 광산도 있었지만 환경 오염과 수익성 문제로 모두 문을 닫은 상태다. 가장 마지막까지 생산한 광산은 1992년 문을 닫은 경기도 가평 태화광산이다. 1989년에는 9600t의 천연흑연을 생산하며 정점을 찍었다. 당시엔 내화재료 및 제철 공정 탄소 첨가제 등으로 사용했다.
중국이 천연흑연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는 이유는 느슨한 환경 규제 때문이다. 정제를 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다량나오는데 이에 대한 정화비용이 선진국에선 지나치게 높다. 가공 과정에서 2500도 이상의 열처리가 필요한데, 중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전기세도 낮은 편이다.
중국은 흑연 채굴 인프라도 훌륭하다.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와 모잠비크 등에서도 천연흑연 채굴을 시작했지만 아직 산업 인프라가 부족해 비용이 높고 생산량이 적다.
그럼에도 배터리 업계는 중국산에서 벗어나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고 있다. 최대 수요처인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해서다.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지난해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은 올해부터 중국 등 해외우려기업(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고 규정했다. 다만 단기간에 중국산 흑연을 대체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2026년 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년 내에 북미, 아프리카 등지에서 대체 흑연 소재를 확보해야 한다.
일각에선 한국에서 채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채굴비용과 환경 오염 문제 등이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3 weeks ago
13
3 weeks ago
13




!["먹으면 망한다" 말렸지만…승부사의 '통 큰 베팅' 통했다 [반도체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1.40438109.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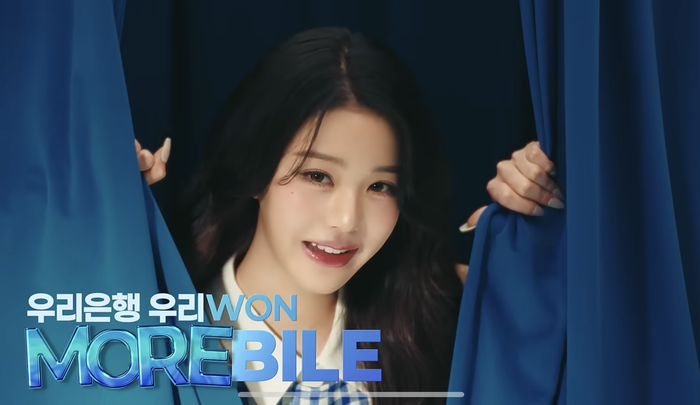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