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집계한 빈집 규모가 40배가량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주체마다 빈집을 두고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다.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지방 빈집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용어 혼용으로 통계나 정책 집행 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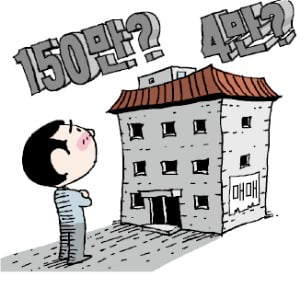
6일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빈집 실태조사 결과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빈집은 4만394가구다. 이 중 단독주택이 2만6954가구, 공동주택이 4728가구다. 반면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기준 국내 총 미거주 주택은 153만4919가구다. 빈집 실태조사보다 약 150만 가구 더 많다.
두 자료에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조사 주체별로 빈집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어서다. 통계청이 공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는 조사 시점인 매년 11월 1일 기준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빈집으로 본다. 매매나 임대 등으로 해당 기간에 일시적으로 빈 곳도 빈집으로 본다는 얘기다. 또 미분양과 공공임대주택도 빈집에 해당한다.
빈집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빈집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의미한다. 미분양이나 공공임대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통계청 자료보다 빈집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실제 빈집이 4만 가구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전국 시·군·구 지자체장은 낡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5년마다 빈집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지역별로 빈집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제각각이다.
도시와 농어촌의 ‘빈집 정의 통합’이 2023년 6월 이후 이뤄지며 도시와 농어촌의 조사 시점에도 차이가 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23년 전국 빈집 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그간 도시와 농어촌의 빈집 기준과 정비 방향이 달라 전국 빈집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빈집 노후도 판단은 3개 등급으로 통합 관리한다.
빈집 실태조사 현황을 보면 광주광역시와 경상남도 등은 연립·다세대(빌라) 빈집이 ‘0’으로 집계돼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1년 이상 비어 있는 곳이 전국에서 9가구에 불과하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아직 조사 기간이 닥치지 않았거나 지자체에서 의뢰하지 않은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

 3 weeks ago
5
3 weeks ago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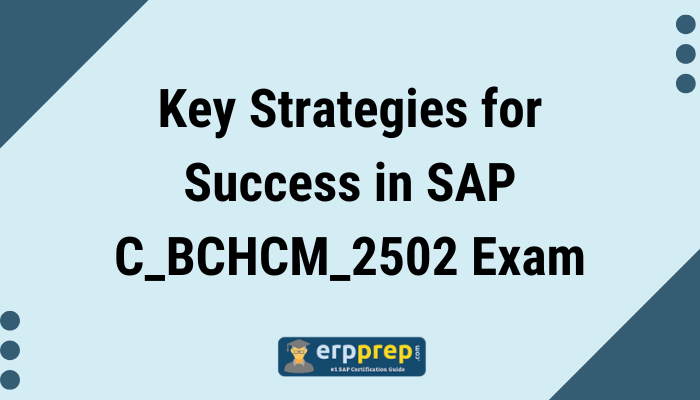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