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이동 로봇 법제화 후 일반 보도를 달리는 자율주행 로봇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다. 음식 배송부터 공원 순찰까지 활용 영역도 다양하다. 다만 실효성엔 의문을 나타내는 사람이 많다.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해선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인데 운행에 필요한 인증이 너무 많아 서비스 확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도 달리는 자율주행 로봇
23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실외이동 로봇 운행 안전인증을 받은 로봇 업체는 총 6곳이다. 지난 1월 뉴빌리티(로봇명 뉴비)와 로보티즈(개미)를 시작으로 우아한형제들(딜리), 도구공간(패트로버), 에이알247(배로미), 에이브이라이드(알) 등이 올해 연달아 인증을 땄다. 이 인증을 획득하면 자율주행 로봇도 일반 보행자처럼 보도 주행이 가능하다.
뉴빌리티의 뉴비는 요기요와 협력해 인천 송도에서 음식을 배달한다. HL만도가 개발한 골리는 강원 원주시의 원주천을 순찰하는데 4채널 카메라로 360도 관제가 가능하다. 로보티즈의 개미는 서울 양천구 공원에서 쓰레기를 수거한다.
다만 본격적인 상용화까진 시간이 걸릴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뉴비는 엘리베이터를 못 타 사람이 1층까지 내려와 음식을 갖고 올라가야 한다. 속도가 느려 횡단보도를 초록 불 안에 건너지 못하는 로봇도 있다. 대다수 로봇의 키가 작기 때문에 큰 물체가 앞을 가리면 시야를 확보하기도 어렵다. 자율주행 로봇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원격조종이 필요한 상황도 아직 많다.
업계에선 엘리베이터 연동 등이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엘리베이터 제조사에서 높은 연동 비용을 요구하는 등 사업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했다. 엘리베이터 연동 기준 표준화 등 로봇 이동 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로봇이 영상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유발하는 과도한 통신 트래픽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인증 절차 단순화해야”
당장 자율주행 로봇 사고에 대한 기준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뉴비는 송도에서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량과 접촉 사고를 냈다. 카메라로 주변을 인식하면서 목적지로 이동하는데,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려던 차량과 부딪혔다. 뉴빌리티 관계자는 “정지선을 넘어온 차량이 신호등을 가려 보기 신호를 보기 어려웠고, 관제사가 원격조종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건 차주가 보험 처리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자율주행 로봇의 법적 지위를 두고 혼란이 빚어지면서다. 지금은 로봇 사고와 관련해 과실 비율 등 기준이 미비하다. 업계 관계자는 “선제적으로 과실 비율 등 보상 기준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람이 로봇의 센서에 껌을 붙이거나 경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처분도 필요하다”고 했다.
실외이동 로봇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과 허가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하려면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핵심인데 서비스 지역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정 지역에서 로봇을 운행하려면 해당 지역을 관리하는 주체들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 방수, 방진부터 장애물이 오면 몇 초 안에, 몇 ㎝ 만에 멈추는지 등도 모두 따로 인증받아야 한다. 인증 항목만 16개나 된다.
해외 기술 발전 속도는 한국보다 훨씬 빠르다.
영국에 설립된 스타십테크놀로지스는 배달로봇으로만 전 세계 누적 이동 거리 1000만㎞를 돌파했고, 미국에선 오토노미, 뉴로, 포스트메이트 등이 저장 용량을 키우고 자율주행 수준을 사람 도움이 필요 없는 ‘레벨 4’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2 weeks ago
3
2 weeks ago
3







![1월 둘째 주, 마켓PRO 핫종목·주요 이슈 5분 완벽정리 [위클리 리뷰]](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99.34900612.1.jpg)
!["이러다, 다 죽어!"…'오징어게임2' 망하면 큰일 난다는데 [김소연의 엔터비즈]](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9034730.1.jpg)
!["근처 갈 만한 커피숍 알려줘"…'이 번호' 누르자 챗GPT가 받았다 [송영찬의 실밸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8983952.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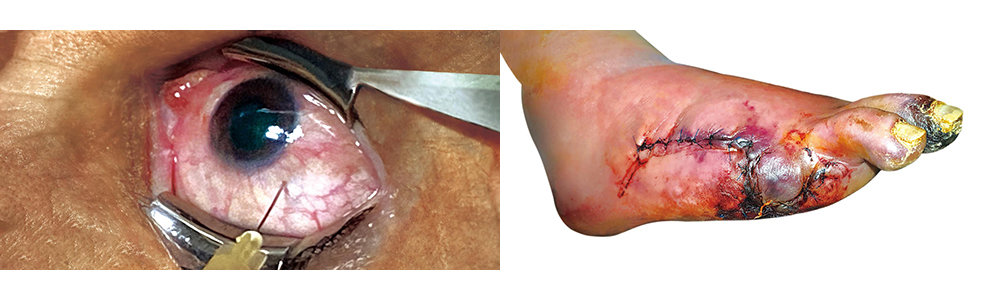
![[특파원 칼럼/김철중]고비 때마다 한중 관계에 재 뿌린 윤 대통령](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4/12/15/130648522.1.jp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