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론상으론 집값의 10% 정도의 현금만 있어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집값 하락에 따른 손실을 어떻게 부담할지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반짝 흥행’에 그친 공유형 모기지의 전철을 밞는 것 아니냔 우려도 나온다.
● ‘영끌’ 대신 투자로 내집 마련 시동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6월 중 ‘지분형 모기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분형 모기지는 개인이 집을 살 때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주금공 투자금만큼 매수자의 자금 마련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지금은 10억 원짜리 집을 사려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를 적용해 7억 원을 은행에서 빌리더라도 매수자는 현금 3억 원을 마련해야 했다. 하지만 주금공이 5억 원을 투자한다면 매수자는 나머지 5억 억만 마련하면 된다. 은행 대출도 받는다면 현금 1억5000만 원으로도 내집 마련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후 지분을 늘려갈 수도 있다.
다만 주금공이 보유한 지분에 대해선 임대료를 내야 한다. 임대료는 주금공 지분에 연 2% 대 이자율을 곱한 수준에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후 시세 차익은 매수자와 주금공이 지분대로 갖는다. 주금공은 후순위 투자자로 집값이 떨어지면 사실상 손실을 떠안게 된다.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살다가 20, 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도 이와 유사한 방식이다. 공공과 민간 주택에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지분형 모기지와 달리 공공주택에서만 적용할 수 있다.한국은행이 최근 가계부채 해법으로 제시한 ‘한국형 뉴리츠’는 분양보다 임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인은 주택을 보유한 간접투자기구인 리츠(REITs)의 지분을 매입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구조다. 세입자가 리츠 투자자가 되는 셈이다. 임대료를 내야 하지만 리츠 지분만큼 배당을 받을 수 있어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집값이 오른 경우 지분을 매각해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 연구 용역도 최근 발주했다.● 가계부채 줄어도 공공부채 증가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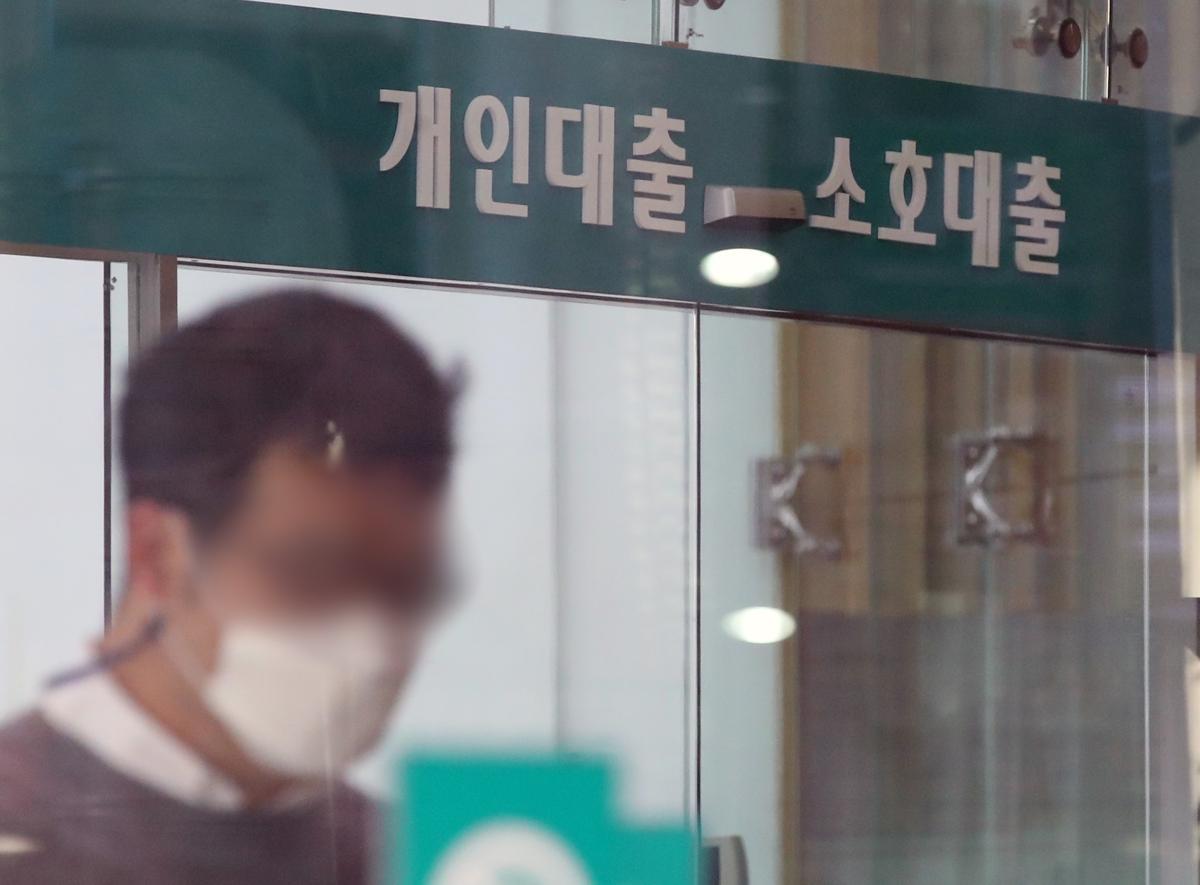
국제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7%로 세계 38개국(유로지역 단일 통계) 중 2위로 집계됐다. 전체 신흥시장 평균(46.0%)나 아시아 신흥시장 평균(57.4%), 세계 평균(60.3%)를 모두 웃도는 수준이다.
하지만 지분형 모기지의 경우 주금공이 집값 손실분을 떠안는 구조라 결국 가계가 지던 부담을 공공기관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도 공개되지 않아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기’식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 관심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금융당국은 집값 변동에 따라 수익과 손실을 공유하는 공유형 모기지를 내놓았다. 도입 초기 접수 1시간 만에 마감될 정도로 관심이 높았지만 2015년 집값이 오르고 금리가 내리면서 인기가 급락했다.김중한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지분형 모기지와 지분적립형 주택은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인기가 낮을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형 뉴리츠의 경우 재고 주택 관리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3 days ago
3
3 days ago
3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