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에서 감리자의 독립성을 확보해 부실시공을 예방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가 강화될 전망이다. 공사 감리자를 건축주가 아닌 허가권자가 직접 지정하게 해 유착 관계를 사전에 해소하자는 취지다. 연이은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정부가 2023년 발표한 ‘건설카르텔 혁파안’의 후속 조치로, 업계에선 감리 제도 강화 등 긍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허가권자 지정감리제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연면적 5000㎡ 이상 문화·집회·판매시설이나 16층 이상 건축물 등 다중이용 시설의 감리권한을 허가권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재 감리자 지정 권한은 건축주에게 있는데, 현장을 감독해야 하는 감리자가 건축주에 영향을 받아 부실하게 감독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건축주의 눈치를 보는 감리자가 부실을 덮고 넘어가는 등의 관행이 자주 있어왔다”라며 “건설 현장의 안전 감독이라는 차원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품질 관리에도 악영향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일부에선 CM(건설사업관리) 등의 제도 강화를 통해 감리 제도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다만, 시공 단계와 시공 이후 관리에 집중하는 감리와 달리 프로젝트 전반을 모두 관리하는 CM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붕괴사고를 겪은 인천 검단 아파트나 2022년 광주 화정 아파트의 경우엔 아파트의 경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를 실시한 후 모집업체를 대상으로 감리자 자격 적격심사를 통해 감리업체를 선정한 주택법 감리 현장이었다. 업계에선 허가권자가 직접 감리를 지정했더라면 현장 감독이 더 강화됐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인허가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도 제도 강화를 반기는 모습이다. 건축연구원이 서울시 소속 건축인허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5% 이상이 허가권자 지정감리제도가 공사감리자의 독립성 및 건축물 품질 향상에 기여했다고 답했다. 제도가 도입된 2015년부턴 건축사의 행정처분 건수도 감소해 2015년 214건이었던 행정처분 사례가 2022년 102건으로 줄었다.
지나친 과열 경쟁으로 인한 감리 부실 관행도 개선될 수 있다. 현재는 공사감리 용역대가가 과당 경쟁으로 저가 수주로 이뤄지는 경우가 잦다. 지정감리제도가 강화되면 이를 사전에 막아 용역대가 현실화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건축업계 관계자는 “공공이 적극 개입해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감리자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건축물의 안전도 확보될 수 있다”라며 “공공의 감리 감독 강화를 통해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4 weeks ago
7
4 weeks ago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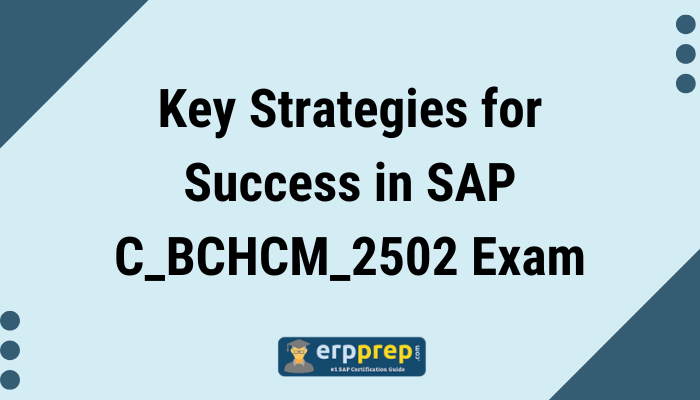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