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품제국'으로 군림해 온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가 처음으로 명품기업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에르메스에게 내줬다. 중국 내수경기 침체와 더불어 미국 시장의 부진,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위협까지 겹쳐 수익성이 악화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어서다. LVMH뿐 아니라 다른 명품기업들도 상호관세 문제로 수익성이 악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뒤바뀐 명품기업 1·2위
블룸버그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LVMH는 7.82% 급락한 488.65유로에 장을 마쳤다. 이날 장마감 기준 LVMH의 시가총액은 2443억9400만 유로, 에르메스는 2486억1600만유로다. 1990년대부터 명품기업 시가총액 1위를 줄곧 지켜오던 LVMH가 처음으로 1위를 내줬다.
전날 LVMH가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영향이 컸다. LVMH의 1분기 매출은 203억1100만 유로로 전년동기(206억9400만유로)에 비해 1.85% 하락했다. 월가 컨센서스(평균 예상치)였던 212억유로를 크게 밑돌았다. 그룹 매출의 78%를 차지하는 패션·가죽제품 매출은 지난해보다 3.6% 빠진 101억유로에 그쳤다.
지역별로 보면 중국·한국 등 아시아 지역(일본 제외)의 1분기 매출은 전년대비 11% 감소했고, 북미와 일본은 각각 3%, 1%씩 줄었다. 유럽만 2% 성장하는 데 그쳤다. LVMH는 아시아 지역은 중국의 경기 침체, 북미는 미국내 화장품 유통사의 할인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매출이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LVMH는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1990년대 들어 적극적인 인수합병 정책을 펴면서 명품 기업 중 시총 1위 자리를 지켜왔다. 팬데믹 시기 중국 명품 수요가 늘면서 2021년 유럽 기업 시총 1위에 올랐고, 2023년에는 유럽기업 최초로 시총 4000억 유로를 돌파하기도 했다. 그러나 명품 큰 손이었던 중국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히면서 현재 시총은 고점(4948억 유로) 대비 반토막이 났다.
업계에서는 거대 명품 그룹을 만든 LVMH의 전략이 불황기에 독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투자은행 번스타인의 루카 솔카 애널리스트는 "에르메스와 루이비통이라는 단일 브랜드는 매우 높은 매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LVMH 전체로 보면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브랜드가 적지 않다"고 했다.

○美 관세에 명품기업 수익성 악화 예상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우려도 LVMH의 주가를 끌어내린 배경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연합(EU)산 제품에 2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9일 국가별 상호 관세를 90일 유예한다고 선언했지만 협상이 결렬되면 관세는 약 3달 뒤 예정대로 부과된다.
상호관세 우려에 글로벌 명품기업 주가는 최근 줄줄이 하락했다. LVMH는 1개월 사이 주가가 19.85% 하락했고 전망이 비교적 양호한 에르메스 역시 같은 기간 5.27% 하락했다. 이밖에도 프라다(-19.34%), 케링그룹(-25.45%), 버버리(-27.69%), 리치몬트(-17.2%) 등도 주가가 크게 빠졌다.
미국은 글로벌 명품 소비 시장에서 중국 다음으로 비중이 높다. 2023년부터 중국 명품 소비가 꺾이면서 명품업체들은 북미에서 매출을 늘리는 전략을 펴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이 시행되면서 다수 업체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위기에 놓였다.
명품 업체들은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거나 가격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LVMH는 실적 발표 직후 컨퍼런스콜에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일부 물량을 옮길 수 있는 여유가 남아있다"며 "관세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가격 인상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프랑수아 앙리 피노 케링그룹 회장은 지난 2월 미국 관세 정책과 관련해 "관세가 부과될 경우 가격 책정 전략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3 weeks ago
11
3 weeks ago
11

!["42년 만에 일 냈다"...삼성 제치고 세계 1위 오른 흙수저 D램 기업 [반도체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1.40434649.1.jpg)


![“증여 받은 아파트, 시가는 어떻게 매겨서 신고하나요?”[세금GO]](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5/PS25051100035.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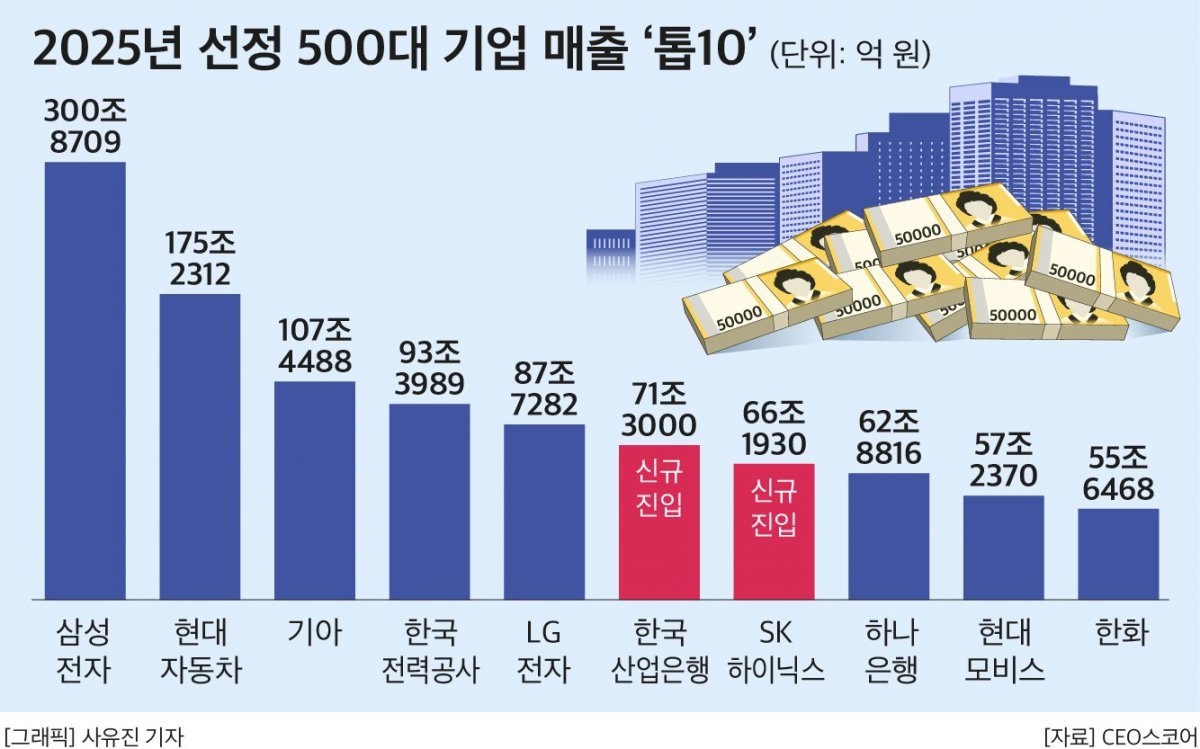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