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기, 한 남자가 있다. 제대로 된 한국 정원을 만들어 보겠다고 13년을 바쳐 왔다. 스스로 말하길 “뼛속까지 장사치”인 그는 일찌감치 사업에 성공해 부(富)를 이뤘다. 남들 눈에 부러울 것 하나 없는 인생인데 정작 자신은 “자유를 갈망한다”고 했다. 동서양 철학과 종교를 두루 섭렵하다가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로부터 깨달음과 영감을 얻었단다. 그가 경기 양평의 메꽃 흐드러지는 산골, 메덩골에 한국 정원을 만든 건 니체의 영향을 받아 온전한 자유를 찾는 여정이었을까.
● 허허벌판을 정원으로 만든 여정
그를 만나기로 한 시간에 중년 남자가 나타났다. 연회색 피케셔츠와 연갈색 등산화 차림에 테가 얇은 안경을 쓰고 있었다. 남자가 인사를 건넸다.
“저는 메덩골 정원의 가이드입니다.”
“아, 정원 설립자이신가요?”“주인장은 낯을 많이 가리셔서 제가 주로 VIP들을 안내합니다. 그분은 자유롭게 사는 걸 좋아해서 외부에 노출되는 걸 꺼리거든요.”

스스로를 가이드라고 소개하는 남자와 함께 1일 문 연 메덩골 정원을 둘러봤다. 정원 공사가 마무리되던 지난해 가을 미리 와 봤을 때와 비교하면 한층 정비돼 있었다. 입장료 5만 원을 받는 매표소 옆에는 화장실도 생겼다. 유리창 너머 숲을 바라보며 손을 씻는 구조의 디테일에서 이 정원의 미감(美感)을 짐작할 수 있었다. 가이드가 “화장실부터 다녀오시겠어요”라고 권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메덩골 정원은 한국 정원과 현대 정원으로 구성돼 있다. 전체 19만8000여 ㎡(약 6만 평) 중 약 2만3000㎡(7000평)이 한국 정원으로 먼저 문을 열었다. 현대 정원은 내년 공개를 목표로 공사 중이다. 가이드가 말했다. “정원을 열고 보니 젊은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일부 완성된 현대 정원 건축물 위주로 감상하더라고요. 한국 정원은 쓱 보고 말죠. 그럴 정원이 아니에요. 100여 년 만에 시도되는 ‘월드 클래스(세계 수준)’ 정원이거든요.”

자부심이 대단했다. 실제로 방문자들은 정원의 규모와 품격에 놀란다. 총연장 400m 계류(溪流), 암석과 이끼, 에메랄드빛 연못 등은 본래 있던 게 아니다. 막대한 돈과 시간을 들여 허허벌판을 절경으로 변신시킨 것이다. 무엇보다 정원 각 공간에는 인문학을 토대로 정교하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있다. 그걸 들으면 놀라움은 감탄으로 바뀐다.

● 니체의 정신과 말을 심은 정원
메덩골 정원의 한국 정원은 노래 ‘고향의 봄’에서 시작한다. 소박한 오솔길 양쪽으로 개복숭아나무와 진달래가 있다. 가이드가 말했다. “4월이면 연분홍 꽃잎 떨어지는 모습이 환상적이랍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사랑하는 동요 ‘고향의 봄’을 구현한 정원이지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주인장은 조경가에게 김기림 시인의 시 ‘길’도 이곳에 구현해 달라고 했다네요. 그나저나 개복숭아나무와 돌배나무를 정원수로 사용한 곳 보셨어요? 니체로부터 용기와 힘을 얻어 우리나라 정원들이 하지 않던 새로운 시도를 한 겁니다.”

정원 곳곳 가림막에는 니체의 말들이 쓰여 있다. 어록을 대놓고 주입하는 느낌이 적잖게 들었다. 니체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삶은 어떨지 궁금하다고 가이드에게 물었다.
“주인장은 경영학을 전공한 장사치이지만 니체 덕분에 한 번쯤 (정원을 통해) 예술을 진짜 해보자는 도전적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한국 정원을 만들려고 주말마다 전국을 돌았는데 참고할 만한 기록도 원형도 마땅한 게 없었다고 해요. 여러 정원을 다니고 전문가들 얘기를 듣다가 어느 순간 관뒀대요. 이제는 나만의 정원을 만들겠다고.”
들어 보니 이 정원 조성에 크게 영향을 끼친 니체의 말이 있었다.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 자신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창조하라’.

● 느리게 시를 읊조리며 걷는 정원
개복숭아 터널을 나오니 ‘남도 돌담길’이 펼쳐졌다. 계단식 돌밭이 굽이굽이 이어지는 길이다. 벼, 빨간 고추, 노란 참외꽃, 보라색 가지꽃, 한창인 부추꽃 등이 정답게 인사를 건넸다. 영화 ‘서편제’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었다는 이 ‘한국식 키친 가든’에서는 평범한 밭작물이 귀하게 대접받는다. 그래서 유독 아름답다.

가느다란 빗줄기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우산을 펼치고 제월문(霽月門)을 지났다. 제월은 고려말 문인 운곡 원천석의 시구에서 딴, ‘비 갠 뒤 구름 사이로 나오는 맑은 달’이란 뜻이다. ‘민초들의 삶’에서 ‘선비들의 풍류’로의 공간 이동이다. 전남 강진 백운동 원림을 참고해 지은 파청헌(把靑軒·푸르름을 잡는 집)에 올라 천원지방(天圓地方·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 사상을 담은 사각 연못 두 개를 바라보았다. 시든 연밥 주위로 빗방울이 천천히 동그라미를 짓는 고요함이 좋았다.

파청헌 기둥마다 새겨진 한자 시구를 읽어 본다. 한글로 풀면 이렇다. ‘세상에 나가 부침을 겪어 보니 산 빛만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네/ (중략)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믿지 말고 행실을 보고 잘 골라 사귀게나/나는 이제 풍류를 끊었기에 홀로 지내며 언제나 처량하지만/푸른 산과 마주 앉아 술을 마시며 노래하고 춤도 추며 즐겁게 산다네.’


우리 선조들은 정원을 감상하는 방법으로 미음완보(微吟緩步)를 제안했다. 시를 조용히 읊으며 걸음마다 정원을 들여다보라는 뜻이다.
“주인장은 한국 전통 정원의 DNA는 살리되 과거를 답습할 생각은 없었답니다. 전통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는 믿음이 있대요. 제가 안내해 드린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이곳을 ‘우리 시대 최고의 한국 정원’이라 극찬하셨어요. 대충 보고 지나치면 안 되는 것이지요.”

● 월드 클래스 한국 정원을 향해
지난해 봤던 메덩골 정원의 가을 풍경은 한 폭의 그림이었다. 정원 설립자는 일본 정원의 아름다움을 뛰어넘고 싶어 전국에서 아름다운 단풍나무를 구해 심었다고 한다. 다시 가을이 무르익으면 버들치와 각시붕어가 사는 연못 주변이 단풍 빛으로 곱게 물들 것이다.

니체는 “소나무의 태도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소나무는 초조해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조바심내지 않으며 아우성치지 않고 가만히 인내할 뿐이다.’ 메덩골 정원은 니체의 철학과 우리 선비들의 절개를 담은 소나무로 경주 솔밭도 구현했다. 가이드가 말했다. “척박한 바위 사이에도 뿌리내리는 소나무야말로 건너가는 자, 즉 초인(超人) 아닐까요.”
한국 전통 정원에서는 물과 식물만큼이나 바위가 중요했다. 이 정원도 연못과 마당에 거대한 바위를 두었다. 두꺼비 형상 바위가 놓인 연못을 지나 재예당(載藝堂·예술을 담았다는 뜻)으로 들어서는 문 이름은 불차문(不差門). ‘공부를 해 보니 유교 불교 도교가 근본 차이가 없더라’는 운곡의 글귀에서 따왔다. 가이드는 말했다. “어느 종교학자가 재예당에 앉아 마당의 바위를 보며 말했어요. ‘저 돌 앞에서 누가 거짓을 말할 수 있겠나’.” 경북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를 차용한 서원, 성리학은 물론 불교와 민간신앙까지 아우른 암자도 전통의 새로운 해석이다.

가이드는 메덩골 정원이 월드 클래스라고 여러 번 힘주어 말했다. 정원 설립자로 빙의한 듯 종종 격하게 자랑스러워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1000년을 지속하는 미래의 정원이 되겠다는 다짐도 했다. 드물게 잘 짜인 스토리텔링과 조경을 갖춘 이 정원에서 생각했다. 여기에 사랑과 공감, 겸허함의 미덕이 더해지면 진정한 월드 클래스가 될 수도 있겠다고. 메덩골 정원은 한 인간의 꿈이자 자유에 대한 의지였다.
(※ 가이드는 정원 설립자 얘기를 전하다가 자주 “나는~”이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아이고, 가이드가 주제넘게 주인장 행세를 하네요”라며 바로잡곤 했다. 반나절 내내 그랬다. 그는 정말 가이드였을까.)

글·사진 양평=김선미 기자 kimsunmi@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6 hours ago
2
6 hours ago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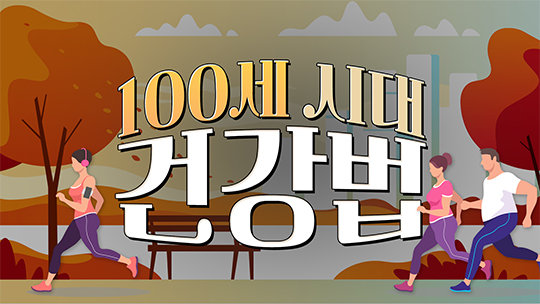



!['꽃길' 임영웅·이찬원 vs '구설' 정동원·김호중, 엇갈린 트로트 ★들 [스타이슈]](https://thumb.mtstarnews.com/21/2025/09/2025091220023082437_1.jpg)
![연상호, 2억 저예산의 기적..뒤틀린 '얼굴'의 불쾌함을 곱씹다 [김나연의 사선]](https://thumb.mtstarnews.com/21/2025/09/2025091215354854761_1.jpg)
!['에스콰이어' 이진욱의 퍼스널컬러=변호사 "평소에도 결정 빨리하고 원칙을 잘 지키는 편이에요"[★FULL인터뷰]](https://thumb.mtstarnews.com/21/2025/09/2025091216261836204_1.jpg)
!['딸 부잣집' 이세희 "이상형은 다정한 男..전현무, 형부로 대찬성" [전현무계획2][★밤TV]](https://thumb.mtstarnews.com/21/2025/09/2025091221050291730_1.jpg)
![이세희 "작품이 부르면 어떤 역할이든 OK..롤모델은 서현진"[스타이슈]](https://thumb.mtstarnews.com/21/2025/09/2025091222440163386_1.jpg)











 English (US) ·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