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추문예 ◆

나일론 끈처럼 질긴 햇살이 서쪽으로 발길을 돌리는 오후예요
청녹색 마노 밑에 깔 만한 천을 찾다가
오래전 서랍 속에 넣어놓고 까맣게 잊었던 삼베 한 줌을 봅니다 누런 천을 펼치자 한 여인의 손이 다가와 나를 만져요
이승의 문을 마지막 닫는 날 자신이 입고 갈 수의를 손수 짰던,
지금 그녀는 세상에 없어요 그녀가 지상에 산란한 푸른 계절들은
반다지 속에 고이 넣어두었던 여자의 음성을 기억하지 못했는지
그녀의 마지막 외출복은 장례식장에서 건넨 인스턴트 삼베였어요
몇 번의 손을 거쳐 내게 온,
한 올 한 올 원고지처럼 짜인 축축한 솔기들을 봅니다
긴 밤 삼베를 짜면서 얼마나 많은 오솔길을 밤새 더듬었을까요
수십 년 전, 그녀의 살구빛 저수지를 찢고 나온 후
이따금 좌우로 흔들렸을 첫째와 둘째의 책가방과
씨줄 날줄 같은 장대비를 휘몰고 와
조각보 같던 여자의 잠을 채찍처럼 갈겼을 한 사내의 거친 풍향계까지
터지고 해진 사연만 받아냈을 작고 동그란 그림자,
얼마 남지 않은 이승의 날짜들을 깨진 등잔불처럼 기대놓고
주름진 그 손은 오지 같은 골방에서 얼마나 긴 침묵을 짜고 또 짰을까요
이따금 실 끊어진 페이지마다 눈물로 매듭을 대신했을 아득한 밤들
바위보다 무거운 심호흡을 덧대가며 누군가 짜놓은, 자서전 몇 필
마지막 길에 끝내 입고 가지 못한 기다란 삼베 한 권 펼쳐 읽는데
철컥철컥 내 귓가에 누군가의 흐느낌이 우물처럼 차올라요
세상에는, 한 숨 한 숨 손끝으로 번역해야 읽히는
식물성 행간이 있어요
아직 못다 짠 이야기가 남은 걸까요
밤이 깊자, 소쩍새 소리와 달빛을 베틀에 묶은 바람이
바디집과 북을 밀고 당기며
새벽까지 창문 밑에서 잘그락거렸어요


![소녀시대 태연, 명품 두건 두르고 매력 발산..일상이 화보[스타IN★]](https://thumb.mtstarnews.com/21/2024/12/2024122300363012553_1.jpg/dims/optimize/)

![임지연, 죄인 김동균 변호 "시父 성동일 약속 지키고자"[옥씨부인전][★밤TView]](https://thumb.mtstarnews.com/21/2024/12/2024122223115764041_1.jpg/dims/optimize/)
![추영우, ♥임지연에 조언 "법을 무기로 휘두르지 않길"[옥씨부인전][별별TV]](https://thumb.mtstarnews.com/21/2024/12/2024122222594566560_1.jpg/dims/optimize/)

![정지영, 12년 만에 라디오 하차[연예뉴스 HOT]](https://dimg.donga.com/wps/SPORTS/IMAGE/2024/12/22/130699859.1.jpg)
![영화 ‘소방관’ 우여곡절 끝에 손익분기점 돌파[연예뉴스 HOT]](https://dimg.donga.com/wps/SPORTS/IMAGE/2024/12/22/130699856.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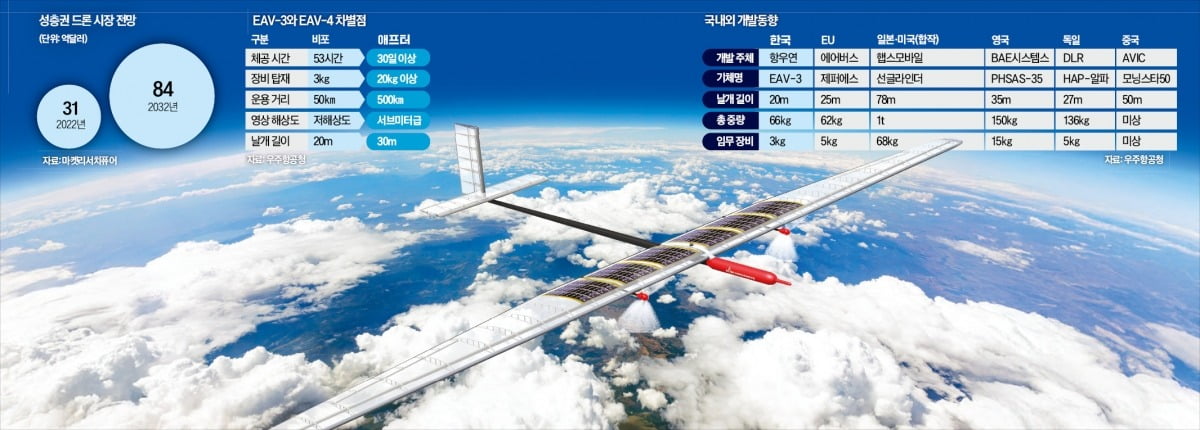
![트레저 내년 플랜 나왔다..양현석 "YG 새 데뷔 아이돌도 공개"[공식]](https://thumb.mtstarnews.com/21/2024/12/2024120209091479625_1.jpg/dims/optimize/)




![‘10안타 9득점’ 타선 응집력 앞세운 일본, ‘미리보는 결승전’서 대만 제압…국제대회 27연승 질주! [프리미어12]](https://pimg.mk.co.kr/news/cms/202411/23/news-p.v1.20241123.412a03f6ae18450291150c4e6a78d0d6_R.jpg)

 English (US) ·
English (US) ·